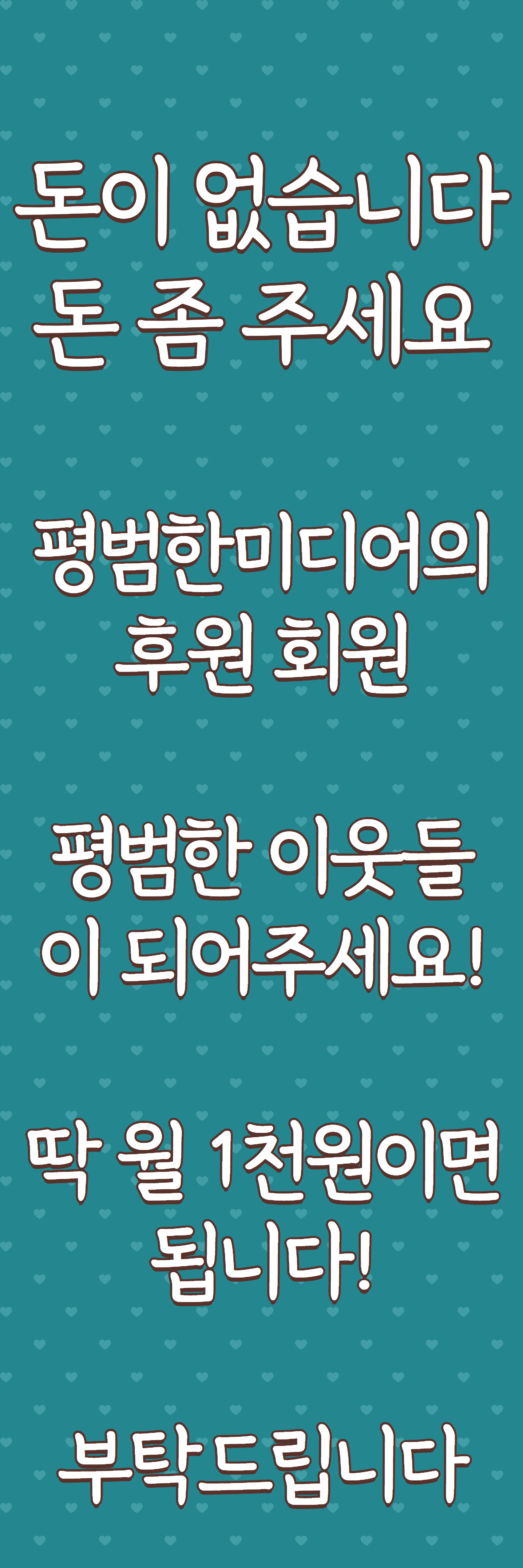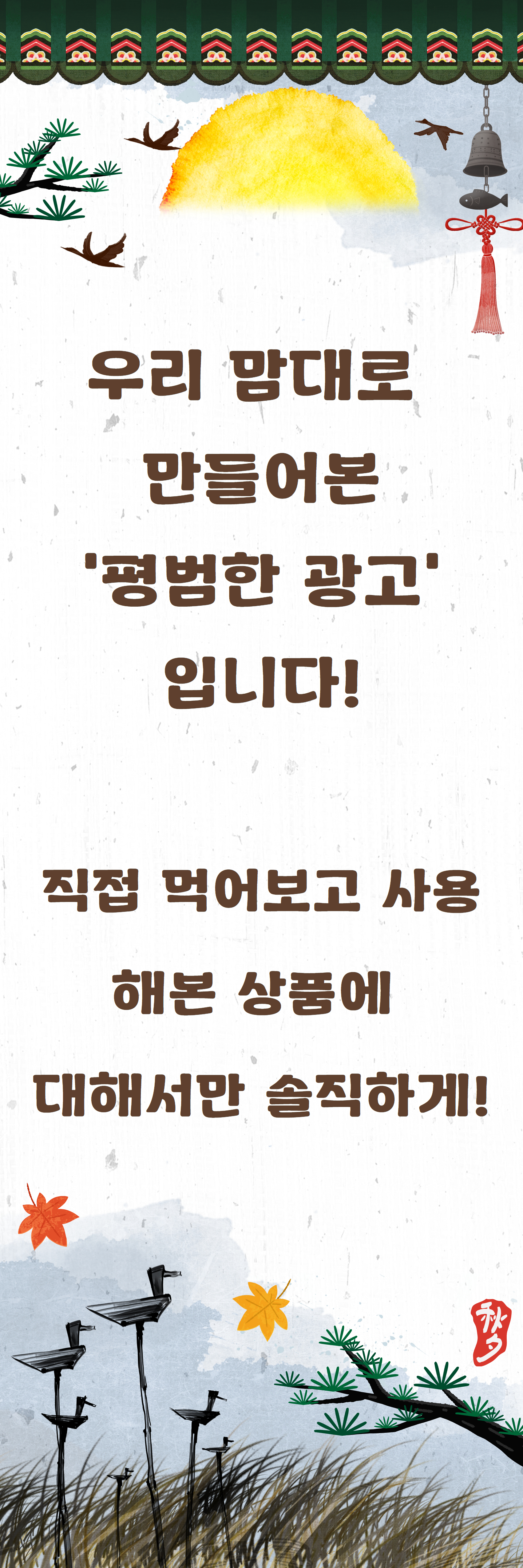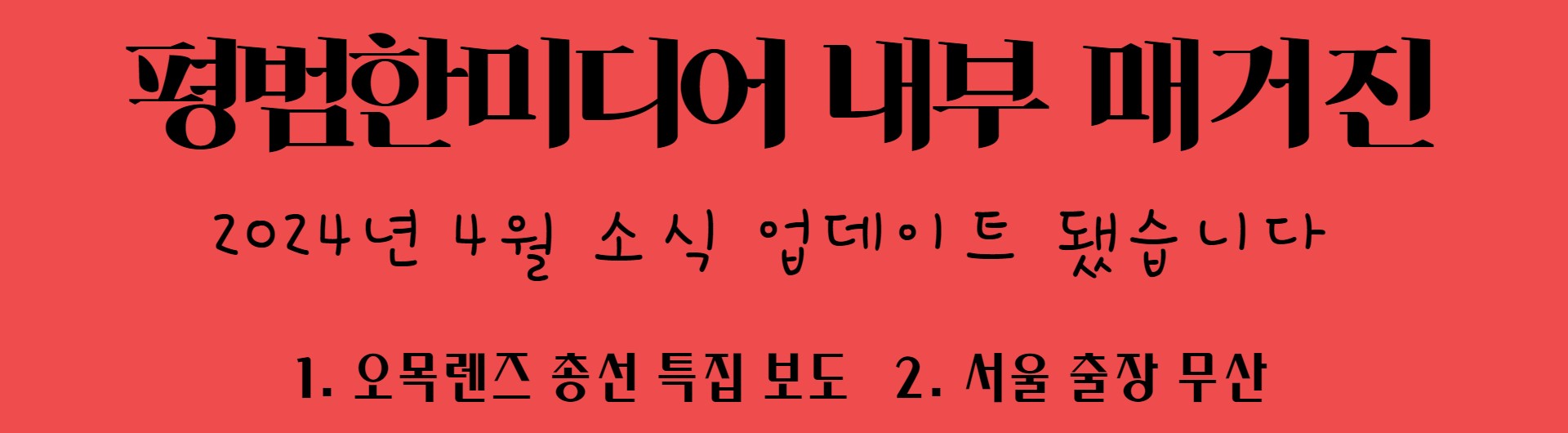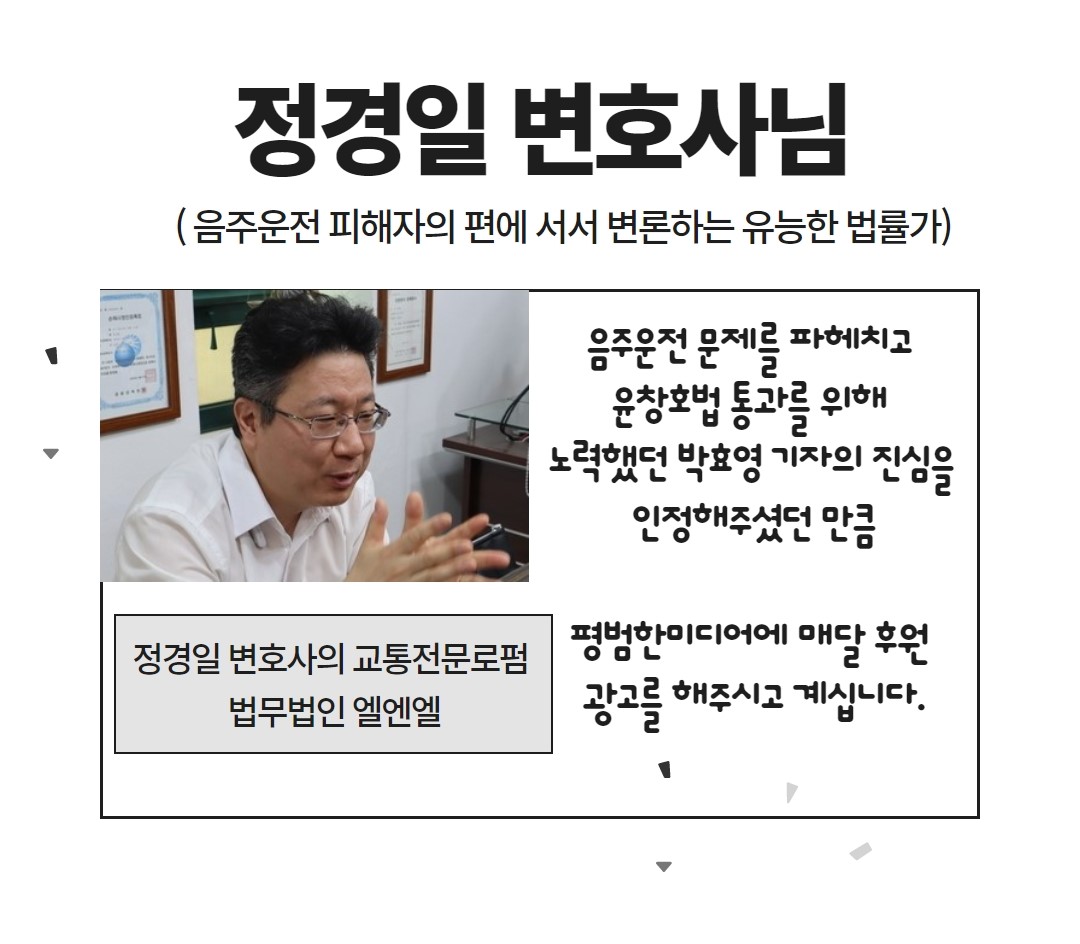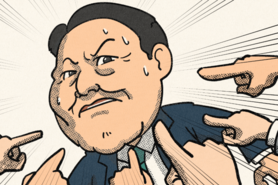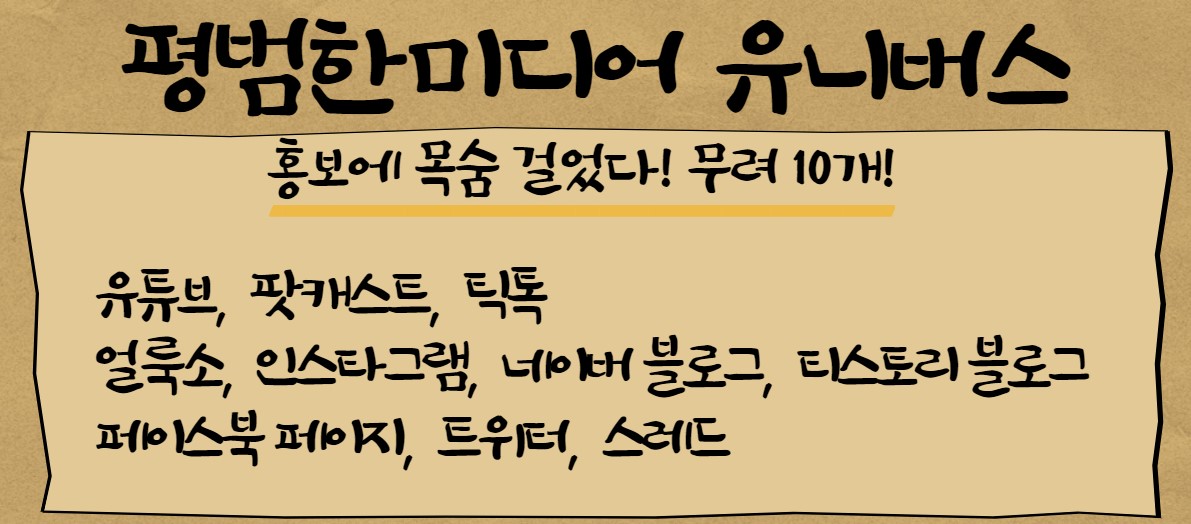경보음이 울렸다, 그것도 20번이나. 설비에 문제가 있다는 요청에 정비를 하러 언제나처럼 일터로 나가 혼자 정비를 하고 있었다.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작업 지휘자는 온데간데 없다. 그게 그에겐 당연한 일이었다.
'쿵'
갑자기 커다란 소리가 났다. 아뿔사, 갑자기 설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재빨리 문을 열었다. 자동으로 설비를 멈추는 안전장치인 '인터로크'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을 열어도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바이패스키(철판)'가 꽂혀 있었다. 안전장치는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그렇게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혼자 일을 하다 홀로 눈을 감은 거다. 숨지는 그 순간까지 그를 도와줄 동료는 주위에 단 1명도 없었다.
한국GM 보령공장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4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끼어 숨졌다. A씨는 정해진 기한에 생산물량을 맞추느라 전원 차단도 없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나 평소 혼자서만 설비 10대 이상의 운전과 점검을 도맡아왔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설비 운전은 혼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수리까지 해서 정상 가동하는 작업은 혼자 감당할 수 없다. 통상 1개의 설비에서 하루 적게는 2차례, 많게는 20차례 이상 경보음이 울리기 때문이다.

전국금속노조에 따르면 20일 A씨는 자신이 담당하던 '젠트리 로더'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설비 이상을 알리는 에러코드가 떴고 A씨는 작업 지휘자도 없이 혼자서 설비 안으로 들어가 확인 작업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뒤늦게 설비와 제품 사이에 A씨가 끼어 있던 것을 동료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다시 눈을 뜰 수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92조 3항에 따라 사업주는 정비 등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작업 방법으로 인해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현장에는 A씨만 존재했다.
노조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인력이 더 투입되거나 설비를 멈추고 점검을 하면 A씨와 같은 사고를 줄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설비 전원을 끄면 멈출 때까지 5분 이상 소요되고, 다시 가동할 때 그만큼 시간이 필요해서다"며 "특히나 설비가 오래됐고, 작업 때 쓰는 가공유 때문에 센서에 이물질이 껴서 오류가 자주 발생했었는데 더더욱 생산량이 적다고 압박을 심각하게 받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고음을 확인하기 위해 밀린 작업을 중단하고 A씨가 있던 곳으로 올 수 있는 노동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찌됐든 현장에 작업 지휘자가 없었다는 점이 치명적이었다.

현행법상 한 사람이 몇 개 설비 이상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 같은 것은 없지만, 위험 업무 현장에서 지켜야 할 규정은 있다. 업무가 심각하게 과중된 상황이었다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장에 있어야 할 존재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가 사업주의 방치로 인해 벌어졌다는 것이 문제다.
보령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해당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10명을 투입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