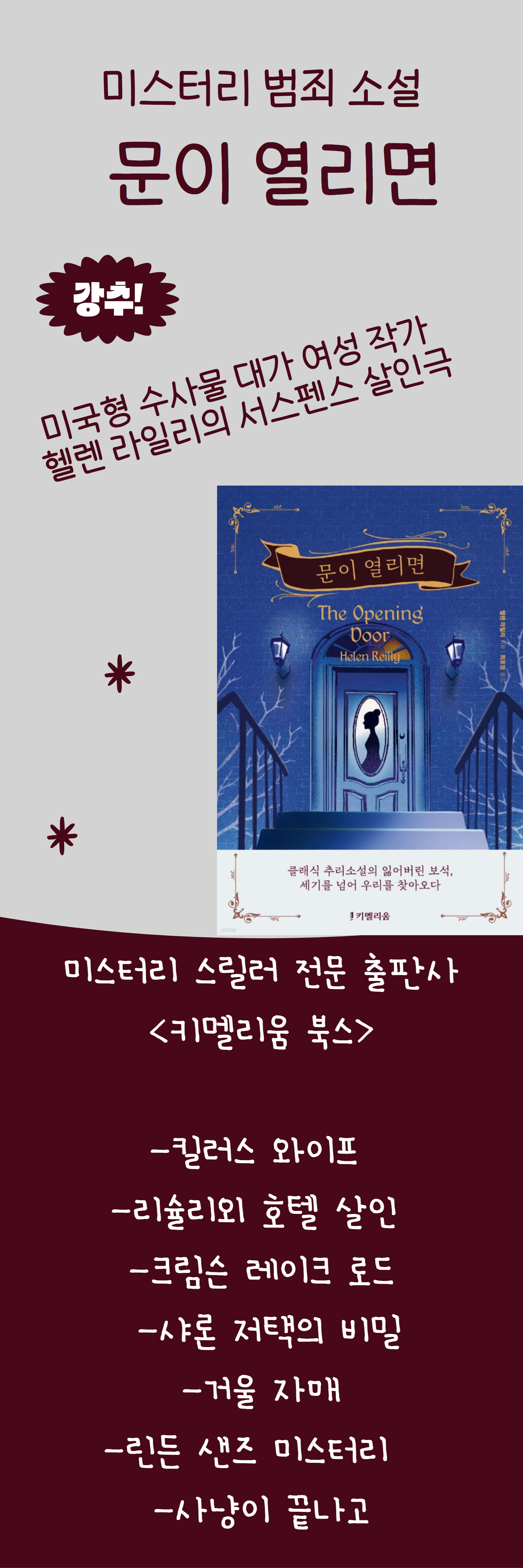[평범한미디어 라이트디퍼] 얼마 전 故 조세희 작가의 타계 소식을 들었다. 조세희 작가의 소설을 많이 읽어보진 못 했지만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학창시절 나에게 깊은 인상을 준 소설이었기에 급하게 다시 한 번 읽어봤다. 소설은 아래와 같이 시작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장이었다.
왜소증인 주인공의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1970년대 빈민촌이 소설의 배경이다. 주인공인 영수의 가족은 어느날 철거 계고장을 받게 된다. 영수의 아버지가 한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집은 도시 재개발의 명목 하에 강제 철거가 결정되고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둘 중 하나다.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고 이주 보조금을 받거나. 실상 입주할 아파트 대금을 낼 돈이 없는 가족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보조금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입주권을 파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채권 매매, 칼 갈기, 고층 건물 유리닦기, 펌프 설치하기, 수도 고치기 등 닥치는대로 노동을 하며 가정을 꾸려왔으나 현실은 가족들과 휴식을 취할 작은 집도 가질 수 없을 만큼 가혹했다. 영수 또한 공부를 계속하고 회사에 취업하여 가난의 굴레를 끊어버리는 것을 꿈꿨지만 몸이 쇠약해진 난장이 아버지, 어머니, 2명의 동생들과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동생들 역시 영수처럼 몇 달 간격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공원이 되거나 빵집에서 일하며 어린 나이부터 생업에 매달리게 된다.
영수와, 동생 영호가 일하는 공장의 사장은 공원들을 격리시키고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한다. 부당함을 느낀 형제가 다른 공원들과 사장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약속한 날 그 자리에 나온 사람은 두 형제 뿐이었다. 결국 영수와 영호는 공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얼마 후 영희도 사라지며 가정 형편은 더욱더 어려워졌다.
난쏘공은 1970년대 산업화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본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는 공장주나 도시 개발에 연관된 관계자들이 부를 쌓아올리는 사이, 원래 그곳에서 터전을 일구고 살던 빈민들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양극화의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그 시대 공장 노동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은 주어지지 않고 더 큰 희생을 요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되었으나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그야말로 장식에 불과했다. 현재까지도 한국의 노동권은 열악한 편이다. 1970년대의 작업 환경은 얼마나 열악했을지 안 봐도 유튜브다. 故 전태일 열사가 법전과 몸을 불태우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조세희 작가는 2005년 난쏘공이 200쇄를 찍는 기록을 세우자 "이 책이 200쇄를 넘겼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발언을 남겼다. 그로부터 한참이 지났지만 2023년에도 여전히 한 평 남짓한 쪽방촌이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무임금 연장 근로를 강요당하며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건이 꽤 자주 발생하고 있다. 조세희 작가의 1주기 추모일에는 난쏘공이 그저 소설에만 존재하는 과거의 어두운 잔재로 남게 되길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