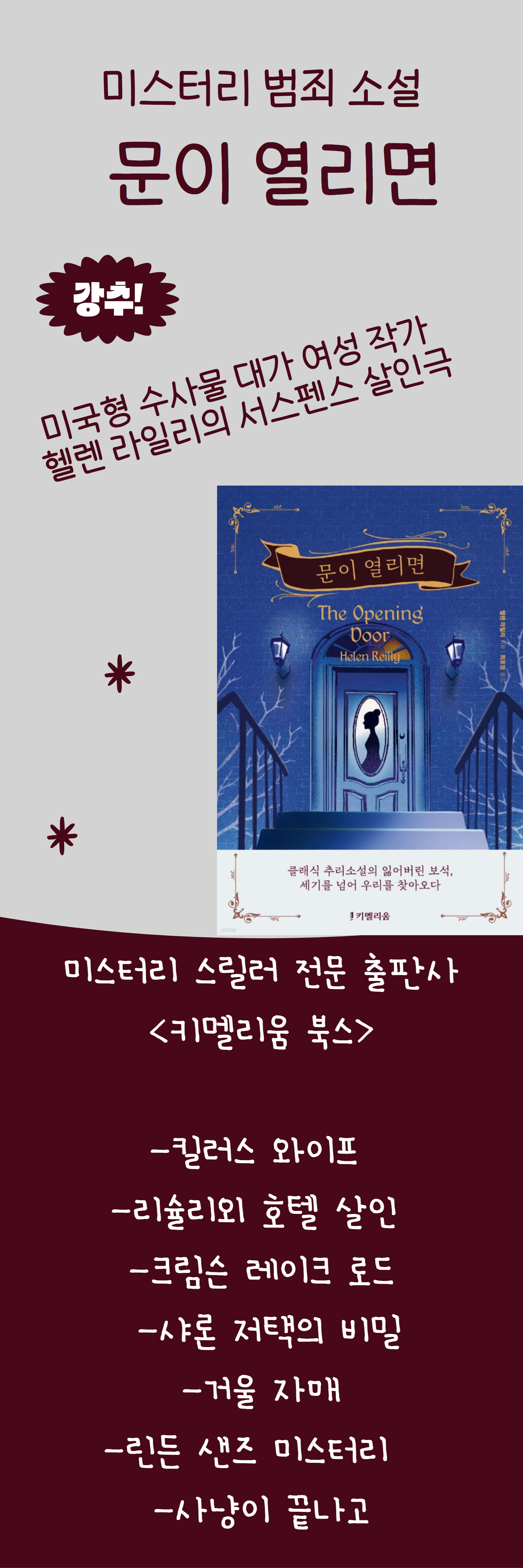#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6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칼럼니스트] “뭔가 잘못됐어.” 거울 속에 비친 내 몸이 낯설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아말피 해안’(이탈리아 캄파니아주)에 뛰어들기 위해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내 몸을 보니 수영을 하기 싫어졌다. 수영복으로 갈아 입은 내 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언제 이렇게 살이 찐 걸까. 타이트한 수영복 사이로 삐져나온 허벅지살과 겨드랑이살은 아무리 봐도 눈에 익지 않았다. 이 방엔 분명 혼자 있는데 나는 너무 창피했다. 할 수 있다면 원하는 모양대로, 원래 그렇게 존재해야만 하는 모양대로 몸에 붙어있는 살들을 잘라내고 싶었다. 그러니까 ‘몸매’도 준비하지 않고 감히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즐기려고 한 것이다. 한국에 있었을 땐 더워지기 시작하면 여름을 대비한다며 무작정 굶기 시작했다. <7일 안에 비키니 몸매 완성하기>와 같은 제목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며 그 속에 나오는 아름답고 마른 여성들이 소개하는 극단적인 식이요법과 운동 방법을 열심히 따라하기도 했다. 수영복이란 이런 철저한 준비 후 완벽한 몸매가 갖춰져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나? 지금 내 몸은 수영복에게 무례를 범한 셈이다.
방에서 나와 함께 온 친구에게 수영복 차림을 보여주며, 커진 내 몸이 적응이 안 된다고 불안해했다.
What the fuck are you talking about? You‘re beautiful now. (너 X나 뭐라는 거야. 너 예뻐.)
괜찮다는 친구의 반응도 날 전혀 안심시키진 못 했다. 그래도 아말피까지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영복 차림으로 쭈뼛쭈뼛 친구의 손을 잡고 해변으로 향했다. 반짝이는 햇살, 맑은 바닷물, 빛나는 검정 자갈이 가득한 해변엔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로 가득했다. (내 관점에서) 그들의 몸은 전혀 비키니에 준비되지 않았다. 그런데 배, 허벅지, 엉덩이까지 훤히 드러낸 채 바닷물에 뛰어들었다. 뱃살을 가려주는 든든한(?) 수영복을 입은 건 나 혼자였다. 심지어 내가 가장 말랐고 몸집도 작았다. 나도 그들과 똑같은 몸을 가졌는데 왜 내 몸은 항상 말라야 했던 걸까? 나보다 몸집이 큰데 저들은 너무 행복하게 아말피 바다를 즐겼다. 그들을 보니 몸은 늘 예뻐야하는 ‘대상’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장기가 담긴 ‘그릇’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혼자 방 안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후에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처럼 양손에 얼굴을 묻고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시간에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어떤 모습의 나도 다 받아줄 수 있다는 묘한 자신감. 최고의 친구가 영원히 내 곁에 있는 느낌이려나. 그게 바로 자존감이고 자신감일 것이다.
해변 위를 걸을 때마다 부푼 나의 허벅지살이 살짝씩 쓸렸다. 낯설지만 이것도 나의 모습이었다. 바로 나 조은비다. 돌이켜보면 한국을 떠나 비엔나로 왔을 때 나는 말라비틀어져 있었다. 불안한 사업과 자꾸 실패하는 연애, 심지어 뱃살까지 통제하려 애쓰며 편하게 지냈던 적이 거의 없었다. 6개월간 비엔나에서 쉬면서 마음은 몰라보게 회복되었고 몸도 오랜만에 원하는 크기대로 부푼 것 같다. 그렇게 나도 푸른 바닷물에 뛰어들었다. 몸의 크기가 어떻든 비키니를 입고 즐거워하는 저 사람들처럼 원래 나도 나를 사랑한 척, 그들 사이에 끼어 물장구를 쳤다. 시원하고 맑은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다. 자유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