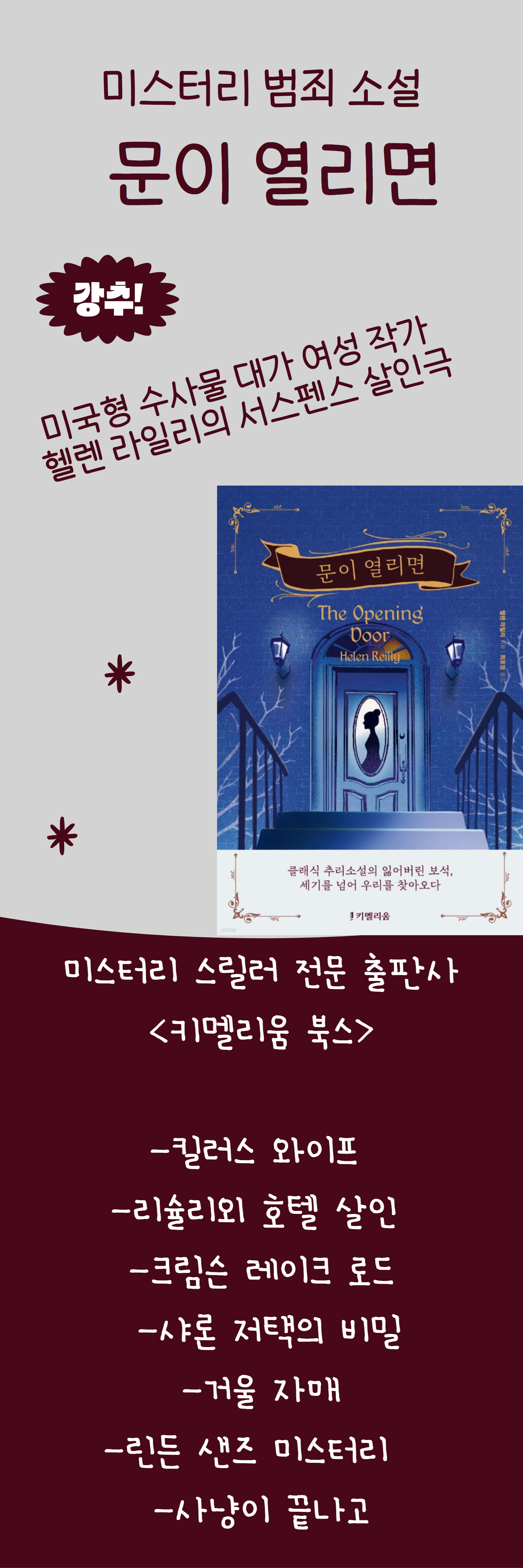#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9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길거리에 날아다니는 비닐봉지도 개로 착각하고 설레는 사람. 개덕후인 나를 가장 잘 소개하는 문장이다. 비엔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음악 축제에 인명구조견들이 시범을 보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늦잠으로 떡진 머리도, 뙤약볕 아래 걸어서 30분을 이동해야 하는 무대 위치도, 수많은 축제 인파도 나를 막을 순 없었다. 불굴의 의지로 무대 바로 앞까지 나아가 자리를 잡았다.

핸들러와 호흡을 맞추며 장애물들을 통과하고, 냄새로 사람을 찾아내는 구조견들의 모습에 환호와 박수를 멈출 수 없었다. 내 앞엔 아담한 크기의 골든리트리버 구조견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금색 털은 땀에 쩔어 축축했고, 분홍빛 혀는 입 밖으로 축 늘어진 채로. 골든리트리버 특유의 천사 미소는 잃지 않았다. 그 친구는 기다림이 지루해서인지 자꾸 뒤에 있는 나와 눈이 마주쳤다. 급기야 핸들러의 손에서 빠져나와 내게 안기기까지! 감동에 겨워 그 친구의 땀에 양손이 축축해질 때까지 온몸 구석구석 마구 만져주었다. 넌 정말 예뻐! 사랑해! 사랑해!
“레오! 레오!” 핸들러는 난감한 듯 이름을 불렀다. 그 친구의 이름은 레오였다. 내가 6년간 돌보았던 길고양이도 레오였다. ‘오레오’ 과자처럼 검정색, 흰색, 검정색 턱시도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레오가 되었다. 내 손바닥 크기였던 아기 고양이는 물과 먹이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 늠름한 성묘가 됐고 좀처럼 곁을 주지 않던 성격도 조금씩 달라졌다. 언젠가부터 먼저 다가와 다리에 머리를 비비고, 손가락을 내밀면 가만히 코를 부딪히며 인사도 했다.
레오가 달라진 것처럼 나도 달라졌다. 학생이었다가 아무 것도 되지 못 한 채 졸업을 했고, 원하던 회사에 불합격했고,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뒀고, 7평짜리 원룸에서 주얼리 공방을 시작했다. 불안하고 외로웠다.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주차장으로 향했다. 이름을 부르면 레오는 어디선가 달려나와 내 오른쪽 다리에 엉덩이를 붙인 채 앉아있었다. 고시촌 골목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와 서울에서 혼자 어른으로 서보겠다고 이리저리 부딪히는 청년. 우린 뭔가 비슷했고 연결된 것 같았다.
예전에 트위터에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키우지는 못 하면서 착한 척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문장을 접한 적이 있다. 사실 그게 바로 나였다. 끝내 레오를 입양하지 못 했고 결과적으로 레오의 짧은 묘생에 영향을 미쳤다. 변명은 이랬다. 쉐어하우스에 살았고 벌이가 불안정했다. 아픈 레오를 평생 책임질 자신이 없었다. 매일 밥을 챙겨주고 가끔 약을 챙겨주는 게 최선이었다. 지금도 가끔 입양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악몽을 꾼다. “넌 레오를 이용했어.” 레오는 비가 내리던 2021년 11월의 어느 날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정확한 날짜를 쓰지 못 하는 건 레오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 했기 때문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레오는 늘 만나던 주차장의 오래된 아반떼 밑에서 힘겹게 숨을 들이키고 있는 모습이었다. 차 밑으로 좋아하는 간식을 몽땅 밀어 넣어도 물만 마셨다. 그렇게 싫어하던 물을 계속 마셨다. 그 이후로 며칠간 레오가 제일 싫어하는 비가 계속 내렸다. 이후로 더는 레오를 볼 수 없었다.
다시 비엔나. 내 손길에 몸을 맡긴 구조견 레오는 해맑게 웃고 있다. 눈이 뜨거워졌다. 어쩌면 털어버려야 할 과거인데 마음은 그 죄책감을 잊지 말라고 눈을 부라린다. 동물들의 행복한 모습에 슬픔이 녹아내릴 때마다, 보호소 입양 공고를 뒤적이며 조심스레 입양을 꿈꿔볼 때마다, 이러한 죄책감은 무척이나 유용했다. 그 동물들에겐 나보다 더 나은 보호자를 만날 기회를 주고, 나는 돈에 더 쪼들리지 않게 될테니까. 자기 차례가 되자 무대로 올라간 레오는 뛰어난 후각 능력으로 구해야할 사람을 단 번에 찾아냈다. 박수도 눈물도 멈출 수 없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고양이 레오를 더는 주차장에서 만날 수 없게 됐을 때 상담 선생님을 붙잡고 오열하며 말했다.
선생님 제가 슬퍼할 자격이 있을까요? 레오를 그리워할 자격이 있을까요?
나를 웃게 하고 큰힘을 주었던 두 레오에게 감사하고 미안하다. 이 땅의 모든 레오들이 살아가는 동안 인간들에게 사랑만 받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