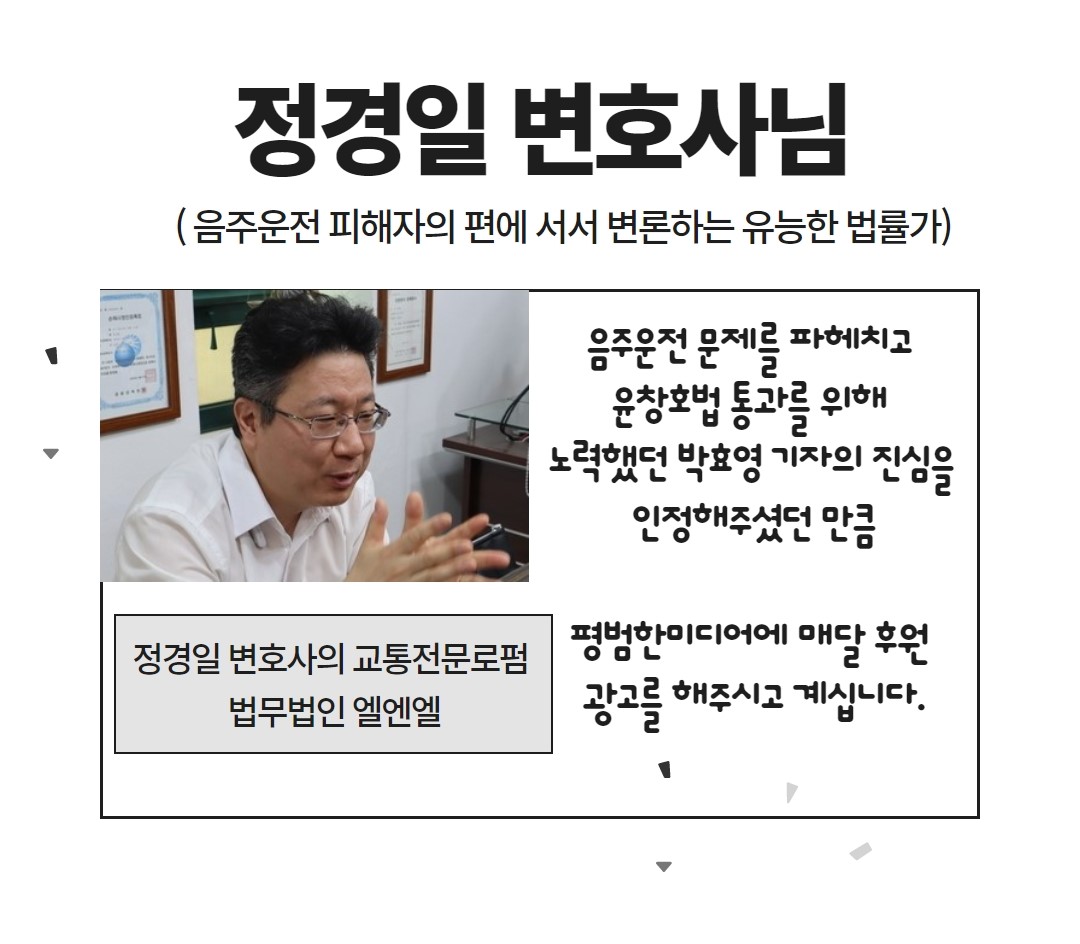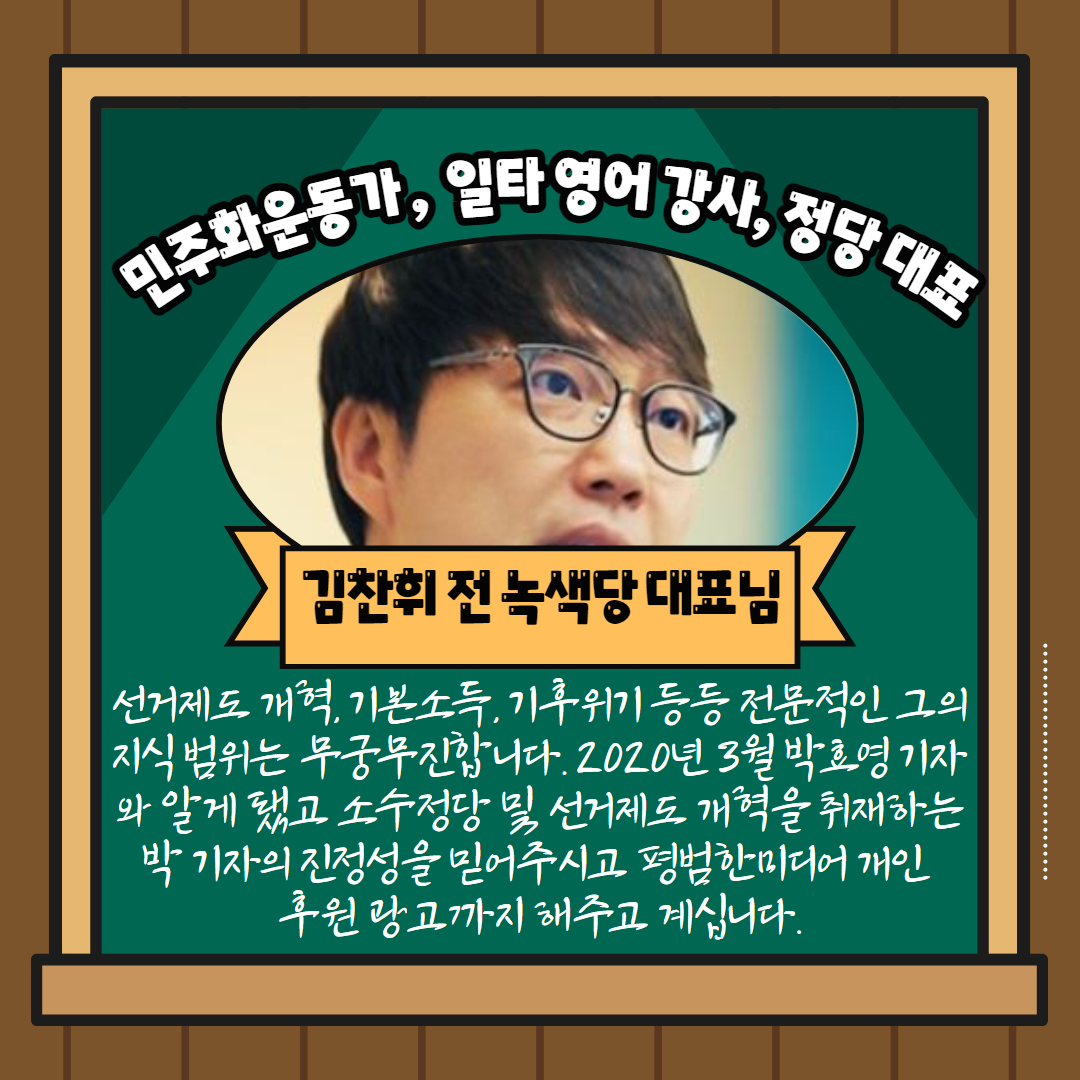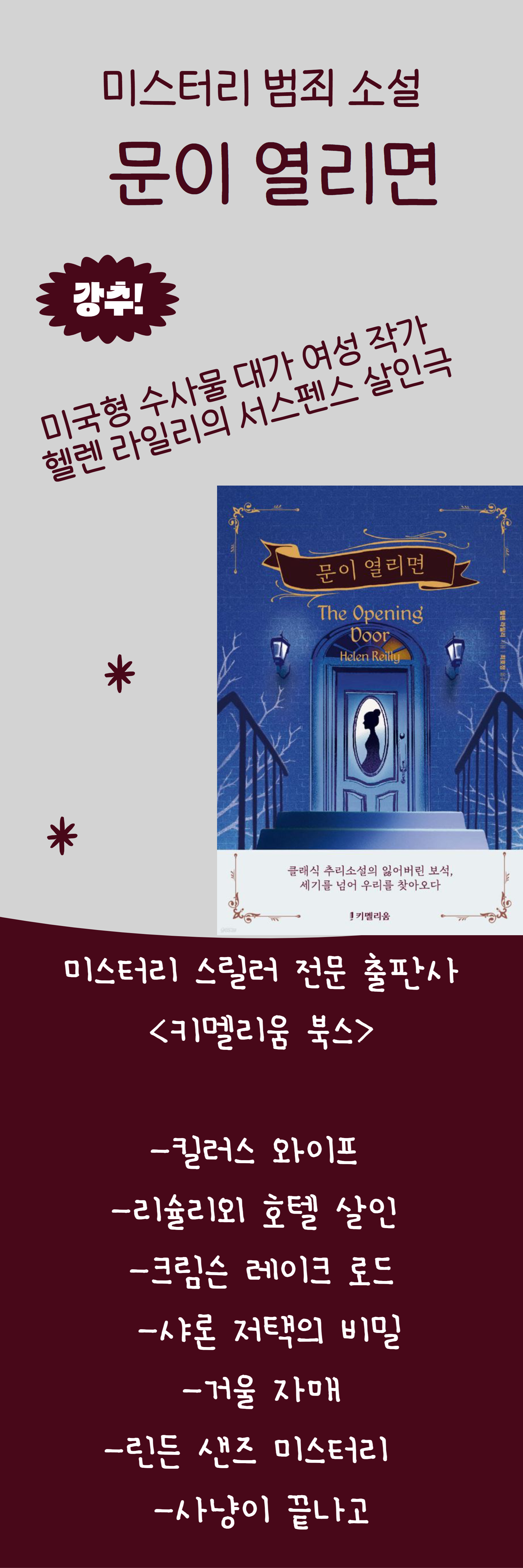[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1963년부터다. 당시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고사하고 목적도 분명치 않았고 현장실습이 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조차 없는 상태였고 이는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한 가지 정부와 기업이 정한 현장실습의 암묵적인 룰은 '노동력 공급'을 통한 '산업화의 가속화'를 모색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즈음에야 노동권에 대한 관점이 자리잡기 시작했지만 이 지점을 터닝포인트라고 할 수는 없었다. 정부는 고교생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실습제를 확대했고 적응이 필요하단 이유로 일터에 나간 학생들의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 속에서 정부와 기업을 위한 수요 및 공급의 단위로만 이용되고 있었다.
20년도 더 된 제도이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음은 물론 제대로된 기업 정보조차 모르고 일터로 나갔다 다치고, 심하게는 목숨을 잃는 상황이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장실습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조차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 하는 것 같다.

현장실습제의 헛점은 시작부터 드러났다. 정부가 학교에 제공하는 현장실습 업체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현장실습 담당 업체의 규모 등 취업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특성화고 포털 '하이파이브'에 나온 상시 근로자 수 및 기업의 재무 규모는 교육부가 학교에 제공하는 기업 참고자료와 전혀 다르다. 선도 기업으로 선정된 곳도 마찬가지다.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될 수 없는 이유다.
대전에 있는 모 직업계고 교사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결국 교사들이 회사 이름이나 전화번호 정보만 확인하고 기업에 연락해 구체적인 것들을 일일히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부는 기업을 선졍하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그것 뿐이라고 하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업체의 질적 정보나 안전 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전혀 없다는 거다.

또 다른 충청지역 직업계고 교사는 "여러가지 요소를 충분히 점검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학교에 제공해주기 전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지고 크로스체크를 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닌가"라며 "구체적인 정보도 모르고 투입돼 숨진 학생들도 있는데 교사 입장에서 제대로 모르는 기업에 학생들을 떠민다는 게 마음이 불편하다.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또 있다.
그것은 바로 '산업재해 다발 기업' 여부가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아 업무 위험도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교육부의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 그런 정보가 명시돼 있지만 가장 최근의 산재 정보는 2019년 것에 불과하다. 왜 작년과 최근 자료는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공시자료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최근의 산재 정보가 반영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한 민감성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 자꾸만 아이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부가 현장실습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