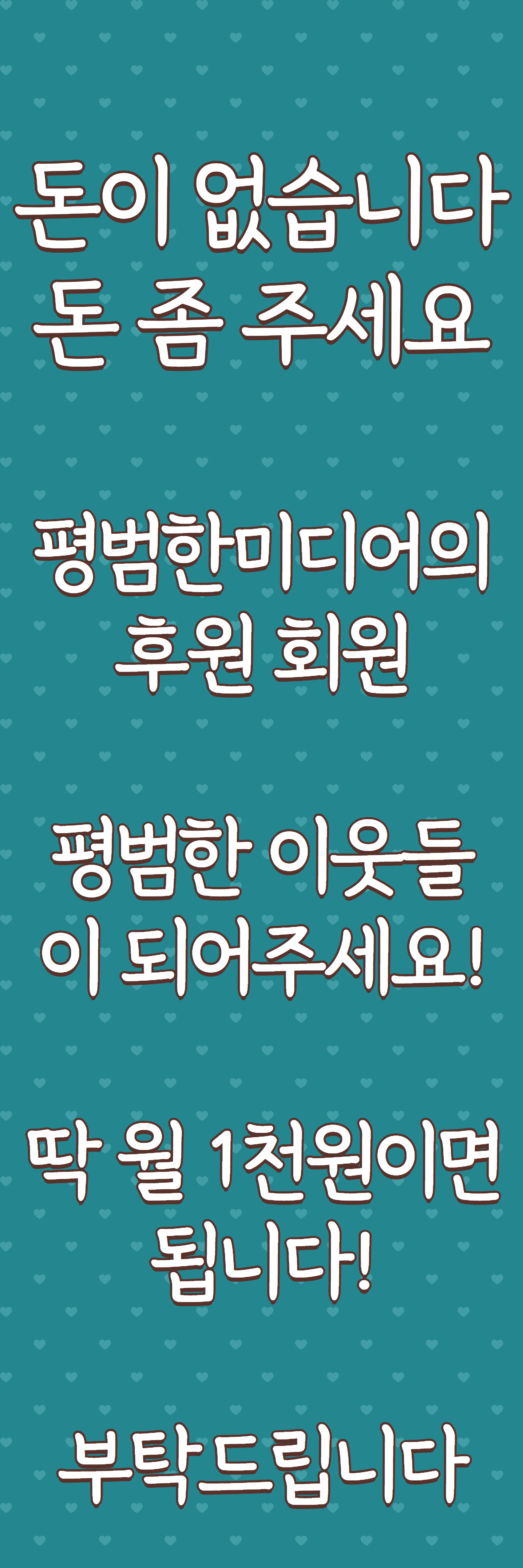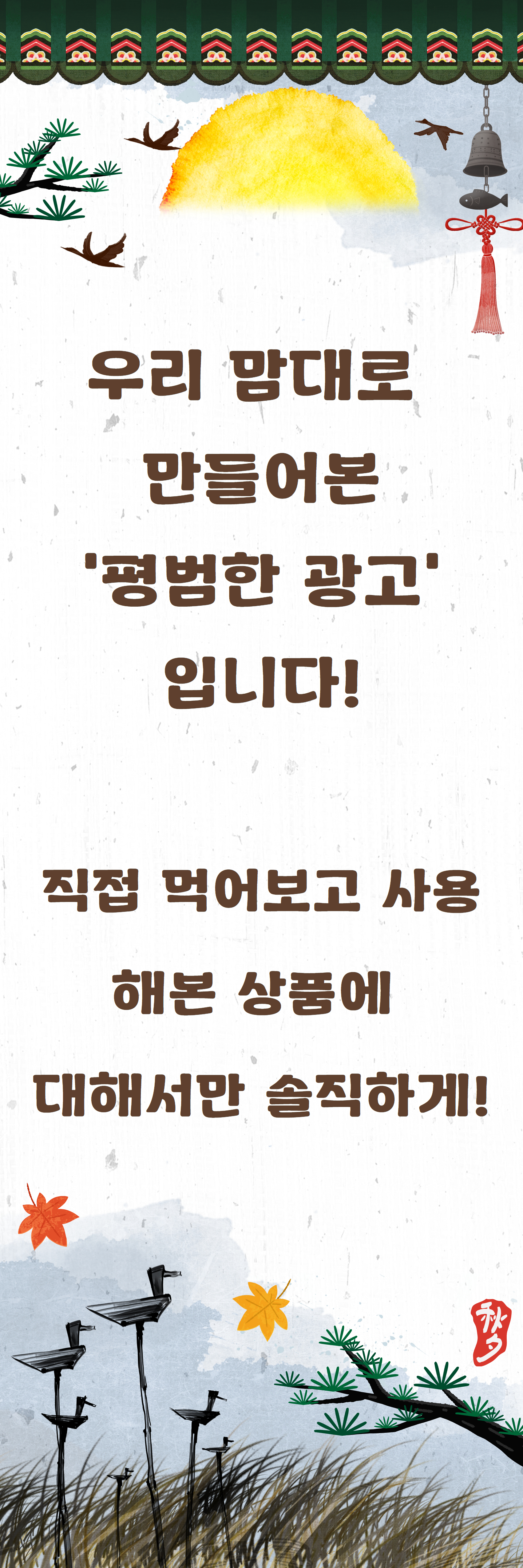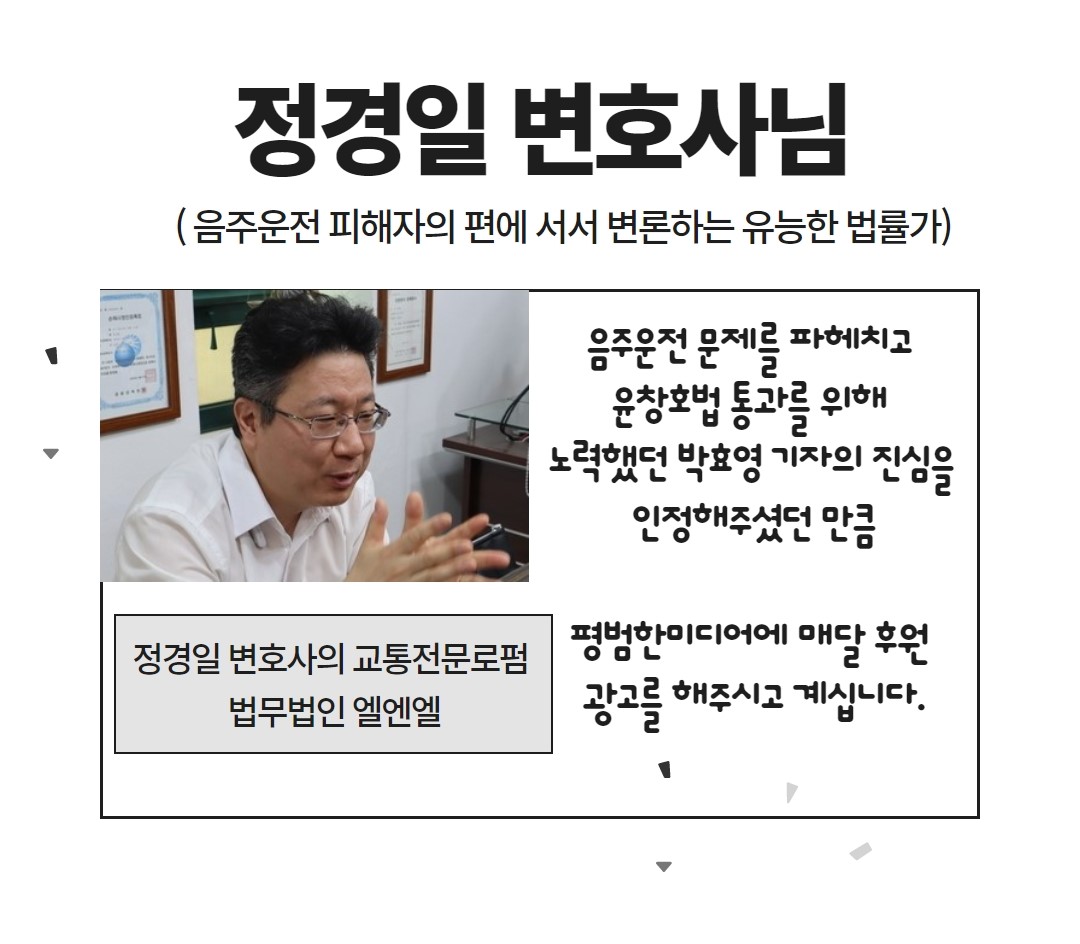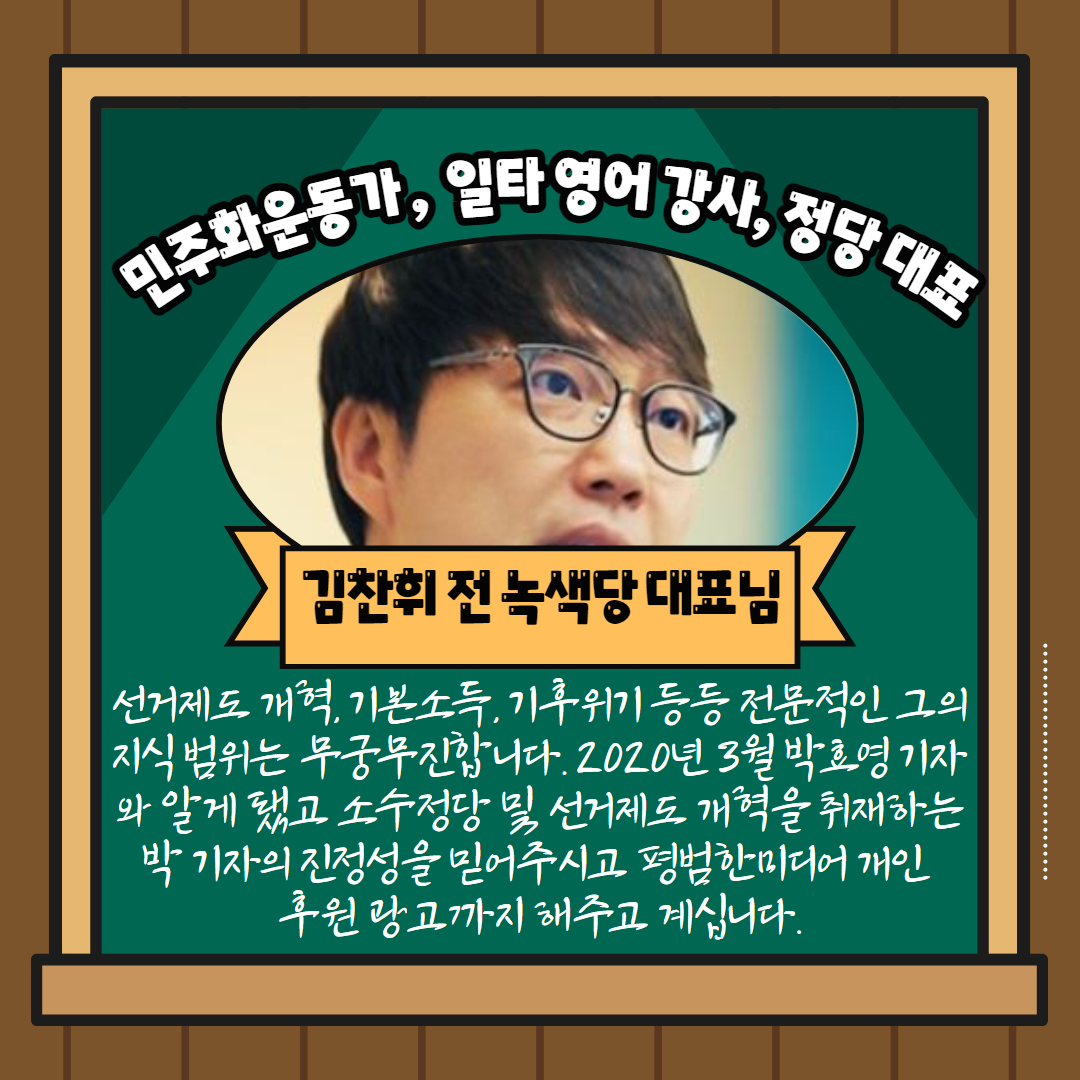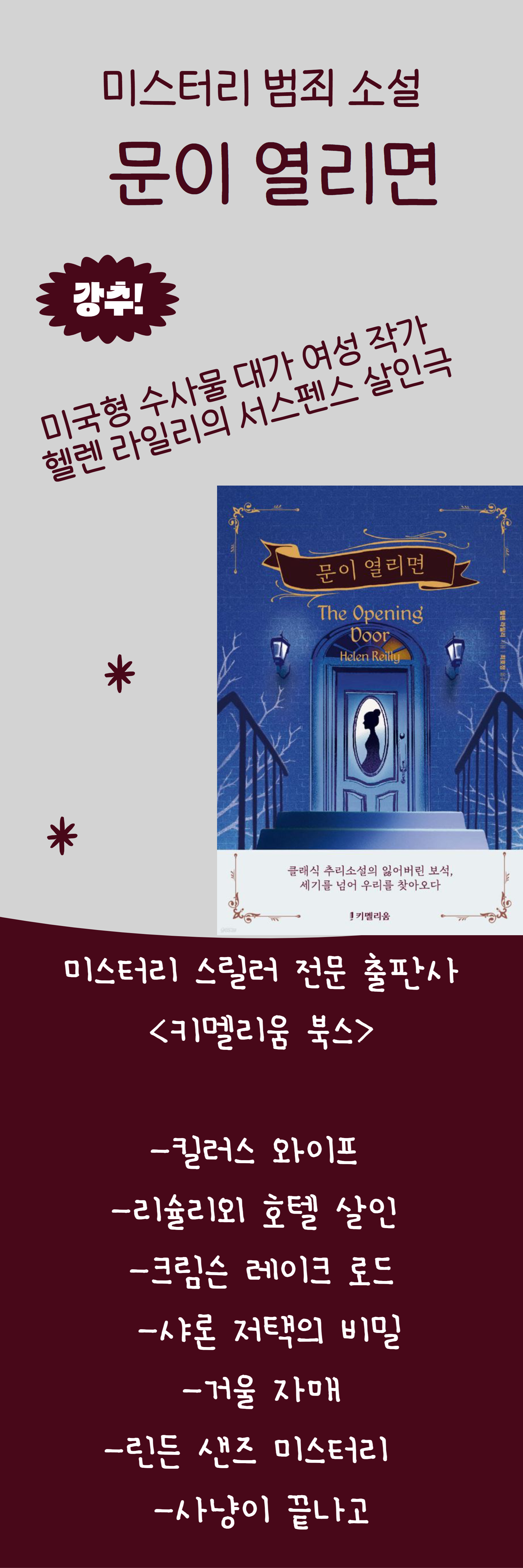[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영원히 18세에 머무를 줄 알았던 나는 어느덧 20대 중반이 됐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지 어느덧 3년이 됐다. 진정으로 바래왔던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간 보낸 어느 시점보다도 나는 '소비'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나와 우리, Z세대의 현주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누군가 각 시장의 트렌드를 알려면 Z세대에 주목하라고 했던가,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생활의 디폴트로 깔고 자라났다. 이를 디딤돌 삼아 세계화된 문명만큼 글로벌한 소비법으로 완전 무장했다. 이만큼 공략해야 하는 소비계층이 또 없다는 말이다. 여러 인플루언서들은 2021년 소비시장을 장악할 필수 키워드에 'Z세대'를 꼽는다. 가장 발 빠르게 이들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소비패턴을 읽어낸 사람들이 승자가 되는 거다. 이들이 집중하는 것은 Z세대의 정서, ‘외로움’이다.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그들의 ‘외로움’을 팔아야 하는 거다.

Z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경제호황기를 겪고 자란 탓에 구매력이 높고, 유행에 민감해 소비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세계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공유하는 가장 대표적 정서는 ‘외로움’과 ‘공허함’이다. SNS를 통해 타인과 항상 연결돼 있다고 여기지만 그래서 더 결핍을 느끼기 때문이다.
외로움의 크기는 소비욕구의 깊이와 비례한다는 게 나의 정설이다.
이런 Z세대의 니즈에 발맞춰 소비시장에는 ‘혼(자) 라이프’에 관한 콘텐츠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인 가구 연예인의 생활을 밀착 취재하는 방송 프로그램부터 1인 전용 식당, 혼자인 사람들을 위한 에세이까지. 온 사회가 파편화되고 개인화되어 버린 그들의 인간관계 맥락을 읽고, 그들의 욕구에 맞는 셀링 포인트를 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거다.
Z세대는 블랙홀과 같다. 끝없는 공허함에 익숙해 끝없이 물건을 사고 또 산다. 그러나 그마저도 쉽게 지치고 포기한다.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한다. 과장한다면, 나는 이 세계가 사르트르의 ‘타인은 지옥’이라는 개념을 밑바탕에 둔 디스토피아로 변화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든다. 깊은 관계보다 표면적인 관계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Z세대가 느끼는 외로움,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런 순리일지도 모르겠다.
외로움이 없는 세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로움이 한 세대의 정서로 번질 만큼 사회 분위기가 날 서고 각 졌다는 것은 참으로 씁쓸한 일이다. ‘혼자’라서 느끼는 외로움이 다수에게 공감 받는 콘텐츠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것, 안타까우면서도, 이해되는 일이다.

이 느슨한 연대라는 걸 묶어주는 건 같은 목마름을 갖고 있다는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 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 퍽 그렇지도 않다. 이해를 통한 깊은 관계의 회복보다도 맞지 않으면 그저 새 사람으로 그 빈 자리를 대체하려 한다.
놀랍게도 이건 Z세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과연 Z세대만 소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공식은 모든 세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공략보다는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Z세대가 시대적으로 외로움을 보다 타고났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읽어내려는 그들과 나, 그리고 당신의 관심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