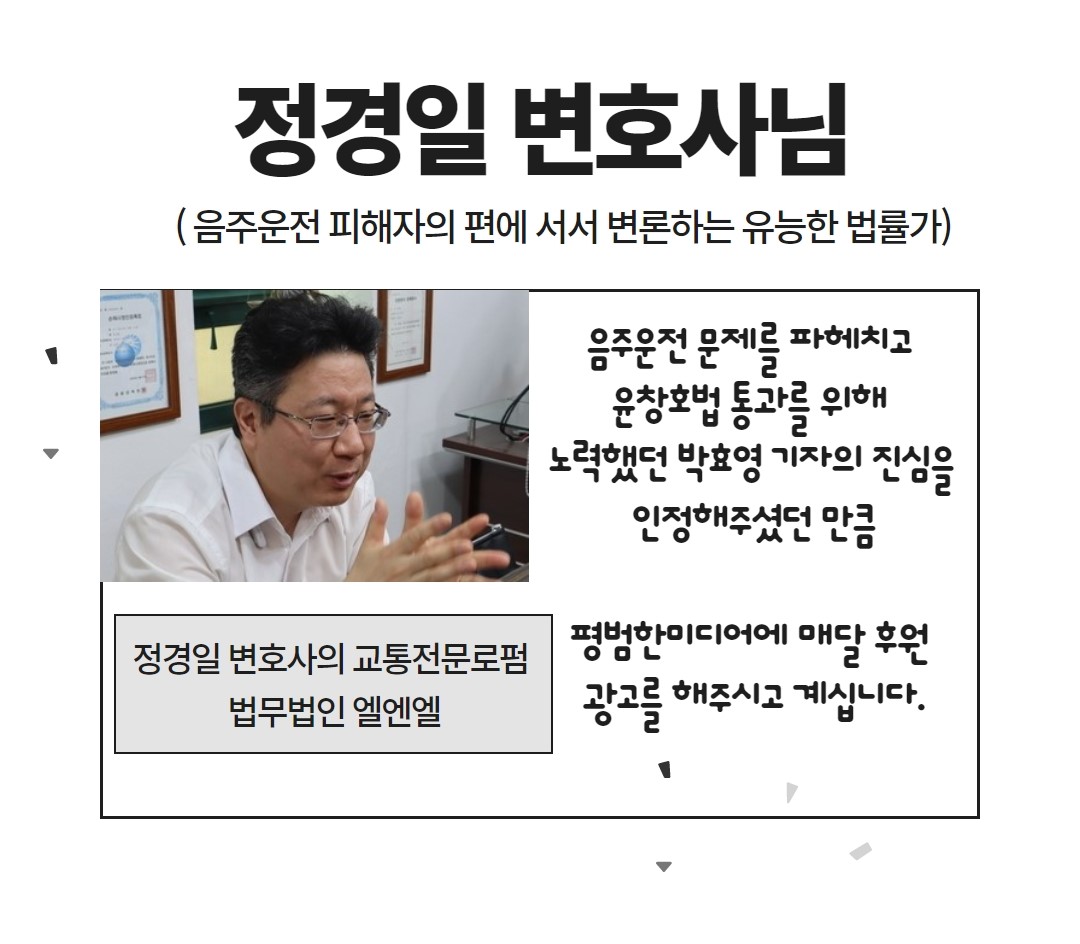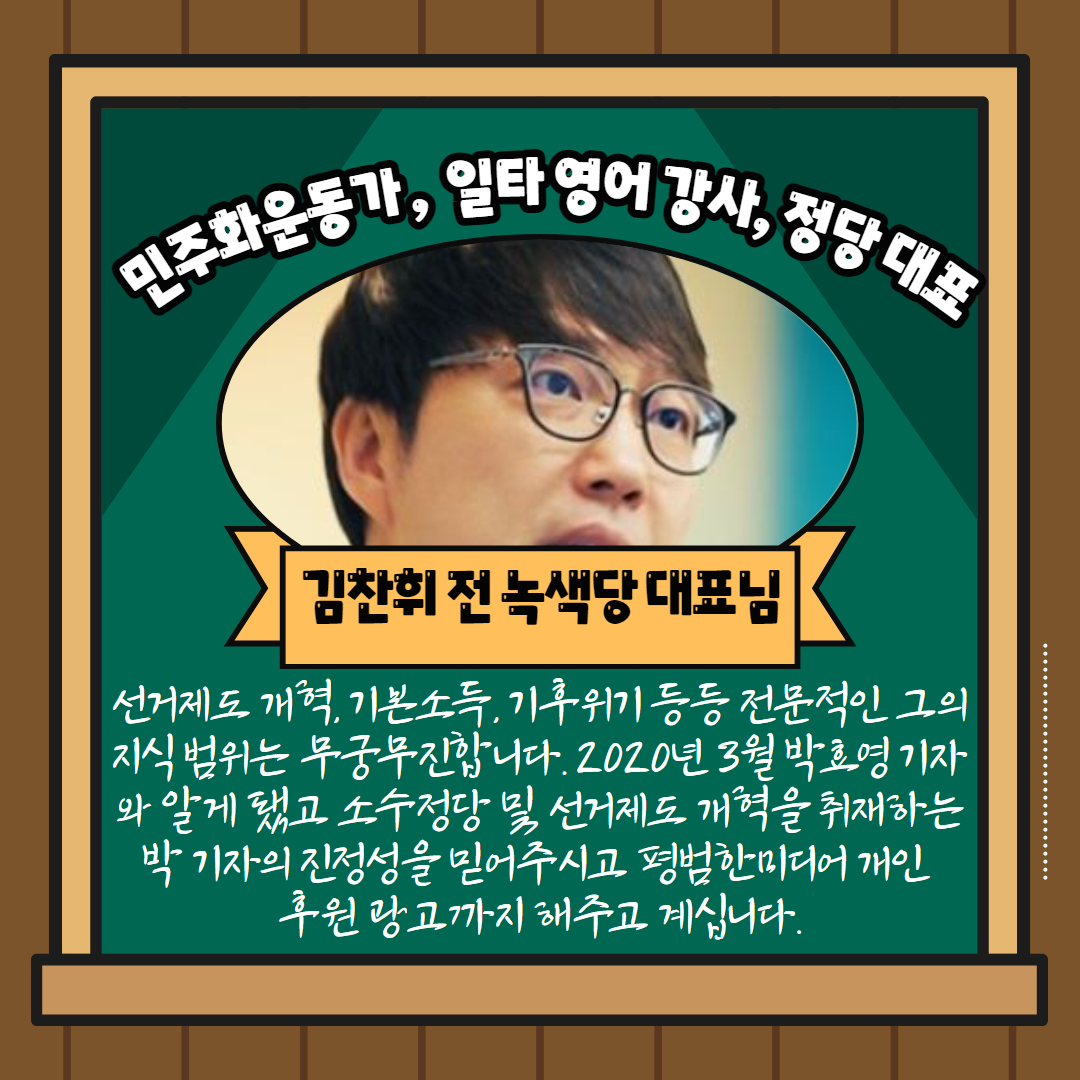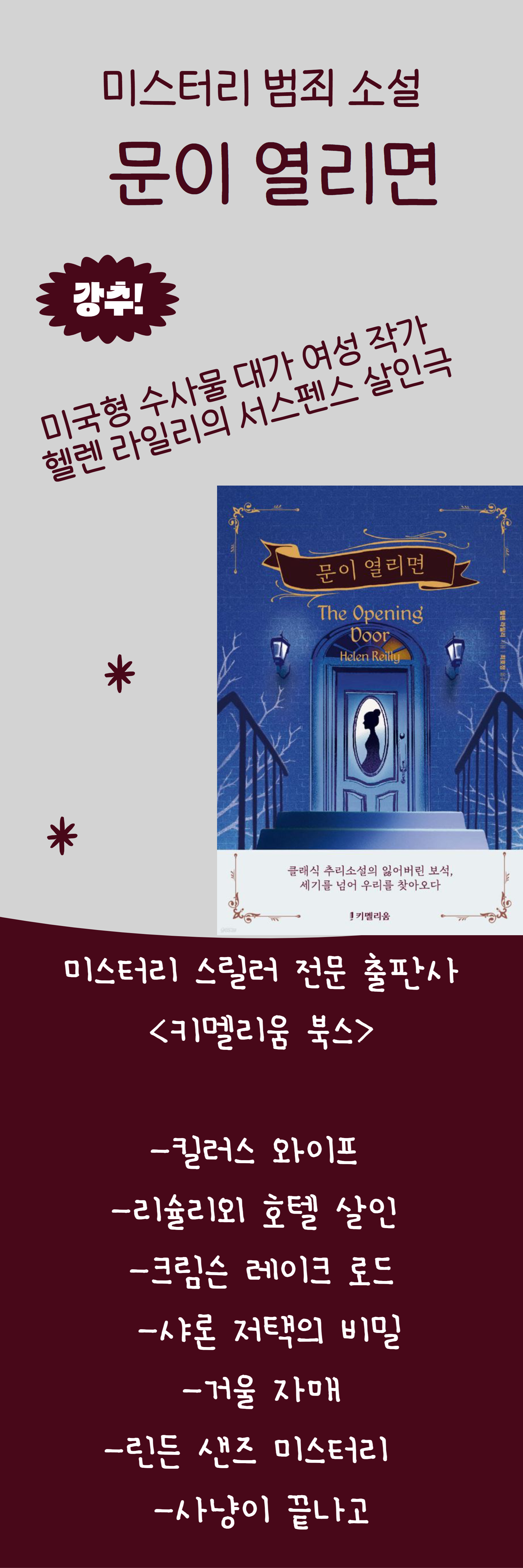[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평생 대도시에서만 살았다. 스스로 “도시 여자”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코로나가 막 시작할 즈음 제주도로 내려와서 살고 있다.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요이씨는 22일 15시 전남대 제1학생마루 3층 소강당에서 개최된 <기후위기 시대 여성들의 바다와 땅 이야기>에 참석해 “도시 여자로만 살았던 것이 현실이다. 처음 제주로 이주했을 때는 사실 수영하는 법도 몰랐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이내 수영을 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다.
그냥 멀리서만 소비자로서 다들 한 번씩 관광지로 가는 것으로만 알고 그런 인상으로 (제주도를 인식하고) 살았던 것이 사실인데. (제주도로 와서) 매일 이제 바다 바로 옆에서 지내면서 마주하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헤엄치는 법을 바다에서 터득한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내 몸과 물과의 관계가 다시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다.

요이씨는 제주도 동쪽(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웃들은 전부 해녀다. 일과시간 요이씨가 바다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마다 해녀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된다.
어떻게 보면 정말 멀리서만 봤던, 미디어에서만 마주했던 해녀라는 존재를 이제 조금씩 더 가까이 이제 일상에서 마주하면서 정말 옆집에 계신 85세가 된 해녀들의 일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다. 정말 혼자서 다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렇다. 하지만 정말 60년을 혼자 해오셨다. 그렇게 그들의 일상을 알게 된 것 같다. 내가 도와드리면 해녀들께서 보답으로 항상 제철 음식들로 요리를 해주신다. 나도 해녀들과의 그 관계에서 자연의 흐름을 조금씩 인지하게 된 것 같다.
제주도에서의 삶과 새로운 영감. 요이씨는 예술가인 만큼 “제주도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매일 매일 “가슴 떨리는 순간들”이 너무 많다.
경험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내 작업으로 연결시키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헤엄치는 이유’라는 영상 작업을 하고 있다. 30여분 되는 에세이 형식의 어떻게 보면 바다 건너 사는 친구에게 쓰는 편지에서 시작된 작업인데. 그걸 넘어 바다에 사는 존재들과 바다 건너 사는 다양한 존재들과 대화하는, 되게 고독한 섬 안에서 내가 하는 그런 독백들과 편지 형식의 서사가 이어지는 작업들이다.
편지를 낭독하고, 함께 듣고, 대화를 하는 것인데 요이씨는 “제주에 계속 있고 싶은데 너무 외롭더라”면서 “계속 여기서 지내려면 뭔가 사람들을 초대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러닝스페이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알렸다. 언러닝이란 탈배움이다. 내가 이미 배워서 내 몸에 이미 배어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관점을 경험하는 것이다.
물, 여성, 제주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그 시작점을 가지고 토크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영화 상영 같은 것도 해보고 이제 어린이들이랑 하는 워크숍들 그리고 이제 제주에 이주한 다른 활동가들이랑도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다. 동네에 사는 삼촌들도 초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내가 살던 집에 살았던 해녀들의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바닷 속의 이야기들을 이듣기 시작한다.
요이씨가 담게 된 이야기들은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다. 오직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스토리다. 이런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내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공간도 마련했다.
하이드로(hydro) 페미니즘 개념을 공부하는 사업이나 세미나 같은 걸 진행해왔고 이걸 기반으로 전시도 했다.
하이드로 페미니즘은 인간을 개별적 존재가 아닌, 물과 함께 지구의 다른 생명체와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이씨는 그런 관점에 입각해 해녀들이 쓰는 창고를 활용했고 전시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여름에 창고가 쓰이지 않는 시기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열었는데 ‘라디오 레지던시’도 했다.

요이씨의 제주 라이프에서 터닝포인트는 ‘해녀 학교’였다. 바다를 밖에서만 보다가 속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은 천지 차이다. 요이씨는 바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바다와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기 시작하는 과정”을 겪었다고 말했다. 도시의 사이클은 9 to 6인데 섬에서의 삶은 물때에 맞춰져 있다.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때를 아는 것은 필수다.
같이 실습도 하고 해녀들이 다 알려주는 것들이 다르다. 잠수법이나 호흡법이나 바다 지리를 알고 있는 것들이 기록된 적이 없어서 모든 해녀들이 다른 버전을 알려준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혼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칭찬받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 안에서 감동받는 순간들도 있고 상처받는 순간들도 있다.
요이씨는 스스로 “아무리 제주도에서 오래 살아도 이주민이고 이방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원주민과 이주민의 경계를 오가는 것이 요이씨의 위치다.
내가 경험하는 나와 바다와의 관계 그리고 또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있는 그 해녀들이 갖는 바다와의 관계. 이제 예술가로서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고 또 더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작업을 이어가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