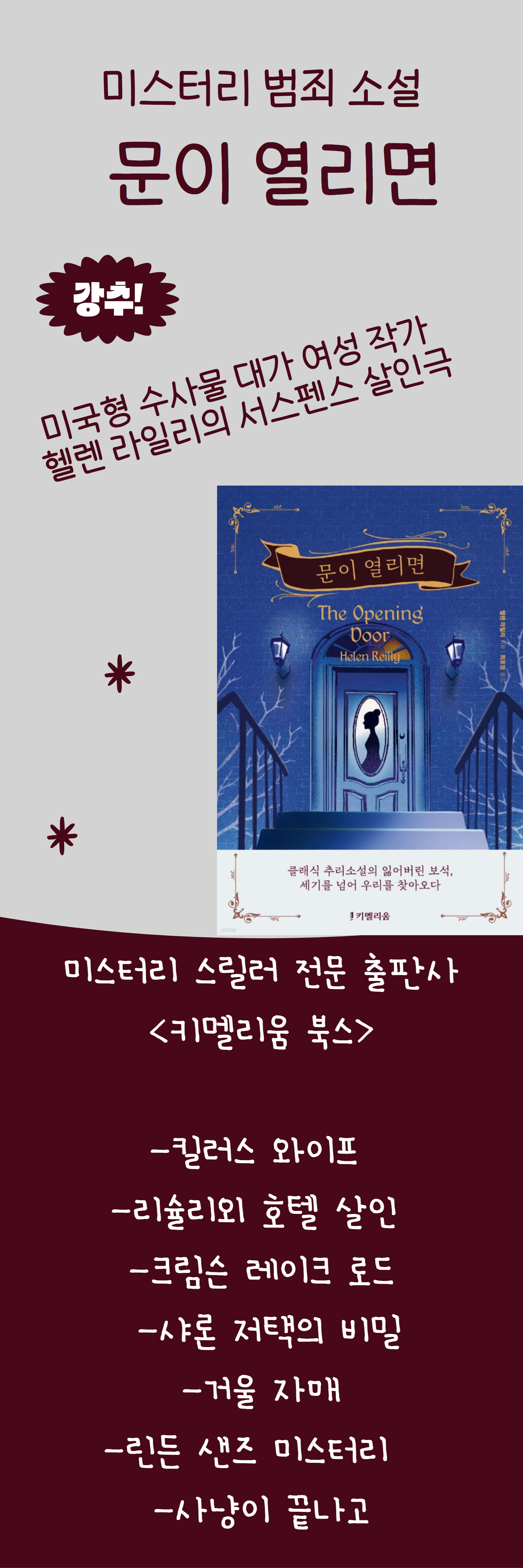[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칼 막스의 시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두 그룹으로 나뉘었던 계급이 현대로 들어와 세분화됐다. 일부 기업의 '노사 편가르기'는 치밀해져가고 노동조합의 목소리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노동자가 악덕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투쟁과 단결도 있지만 '법'이 중요하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마저도 배반당하기 일쑤다.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더욱 야박하다.
올초 사업주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사실상 맹점 투성이다. 당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명명됐었지만 기업이 빠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의 범위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중재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그저 사업체와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기대 뿐이다. 그래서 중재법 체제 이후에도 산재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건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최근 일류대학이라는 서울대에서도 청소 노동자가 사망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예방TF팀을 구성하고 현장을 방문해 내년부터 적용될 중재법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그것만으로 중대 재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재법 시행령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중재법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은 이를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과 예산' 등으로 좁게 규정했다. 사실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 범위를 좁혔다고 봐야 한다. 특히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에 2인1조 작업 편성이 포함돼야 하는데 시행령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중재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중대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진다.
노동계는 수많은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인력 부족으로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에 노동자가 내몰리면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지난 4월 발생한 평택항 故 이선호 노동자의 비극만 보더라도 신호수와 작업 감독자 등이 서류상으론 배치됐으나 실제로는 부재했다.
민주노총은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의 참사는 2인1조 작업이 매뉴얼에 있었음에도 인력이 부족해 2인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는 노동자 사망 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시행령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