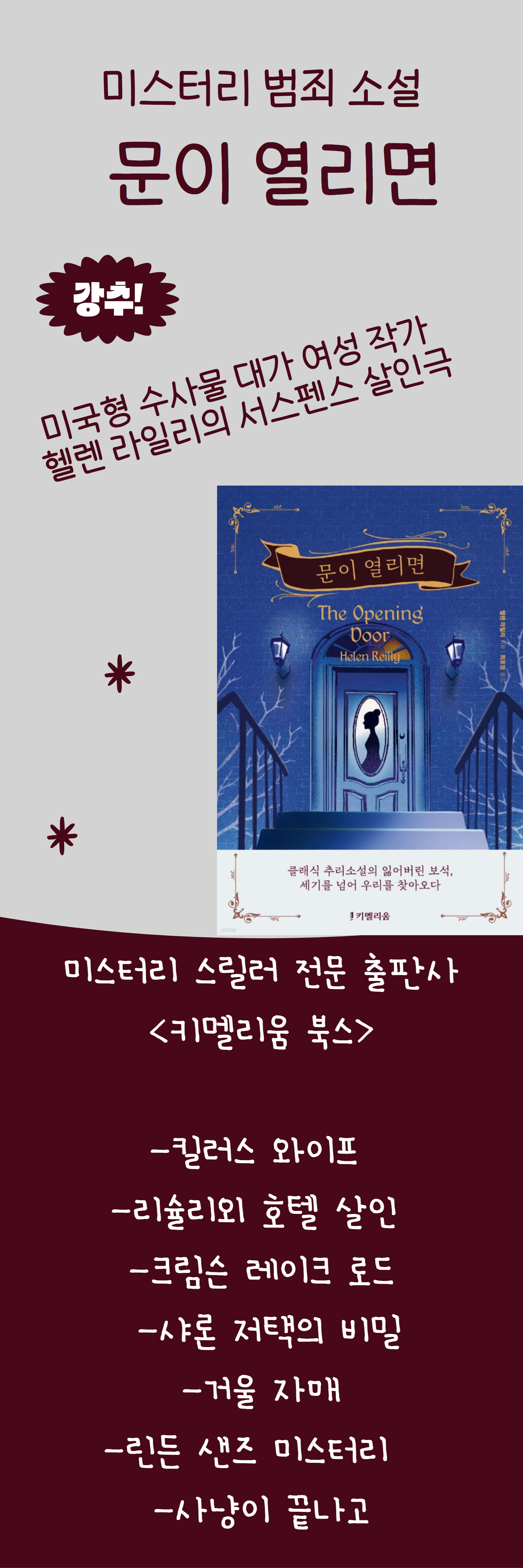[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플라스틱제품 제조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씨가 압축기에 끼어 숨졌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18시간 넘게 밤샘 근무를 하고 있던 도중이었다.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새벽 3시30분경 유압 압축기 명판 교체작업을 하다 장비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압축기의 형틀을 교체하기 위해 상체를 숙여 60㎝ 정사각형 모양의 압축기에 머리를 넣었다가 변을 당했다. 갑자기 압축기가 작동했다.
A씨는 입사한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은 신입이었고 사고 당시 내국인 근로자 및 관리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그들은 이미 한참 전에 퇴근한 상태였다.

'정 많은 한국인'이라던데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 앞에서 한 없이 극악해지는 것 같다. 지난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외국인 노동자에겐 머나먼 일이다. 이들에게 '워라밸'이란 가당치도 않은 소리다. 추가 근무를 해도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 하고 작업 중 다친다 해도 산업재해 처리를 해주는 사업장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추가 근무'를 택한다. 충남 천안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공장에 근무하는 네팔 출신 20대 라지브씨는 얼마 전 일터를 옮겼다. 이전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실시해 더 이상 수입이 예전만 못 해서다.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것이 임금은 그대로여야 의미있는데 같이 줄어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는 "잔업을 하면 돈이 더 나오는데 사장님이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 왔어요"라고 이직 사유를 설명했다.
라지브씨와 함께 일하던 친구들 역시 타 사업장으로 직장을 옮겼다고 한다. 그들에게 절실한 건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다.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는 만큼 그들의 현실은 더욱 척박해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주 52시간 노동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인력 부족을 부채질하는 꼴이 됐다. 과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일까 '벌이'일까. 둘 다 보장될 수는 없는 걸까. 사업주들 역시 불만의 목소리를 키운다. 기존에 비해 업무량이 극히 줄어들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나고 그만큼의 인력 및 노동시간 공백으로 인해 납기일을 맞출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에서 전기부품 사업장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일을 더 못 시키니까 얘네들(외국인 노동자)도 월급이 줄어 회사를 떠나고 또 약속된 납기일을 마쳐야 하는데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매일 애가 탄다"며 "계도 기간조차 없이(계도 기간이 존재하긴 했지만 실질적이지 않았다는 의미) 무턱대고 제도를 시행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제도를 지켜도 문제, 지키지 않아도 문제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과연 어떤 게 맞는 걸까. 주 52시간제는 노동 현장의 실태를 그대로 바라보게 했다. 특히나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온 자들이 왜 한국 땅을 밟았는지 그 목적을 말이다. 아마도 고인이 된 A씨의 상황 역시 이렇지 않았을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절실한 것과 절실하지 않은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0시간 논란을 빚어냈지만 사실 52시간제는 정확하지 않은 말이다.
주 40시간이 맞다. 거기에 12시간을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용해준 것이다. 52시간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참고해서 여야가 합의한 노동시간 최대치다. 즉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하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40시간제가 아니라 35시간제다. 이것도 많다고 줄이자는 여론이 높다. 그러나 한국처럼 복지체계가 허술한 곳에서 소득과 노동시간을 같이 줄여버리는 현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하다. 52시간제를 원망하게 만든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