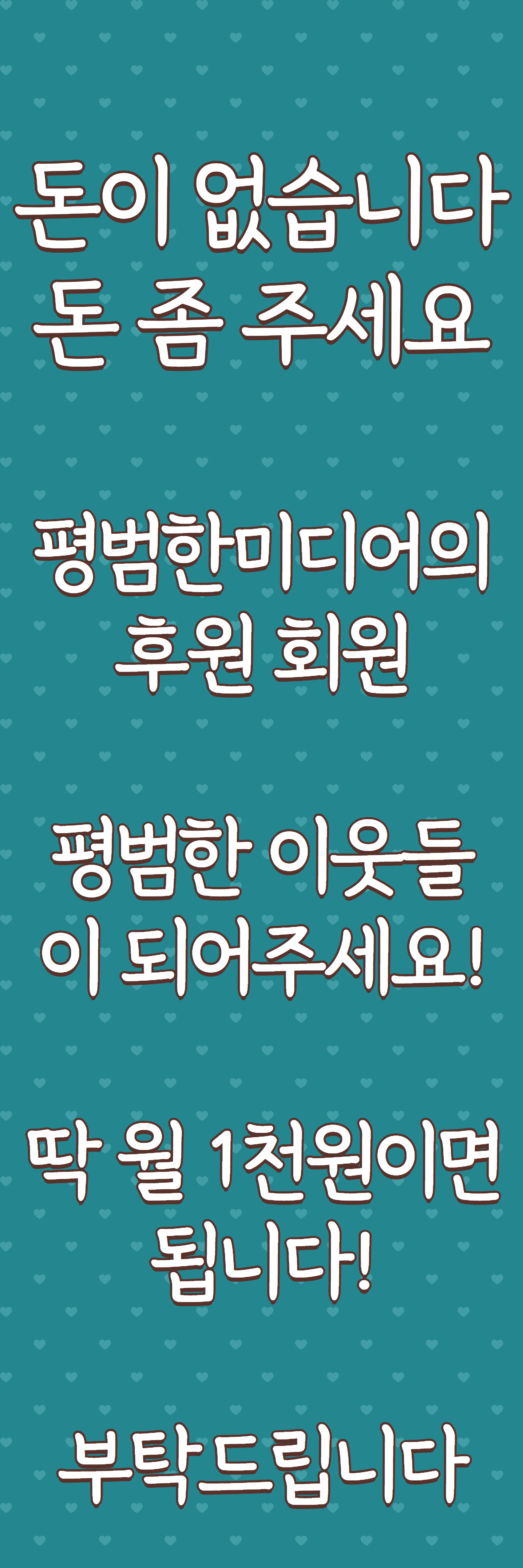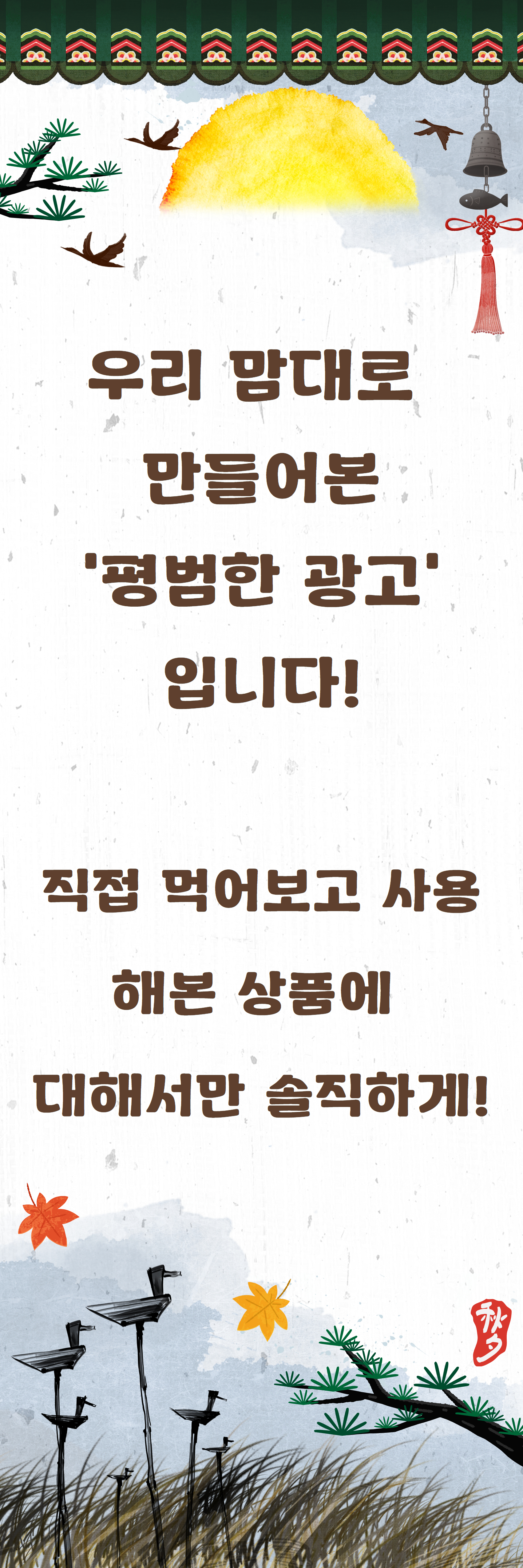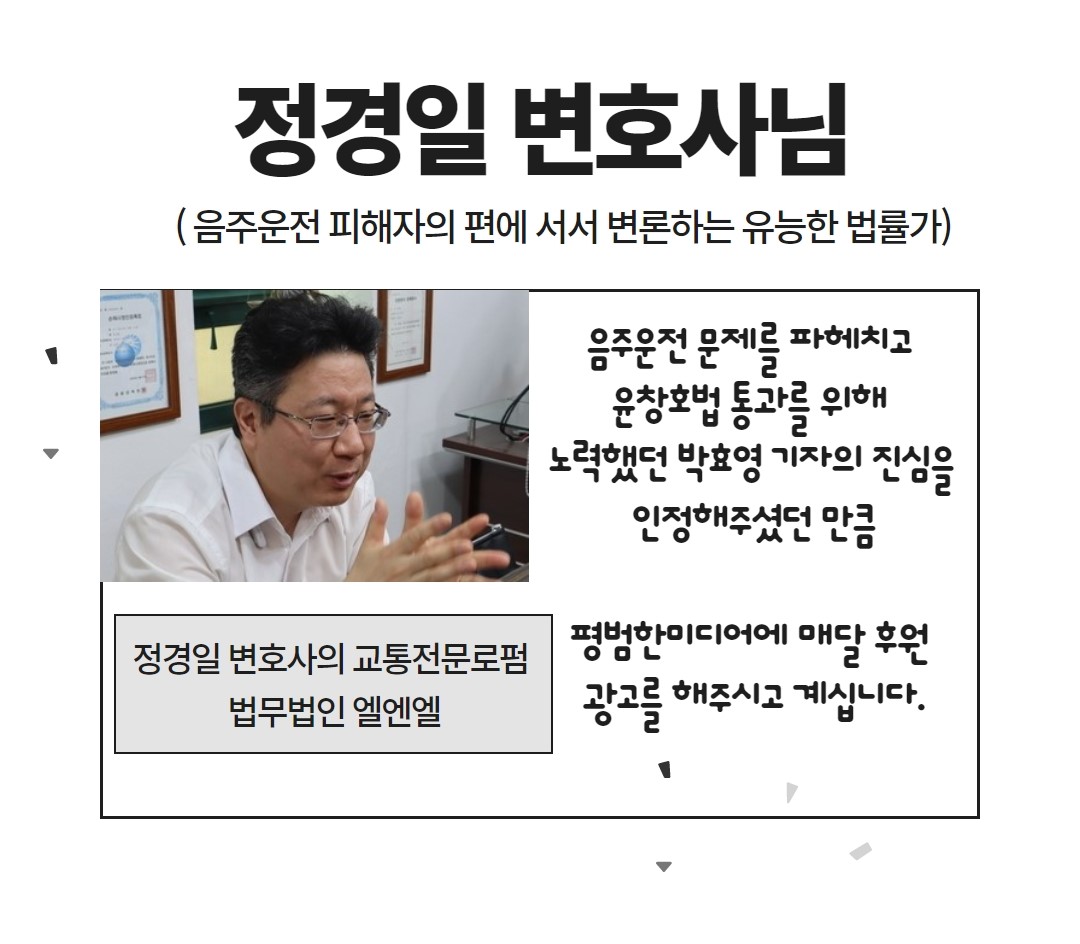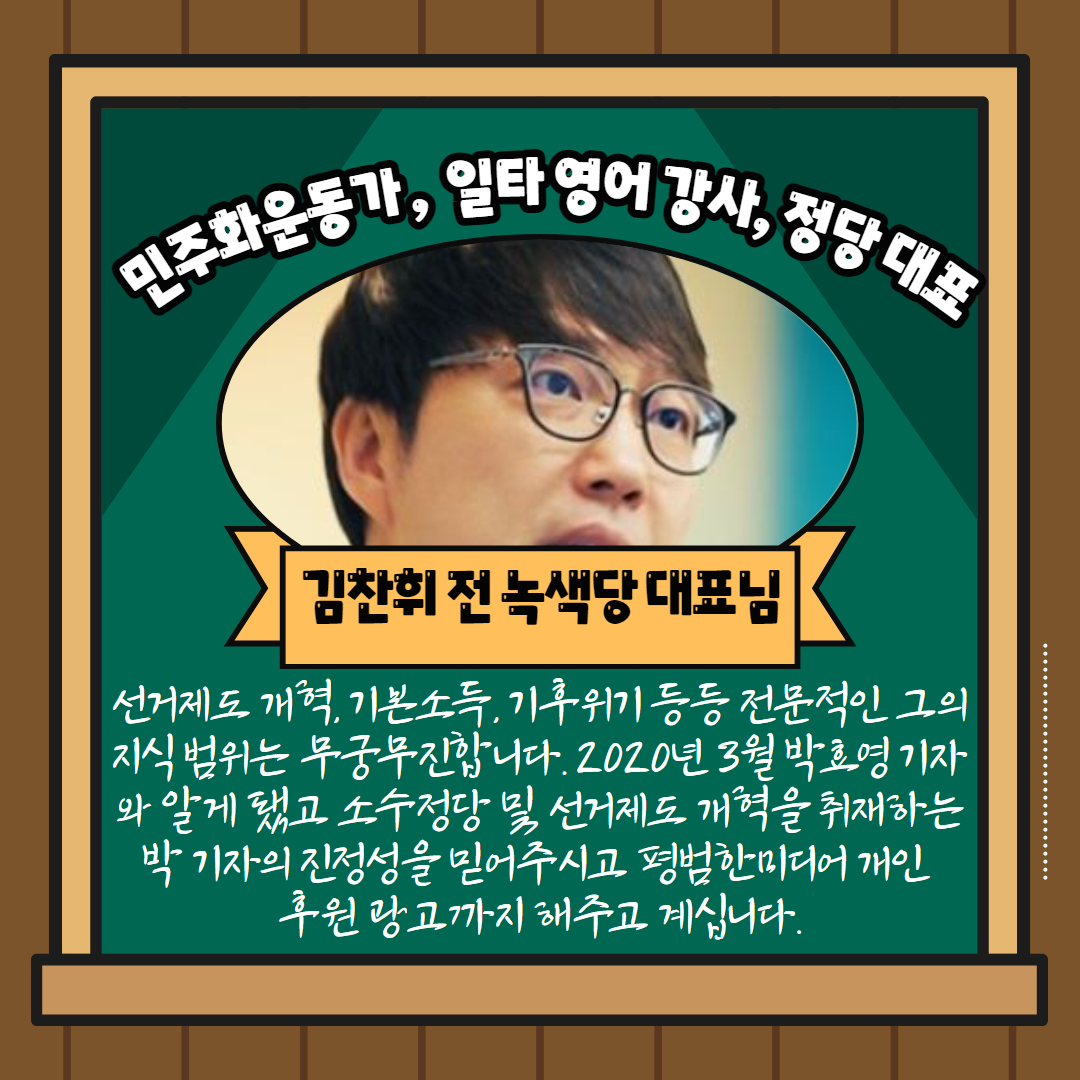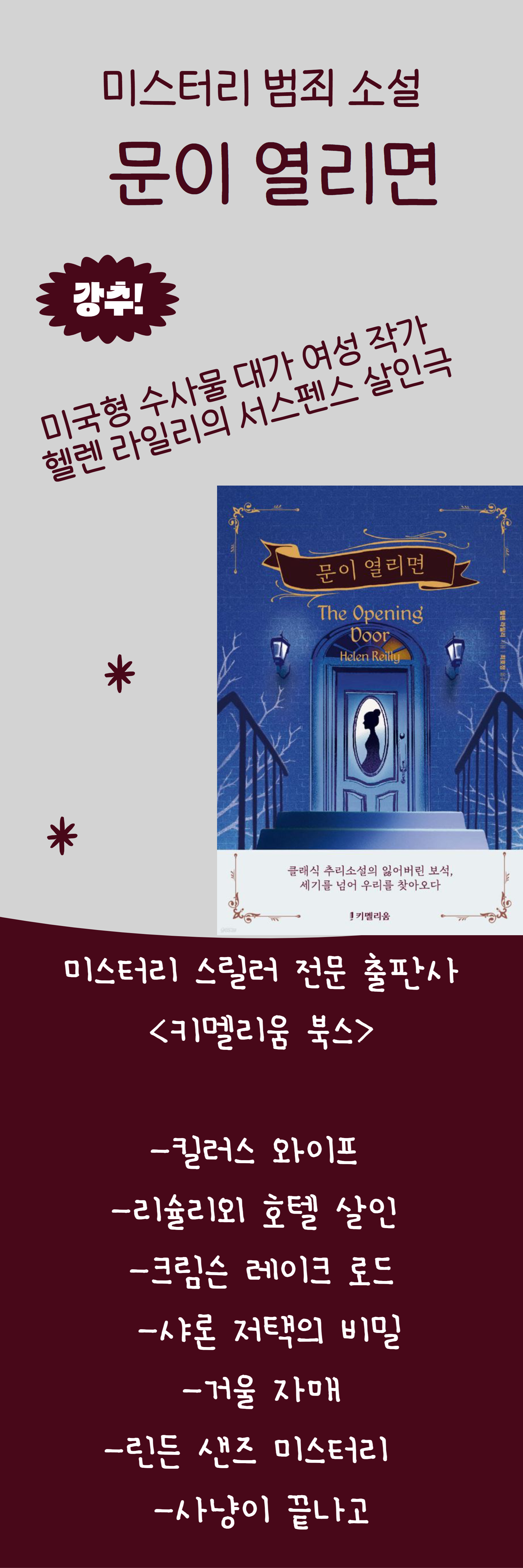#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11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1+1=? 그날도 도서관에 앉아 노트북으로 글을 쓰고 있었다. 벅벅 옆에 앉은 사람이 몸을 긁기 시작했다. 고개는 돌리지 않은 채 최대한 눈을 왼쪽으로 모아 옆자리를 확인하니 한 남성이 손으로 배를 세게 긁고 있었다. 벅벅! 벅벅! 노트북으로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었다. 모니터를 보고, 뭔가 키보드로 입력하고, 한숨을 쉬고, 배를 긁었다. “더러워...” 나도 모르게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자리를 옮길까? 그런데 내게 다시 물어보았다. 저 사람의 행동이 정말 이상한 거냐고? 이상하다는 내 판단이 정말 맞냐고? 피해야 할 만큼 저 사람이 위생적으로 더럽냐고?

왜냐면 나도 몇 분 전 간지러워서 머리를 긁었다. 그 손으로 방금 전 코를 긁었고 그 손으로 다시 키보드를 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이상하고 위생적으로 더럽다며 피했을지도. 또 도서관에서 배를 긁으면 안 된다는 법도 오스트리아엔 없었다. 저 사람은 배를 벅벅 긁었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불쾌감, 이상함, 더러움은 모두 내가 그 사실에 붙인 라벨이었다. 신기한 건 배를 긁는 소리가 불쾌하게 느껴지자 냄새도 나기 시작했다. 분명 배를 긁는 소리를 듣기 전까진 맡지 못 했다. 그런데 소리가 싫어진 다음부터 냄새가 났다. 그리 심하지 않은 그냥 사람 체취였다. 그 사람의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은 마음이 내 후각도 더 민감하게 만든 건 아닐까?
그런데 그날 내가 뿌린 향수 냄새도 만만치 않았다. 누군가는 내 향수 냄새에 불편함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서관에 향수를 뿌리고 가면 안 된다는 법도 없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냄새도 그리 나쁜 게 아니었다. 배를 긁는 남자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모두 사라졌다.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 글을 썼다. 머릿 속으로 그의 얼굴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흑인이거나 동남아시아 계열의 남성일 것 같았다. 배를 벅벅 소리나게 긁는 건 뭔가 백인에겐 어울리지 않았다. 이번에도 내 판단이 틀린 것인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글을 다 쓰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돌려 마침내 그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는 전형적인 백인 남성이었다. 내 뿌리 깊은 편견이 만든 ‘허상’을 확인한 순간.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이 그랬다.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면 ‘그럴거야’라는 짐작들은 무수히도 많이 틀렸다. 그렇게 혼자 머릿 속으로 그린 부정적인 결론들이 걱정 만큼 비극이 아니었기에 지금 나는 멀쩡히 살아 일상을 나누는 글도 쓰고 있으니까.
얼마 전 유튜브에서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엘렌 랭거’의 인터뷰를 보았다. 그녀는 1+1이 얼마냐고 진행자에게 묻는다. 진행자는 당연히 2라고 답했다. 그런데 그녀는 정말 2만 답이냐고 되묻는다. 껌 1개와 껌 1개를 합하면 껌 1개고, 구름 1개와 구름 1개를 합하면 구름 1개, 2진법에서 답은 10이 된다. 이처럼 상황과 관점에 따라 답은 항상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답이 하나라고 가정한 채 오답인 나머지에 부정적인 라벨을 붙인다. 그 하나의 답이 되기 위해 자신도 평생을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구겨 넣은 채.
도서관에서 배를 긁는 남자에게 아무 것도 없는 백지의 라벨을 붙이고 그의 행동을 이해해 보았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내 안의 뿌리 깊은 편견을 깨닫는 배움의 순간이 왔고 긍정적인 경험이 되었다. 일상에서 겪는 모든 것에 어떤 라벨을 붙이느냐는 나 자신의 몫이다. 그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안고, 앞으로 걸어나가며 삶이 그려지겠지. 그러니 나는 이왕이면 많은 것들에 긍정을 붙이고 재밌게 살다 가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