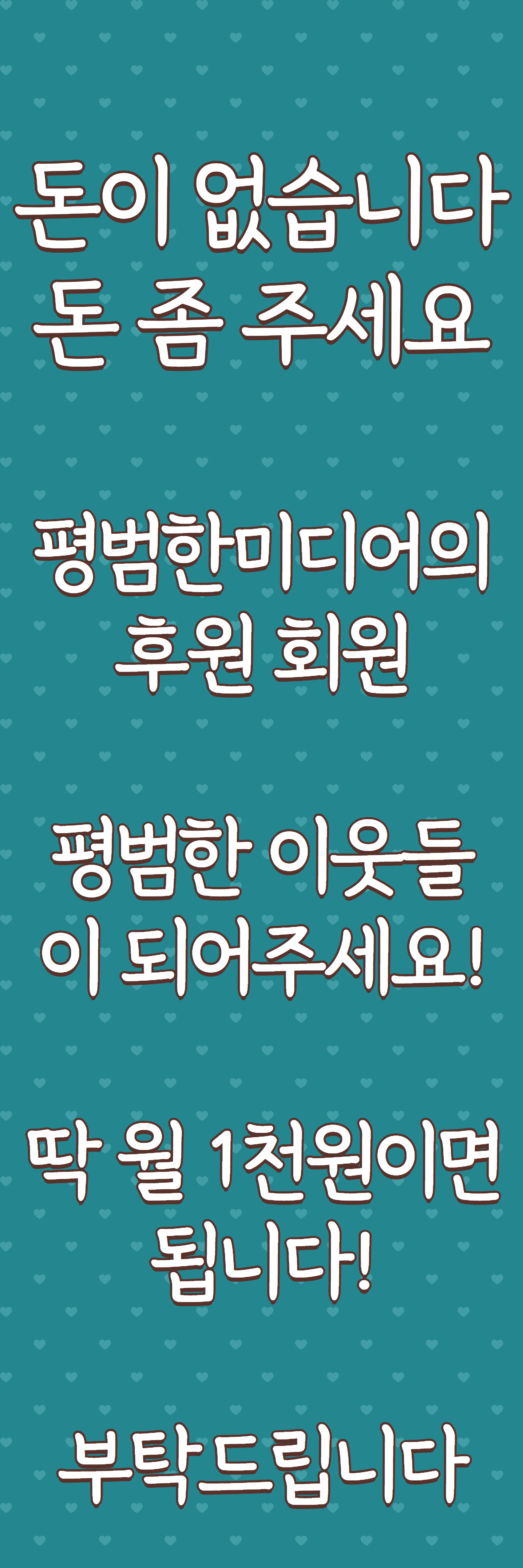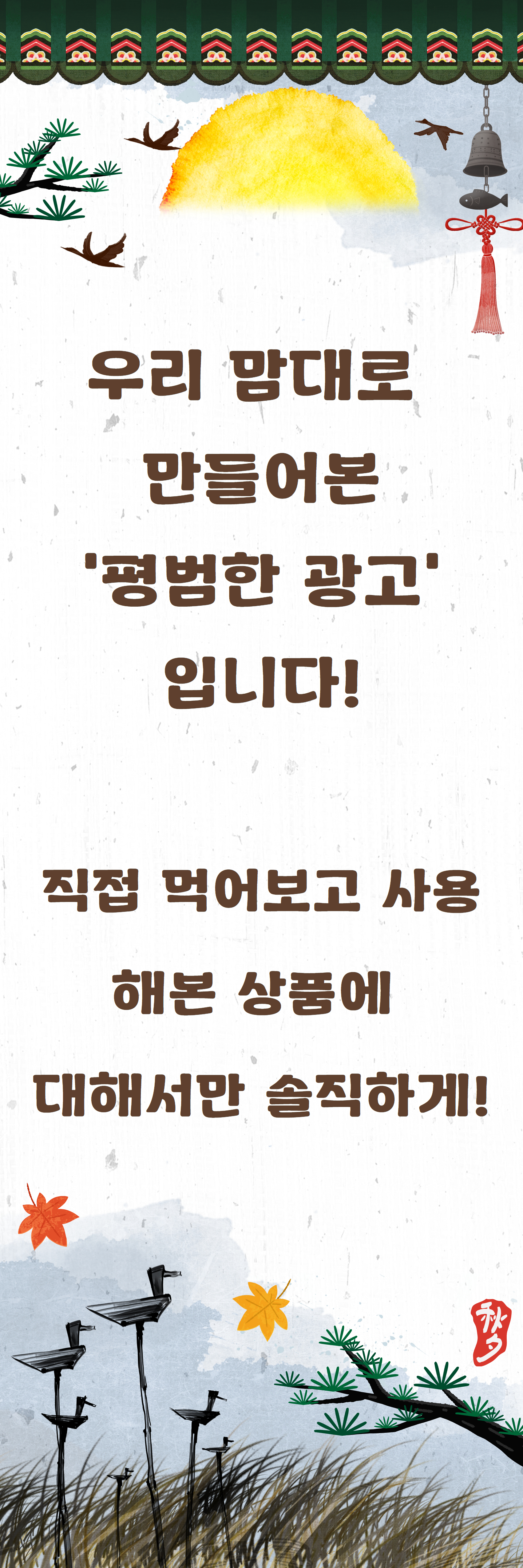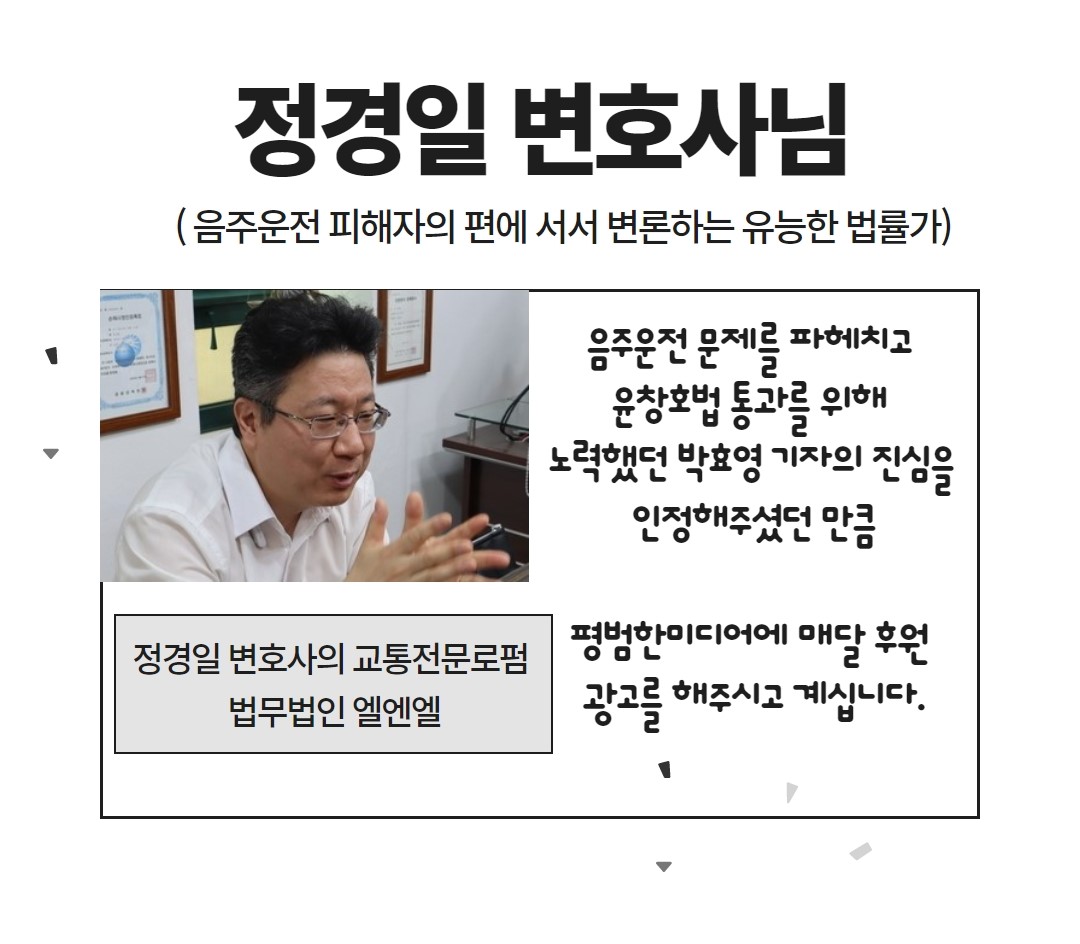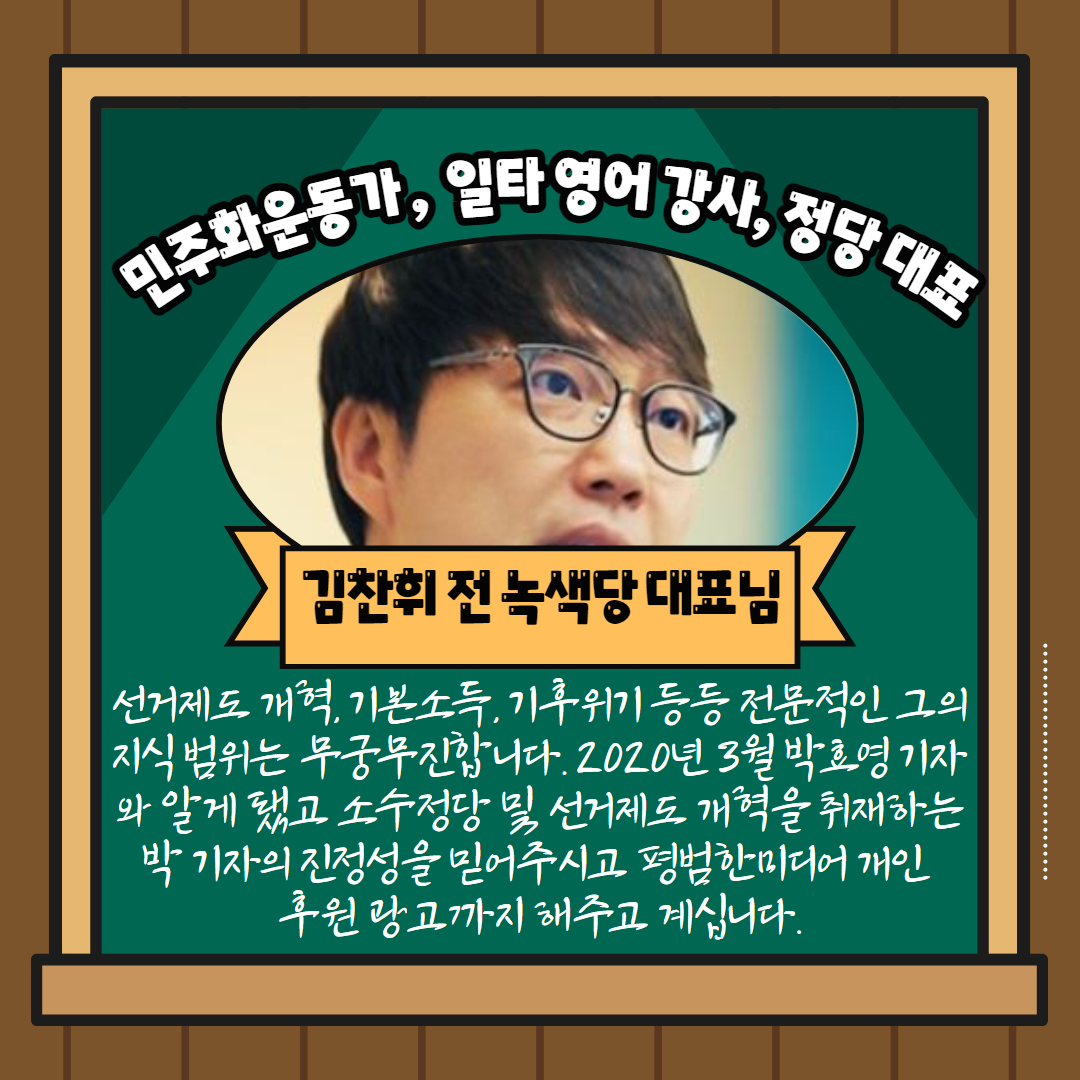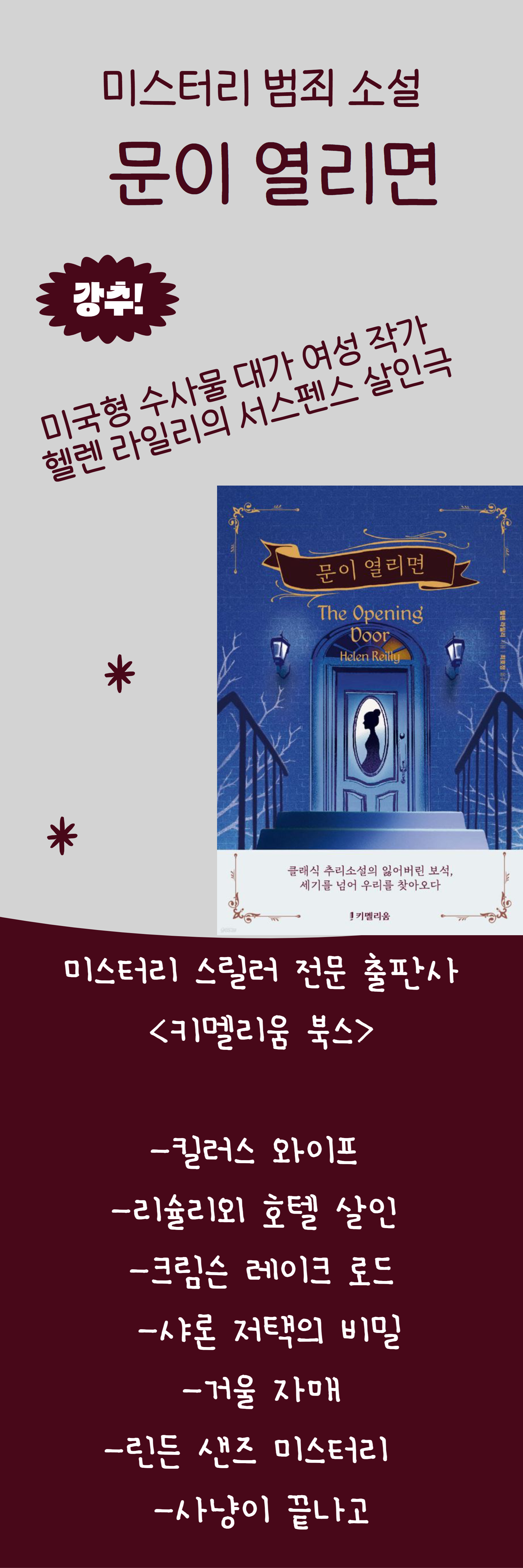[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나와 가장 오래된 친구는 장애를 앓고 있다. 친구의 어머님은 특수학교 진학을 바랐지만 친구가 어떻게든 일반 학교로 가고 싶다고 우겼다고 한다.
곧 다가올 지방선거 때문인지 요즘 들어 지역을 막론하고 특수학교 확대를 주장하는 교육감 후보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증설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는 듯 싶지만 정작 이야기를 들어본 장애 아동 부모들은 오히려 특수학교 진학을 꺼려하는 모양새였다. 왜 그럴까?
갈수록 학령 인구는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특수교육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난 2011년 8만2665명에서 지난해 9만8154명으로 18.7% 증가했다. 행안부와 교육부가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데이터화해서 올해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예측한 결과 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1483명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이 일반 학교에서 따돌림, 차별 등의 고통을 겪고 학습 부진으로 인한 자존감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특수학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경기도 모 중학교에 재직 중인 A 교사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일반 학교의 경우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일반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더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며 "교육을 따라올 수 있느냐 아니냐 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위축시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더 우려될 때가 많다. 특수학교 확대가 어쩌면 이 아이들에게 더욱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7명 중 5명은 평범한미디어에 특수학교 증설만이 답은 아니라고 답했다.
특수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B씨는 "장애가 심한 학생들은 특수학교로 보내는 것이 맞지만 장애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것이 장애 학생의 사회화와 사회 진출을 돕는 것"이라며 "일반 사람들하고 어울릴 기회도 많아야 하는데 일찍부터 분리하면 그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꼴이며 특수학교 확대만이 답이 아니라 몰려 있는 것이 되레 학생들 간의 이질감을 가중시켜 차별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탈시설의 논리와 유사하다. 장애인이 특정 공간에서 고립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특수학교에 자녀를 보냈던 C씨는 "처음에는 특수학교를 보내는 게 맞다는 생각에 보냈는데 우리가 특수학교로 갈 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장애인 인권 교육이 이뤄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며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의 의식을 바로 세워야 편견과 차별이 없어지지, 우리가 특수학교에만 기댄다면 나중에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비장애인의 삶을 체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끼리 모여 있다가 나중에 비장애인들이 상당수인 세상에 나가면 우리 아이가 너무 혼란스럽고 힘겨울 것 같다. 특수학교 증설보다도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를 위한 인권교육 확대가 더 시급하다.

물론 특수학교가 꼭 불필요하단 의미는 아니다.
영화 <학교 가는 길>을 본 사람이라면 특수교육의 확대와 발전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기관의 확대만이 답이 아니라 교육할 수 있는 범위와 질을 더욱 높이는 게 중요하다. 특수학교 교육방향, 체계, 인력 등 풀어야 할 문제는 많다. 피상적인 주장들로만 부딪힐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갑론을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