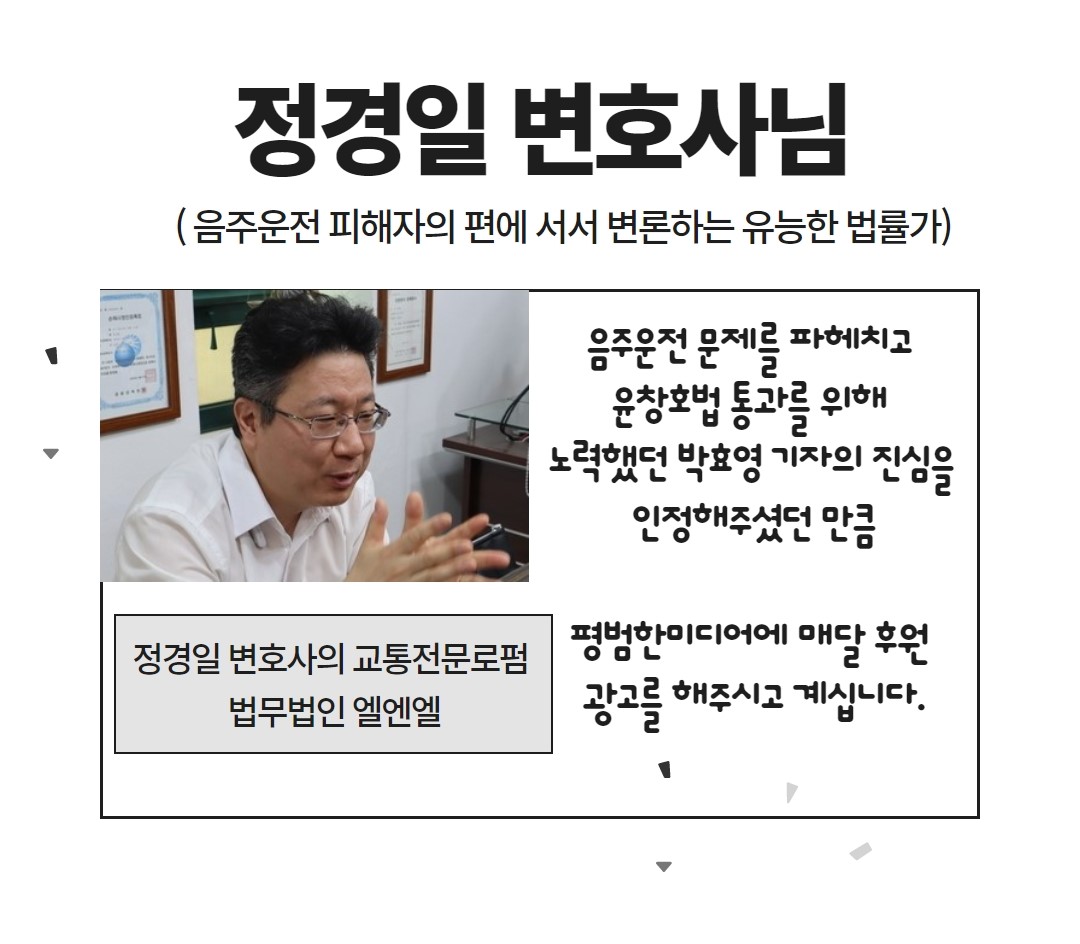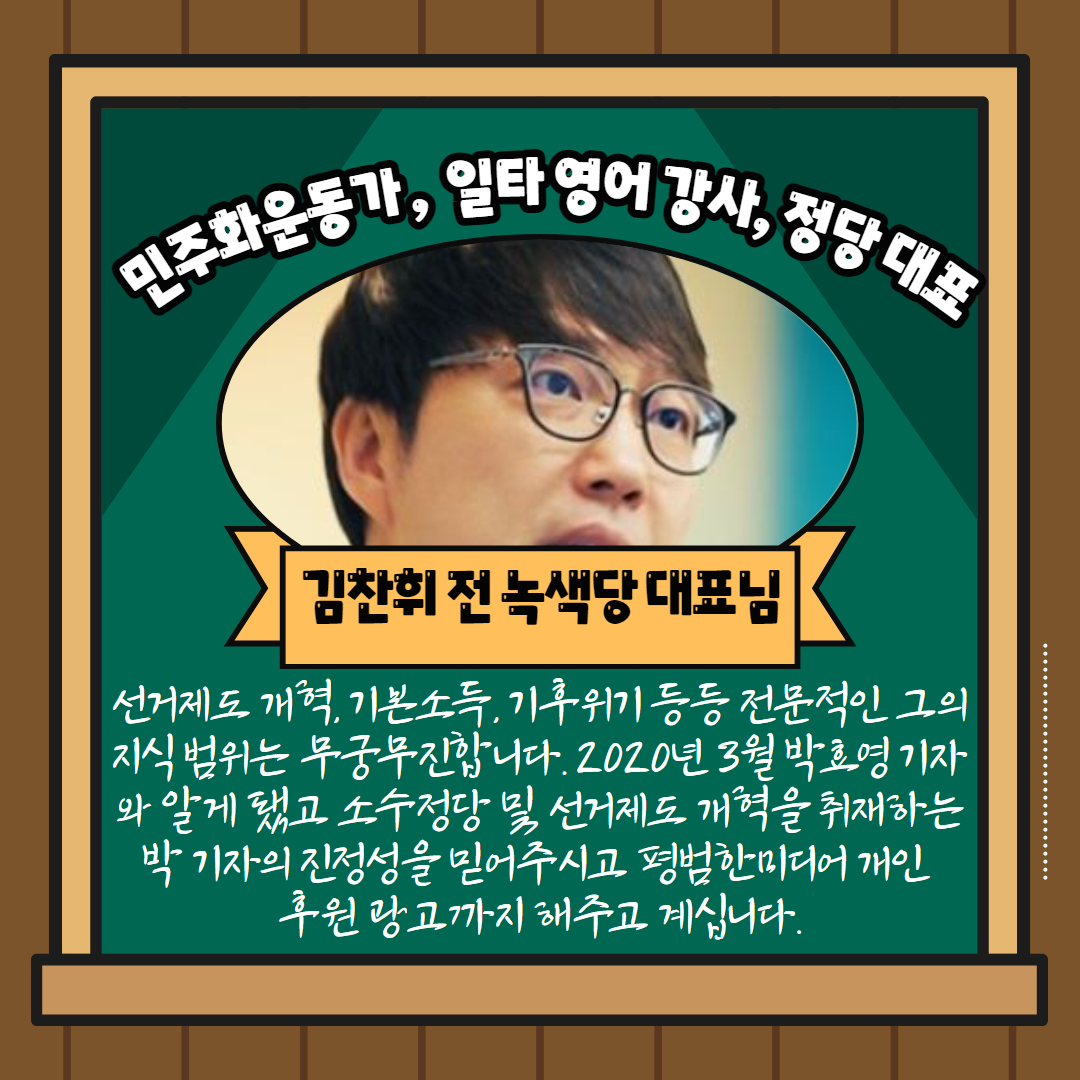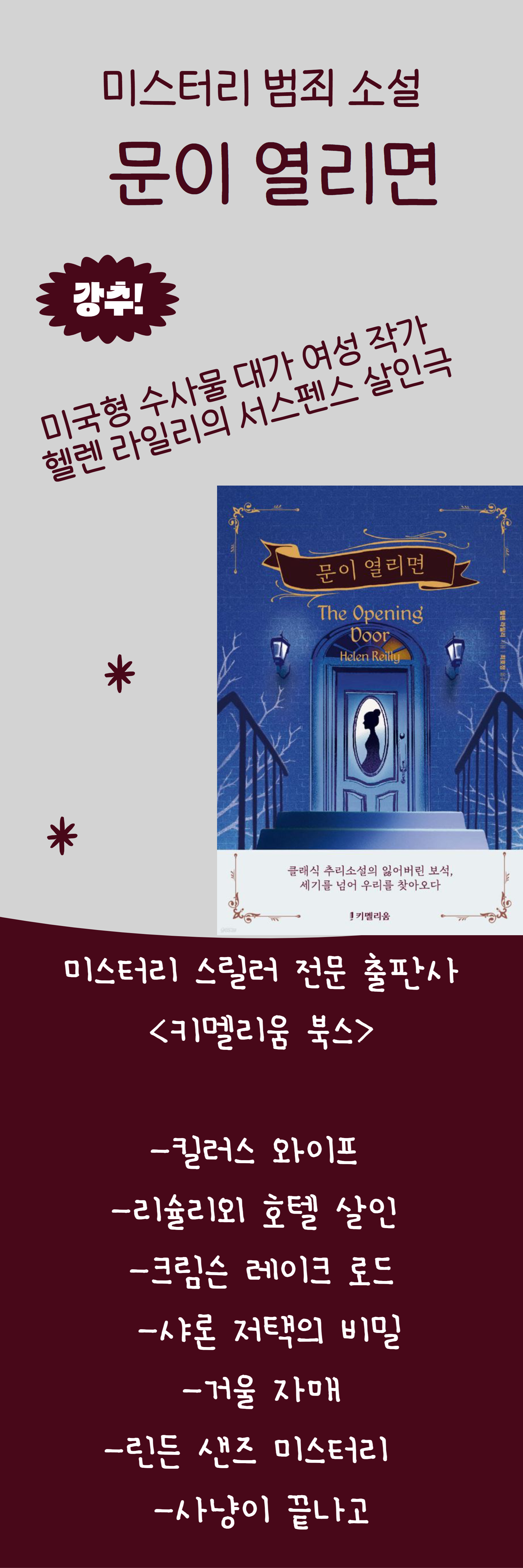#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8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안장에 앉는 순간, 자전거는 여성을 자립과 독립 그리고 속박되지 않은 세계로 이끌어준다.” 미국의 사회운동가 수전 앤서니가 한 말이다. 자전거를 타지 않은지는 오래되었다. 성인이 된 후엔 한강에서 따릉이를 두어 번 타본 게 전부다. 그런데 비엔나는 자전거를 타기 참 좋은 도시다. 골목길도 자전거 도로가 분명히 나눠져 있고, 큰 도로엔 자전거 신호등도 있다. 언덕이 많은 한국과 달리 여기는 대부분 평지라 어디든 자전거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친구는 이 좋은 걸 왜 타지 않느냐며 그날도 자전거를 타보자고 졸랐다.
아니 어릴 때 자전거 배웠다면서?

하지만 어린 시절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사고가 나서 무릎이 깨지면 어쩌지? 남을 들이받으면 어떡하지?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헝클어질 앞머리와 헤어스타일은? 좋아하는 짧은 치마나 꽉 끼는 바지를 자주 입는데 자전거를 타면 못 입을텐데? 무엇보다 나는 뭔가 자전거와 어울리지 않다고 여겼다. 말끝을 흐리며 수줍게 웃는 얌전한 모습이 더 나답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자전거는 나에겐 가장 적극적인 도전이었다.
자전거는 못 타는데...
그래 그냥 한 번 타보자. 더운 날씨에 헤어핀으로 이미 머리카락을 고정한 상태라 바람에 망가질 머리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다. 길가에 세워진 공유 자전거에 다가가 QR코드를 찍고 대여를 완료했다. 서울의 따릉이보다 훨씬 더 큰 자전거였다. 안장 높이를 최대로 낮춰도 자전거를 옆으로 많이 기울여야 겨우 발이 땅에 닿았다. 페달을 굴리자 자전거는 곧 넘어질 것처럼 흔들렸고, 생각보다 빠른 속도에 섰다 멈췄다를 반복했다.
한 번만 더 타보자. 다시 자전거에 올랐다. 그리고 몇분 후 나는 자전거와 하나가 된 채 비엔나를 달리고 있었다. 몸은 자전거를 기억하고 있었다. 핸들을 꼭 쥐고 있던 양손의 긴장이 점점 풀렸다. 모든 게 조금씩 쉬워졌다. 페달을 계속 밟지 않아도 미끄러지듯 달리는 자전거에 몸을 맡긴 채 고개를 돌리며 풍경을 즐겼다. 늦은 새벽 주황색 가로등 불빛에 고풍스러운 비엔나의 건물들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불어오는 바람에 가슴을 누르던 감정덩어리들도 날아가 버렸다. 앞머리는 양 옆으로 갈라졌지만 오랜만에 맨 이마로 맞는 바람도 나쁘지 않았다. 더욱더 빠르게 달리고 싶었다.
어릴 땐 동네 친구들과 집 앞 공터에서 매일 자전거 경주를 했다. 그때는 머리가 헝클어지는 것도, 내 이미지에 자전거가 어울리든 말든 상관이 없었다. 오직 1등하는 것만 생각했다. 언덕을 단숨에 내려가서 회전 구간을 빠르게 돌아갈 생각 밖에 없었다. 다치는 것도 별로 두렵지 않았다. 그때 같이 1등을 겨루던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나처럼 ‘속도를 즐기며 즐거워하는 여성’을 거의 보지 못 한 채 자라서 “자전거는 못 타요”라며 수줍게 웃는 평범한 어른으로 살고 있을까.
그날 밤 꿈에서 나는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여러 장애물들을 피하며 악당을 피해 어딘가로 빠르게 도망쳤다. 일촉즉발의 상황인데도 무섭지 않고 짜릿했다. 오랫동안 나를 규정하던 틀을 벗어나 자전거로 조금이라도 해방된 게 아닐까? 이제는 언제든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비엔나 이곳저곳을 탐험한다. 자전거 뒤에 커다란 카트를 연결해 아이들을 태우고 자유롭게 도시를 누비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