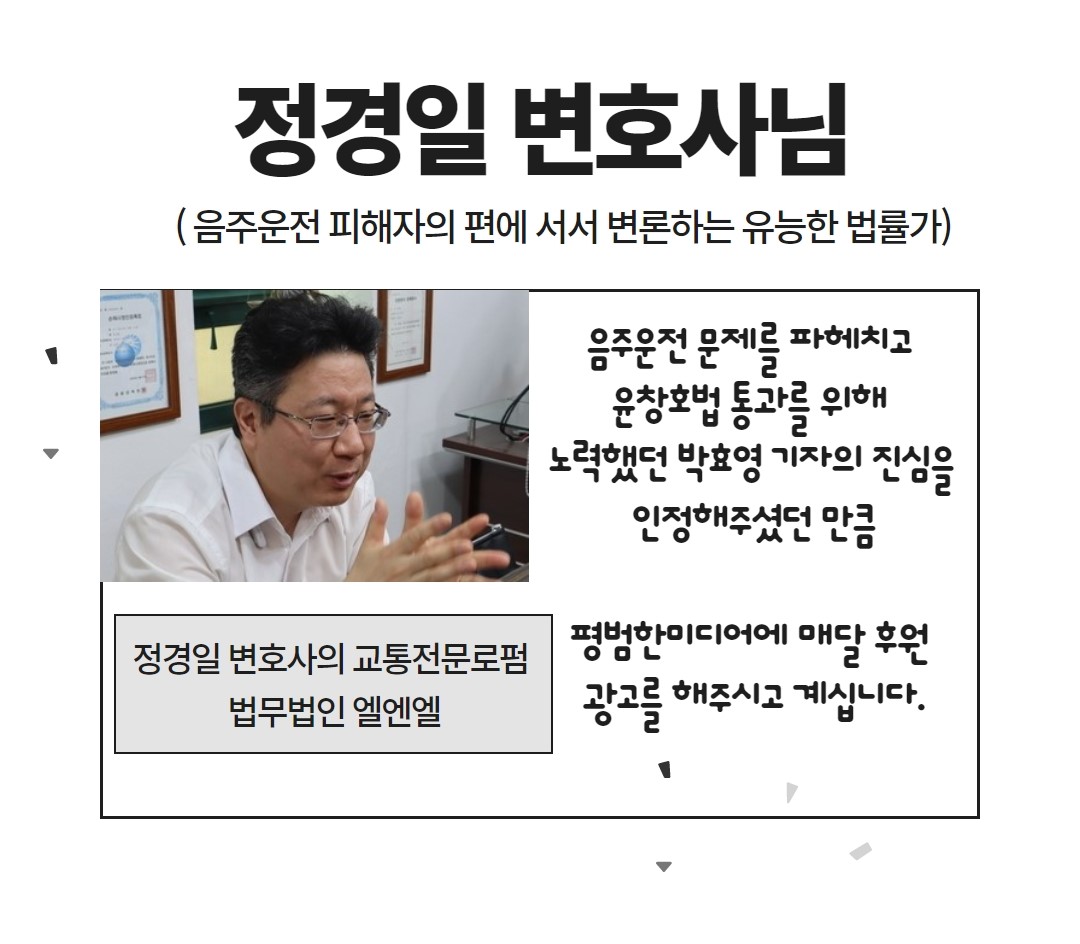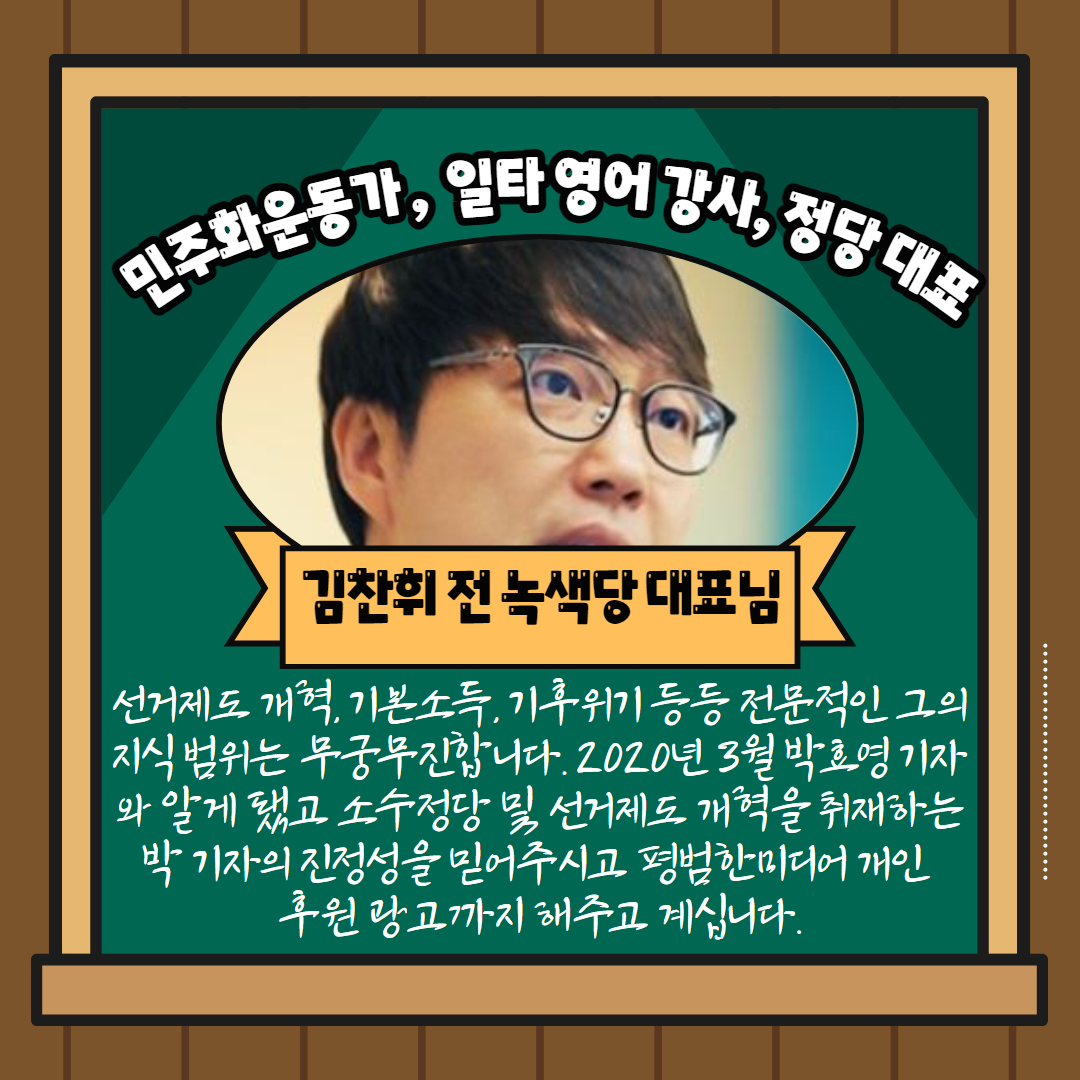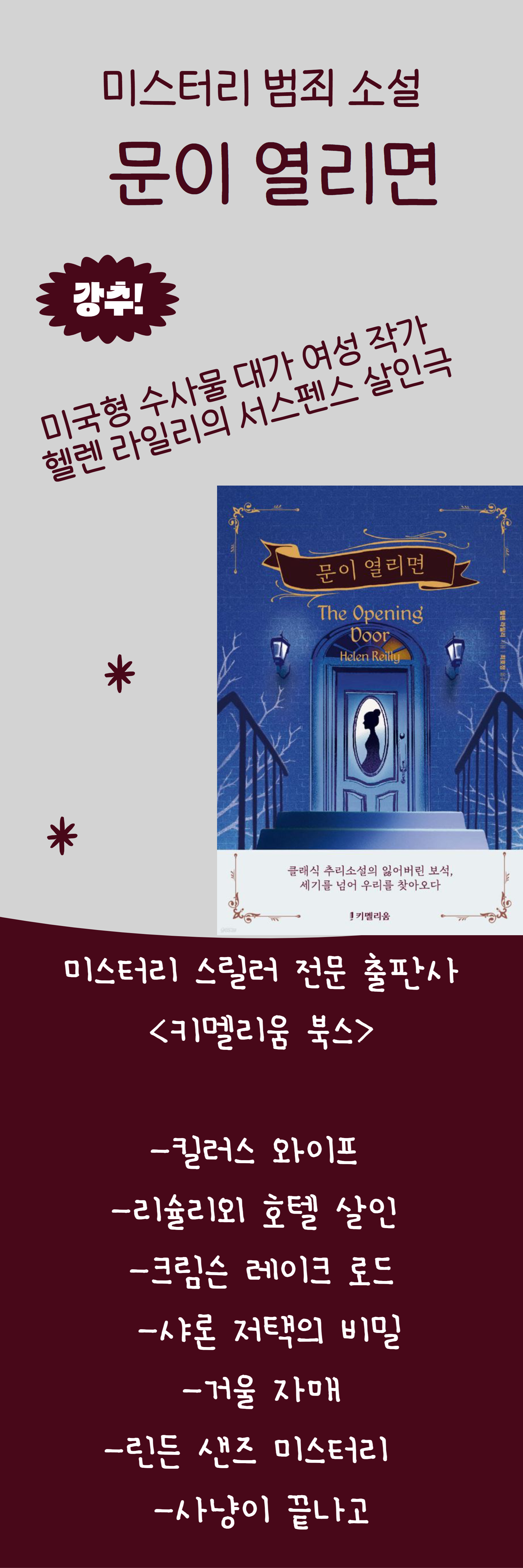#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14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20대에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서러웠다. 혼자 있는 나는 뭔가 부족한 반쪽짜리였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현재’를 나만 생각하며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다. 과거의 누군가를 원망하느라 ‘과거’에 살았고, 만나지도 않은 다음 상대를 기다리며 불확실한 ‘미래’에 살았다, 그렇게 즐기고 누리지 못 한 현재가 쌓여 돌이킬 수 없게 되면 또다시 후회하며 나를 미워했다. 그래서 내가 밉지 않다고 말해줄 타인이 다시 필요했다. 아주 지독한 악순환이었다.
언제부터 왜 반쪽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걸까?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 걸까? 너무 이른 나이에 독립해서? 아니면 호르몬 불균형? 원인의 실마리를 풀어보려 노력해도 답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지금은 혼자가 좋다. 올해 10월은 대단하진 않지만 내게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될 점심시간을 여러 번 보내는 기간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점심으로 먹을 렌틸콩, 병아리콩에 약간의 당근, 양파, 완두콩 등을 곁들인 수프를 만든다. 디저트로 먹을 올리브빛 서양 배와 사랑스러운 납작 복숭아도 베이킹 페이퍼에 감싸고, 매주 길 건너편 빵집에서 사는 사워도우 빵 한 조각도 잊지 않는다.

그리고 Stadtpark(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공원)로 간다. 이슬이 내려 앉아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초록 잔디 위에, 특히 햇살이 잘 드는 곳에 돗자리를 편다. 그러고는 아직 온기가 가시지 않은 점심을 한 입씩 먹기 시작한다. 온 몸 구석구석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느낌. 이곳에선 그리 외롭지도 않다. 잔디 위엔 일정 간격을 두고 떨어져 앉아 나처럼 고독을 즐기는 비엔니즈들로 가득하니까. 그들은 배낭에 머리를 베고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샌드위치를 먹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냥 낮잠을 잔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지만 서로의 고독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 고독한 집단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내게 위안을 준다. 강렬하진 않지만 이 기쁨은 안정적이다. 이 행복을 위해선 누구를 이용할 필요도 나를 희생할 필요도 없다. 오로지 내가 만든 나만의 행복. 하지만 이런 행복을 느낄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다. 대단한 비혼주의자라도 되겠다는 거야? 내 마음은 한심하다는 듯 비아냥거린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반쪽짜리로 보일지 모른다. 연인, 결혼,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 생각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고작 이런 고독이나 즐기겠다고 모든 걸 멈추고 여기로 온 거야? 이렇게 하찮게 여긴다면 어쩔 수 없지. 미안하지만 맞아. 나의 불완전함을 과장하지 않으리라. 불완전하더라도 나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외롭다며 소란을 피우고 아무에게나 기대지도 말아야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그 의무를 전가하는 건 비겁하니까.
이런 강렬한 나약함들이 치밀어 오를 때, 이제는 차분히 내 어깨를 잡고 고개를 젓는 더 성숙한 내가 있다. 사실 나는 계속 완전했던 건 아닐까.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마음 절반을, 아니 그 이상을 내어주는 사람이라서. 그를 잃고 남은 커다란 빈 자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했던 건 아닐까. 숨을 깊게 들이쉬어본다. 누군가로 꽉 채웠던, 지금은 비어있는 마음에 이 공원에 가득한 가을 풀 냄새가 채워지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