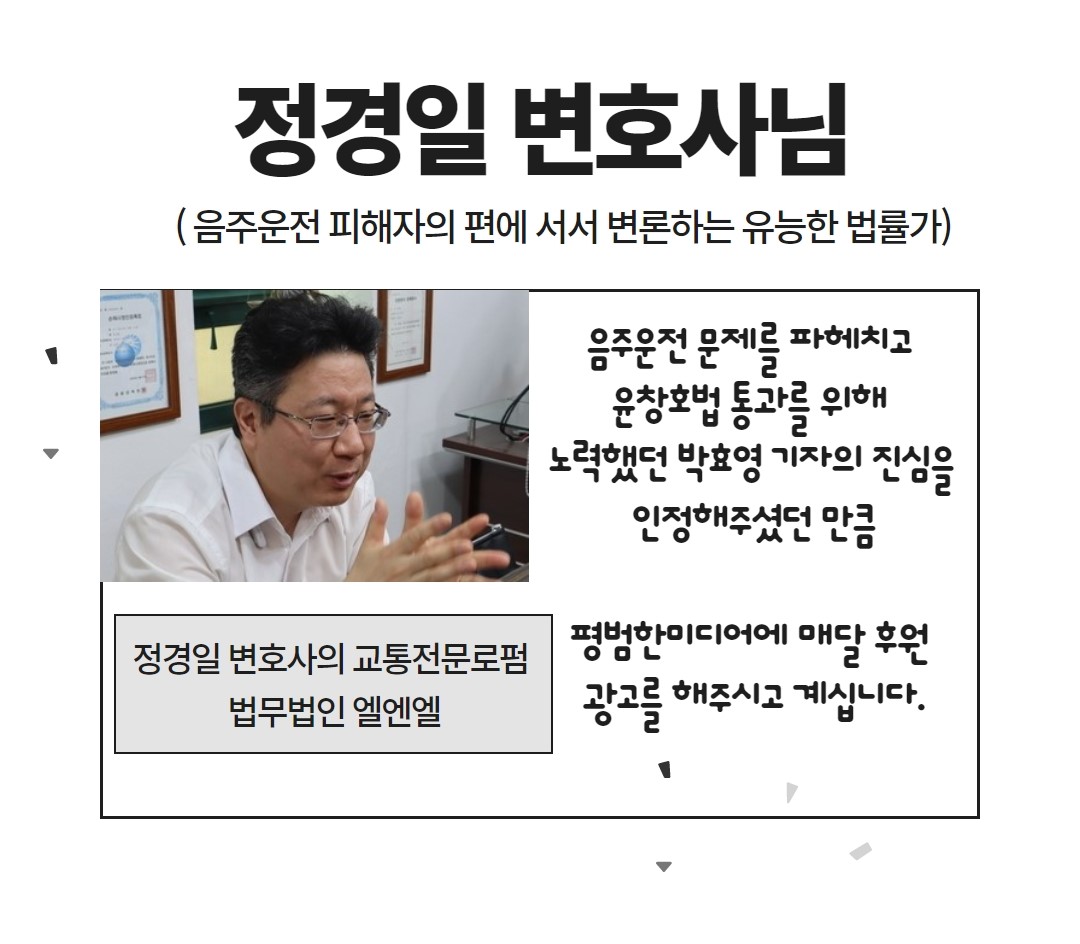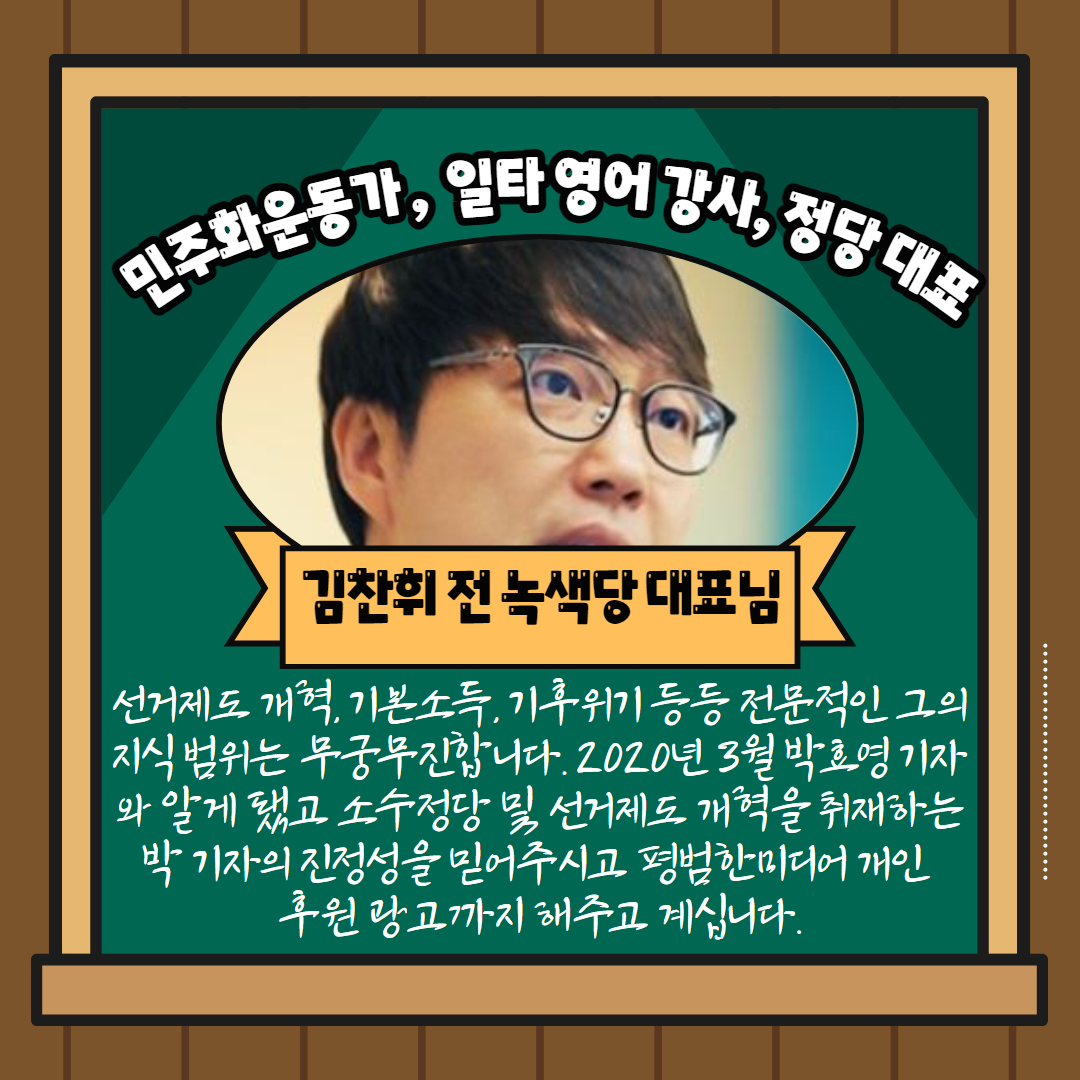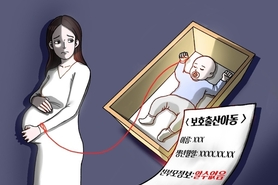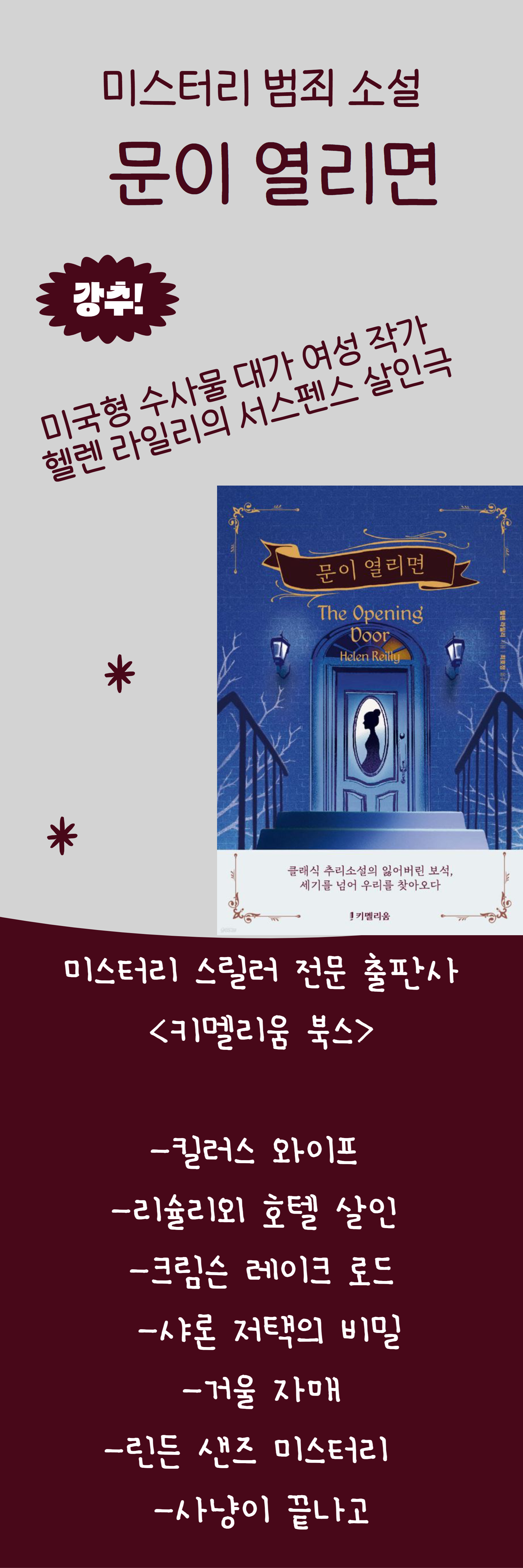#[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19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부다페스트에서 돌아오던 밤은 몹시 추웠다. 국제 버스 정류장에 내리자마자 몸이 덜덜 떨렸다. 추위는 지하철역까지 나를 뛰게 만들었다. 하지만 역 안의 온도도 바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는 웅크린 채 시내로 들어가는 지하철을 기다렸다. 그런 내 옆에 엄마와 아이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Nein, Nein, Nein!!!!” (아냐, 아냐, 싫어!) 싫다는 딸을 엄마는 이리저리 달래가며 양손엔 털장갑을 끼우고 이미 쓰고 있던 털모자는 쭉 당겨 귀를 완전히 덮고 열려있던 재킷의 지퍼는 목 끝까지 끌어 올려 무장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품에서 놓아줬다.

나도 저런 보호를 받던 때가 있었지. 추워서일까. 혼자만의 여행이 끝나고 좀 외로웠던 걸까. 저런 타인의 간섭이 그리웠다. 분명 가방에 장갑을 넣었었는데. 배낭에 쌓인 여행 짐을 파헤쳐 밑에 깔린 장갑을 발견했다. 장갑을 끼며 생각했다. 나는 어른이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고.
어른. 어릴 땐 주민등록증이 생기면 자동으로 되는 건 줄 알았다. 근데 아니었다. 대학을 졸업하면 되는 건가? 이십대 후반까지 기다리면 되나? 서른이 넘으면? 나는 여전히 어른이라기엔 뭔가 부족하다. 어른은 나이가 찼다고 저절로 얻는 ‘지위’가 아니라 노력해서 되어 가는 ‘상태’였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 계속 이 상태로 머무르려면 노력과 연습이 평생에 걸쳐 필요하다.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인 노력이. 그래서 진정한 어른은 드문 것 같다.
어른의 필수 덕목은 ‘나 자신 보호하기’라고 생각한다. 다른 생명을 보호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여기서 보호는 우쭈쭈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장갑을 끼기 싫어하던 딸의 건강을 생각해 억지로 장갑을 끼우는 저 엄마처럼.
원하는 것(wants)과 필요한 것(needs)은 다르다. 나를 잘 보호하려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할줄 알아야 한다. 예전의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 못 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민증의 자유를 얻은 뒤에 한 일은 술을 마셔보고 클럽에 가보는 것이었다. 아침 일찍 학교를 갈 필요가 없으니까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고 혼자 사니까 자고 싶을 때 잤다. 유행을 따라가고 싶었다. 옷이 있는데 옷을 샀고 그 전에 산 것들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또 화장품을 샀다. 우울하면 편의점에서 할인하고 있는 초콜릿, 컵라면, 크림빵을 먹었다. 그때부터였다.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된 시점. 경계, 규칙, 절제가 사라졌을 때.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했다. 밖으로는 만성 여드름이, 안으로는 뿌리 깊은 자기 혐오가 자라났다.
빈은 내 자유를 막는 규칙들이 있다. 노동자의 쉴 권리가 중요하다며 주말엔 상점들이 문을 닫는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5유로나 되는 배송료를 내야 하고 분명 집 주소를 입력했는데 우체국에 가서 배송된 물건을 찾아야 한다. 배송 기간은 ‘영업일 기준’ 일주일이 기본이다. 불편함이 내게 물었다. “너 이거 정말 필요해?” 그때는 참 사고 싶었고 먹고 싶었는데 지나고보니 그게 뭐였는지 대부분 기억도 나지 않았다. 절약한 돈으로는 주얼리를 보러 유럽의 다른 도시로 여행을 다녔다. 외식을 안 하니 요리를 시작하게 됐고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꼭 필요한 건강 관리로 이어졌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구들은 내가 건강해보인다고 말한다. 나는 이 말이 겉치레가 아니라는 걸 느낀다.
언제 어디서 멈춰야할지를 모르는 사람들.
인상 깊게 읽었던 책 <과잉존재>에서는 오늘날 한국에 퍼진 ADHD, 우울증, 일 중독의 본질이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즉 ‘경계를 잃고 비대해진 자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은 24시간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우리의 욕망에 속삭인다. 너는 언제든 이걸 할 수 있다고. 그게 내게 좋을까? 내게 필요할까? 영리 추구가 존재 목적인 기업의 마케팅을 나무랄 순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꼼꼼히 따지는 수밖에. 추운 날씨에 다루기 힘든 아이를 방한용품으로 단단히 감싸는 저 엄마처럼. 내게 다가오는 자극. 내가 품는 생각들을 까다롭게 관리하고 싶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어른으로 머무를 힘을 키우기 위해. 이건 절대 끝나지 않을 내 의무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