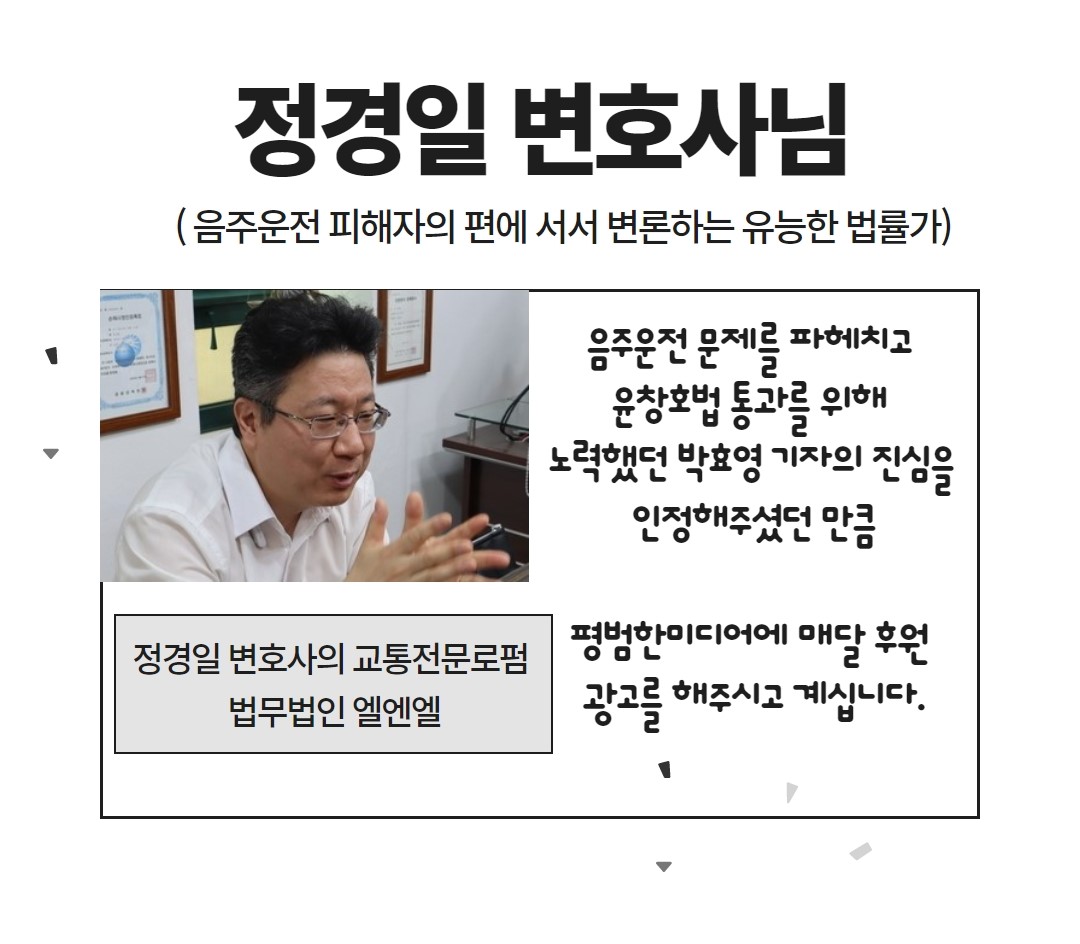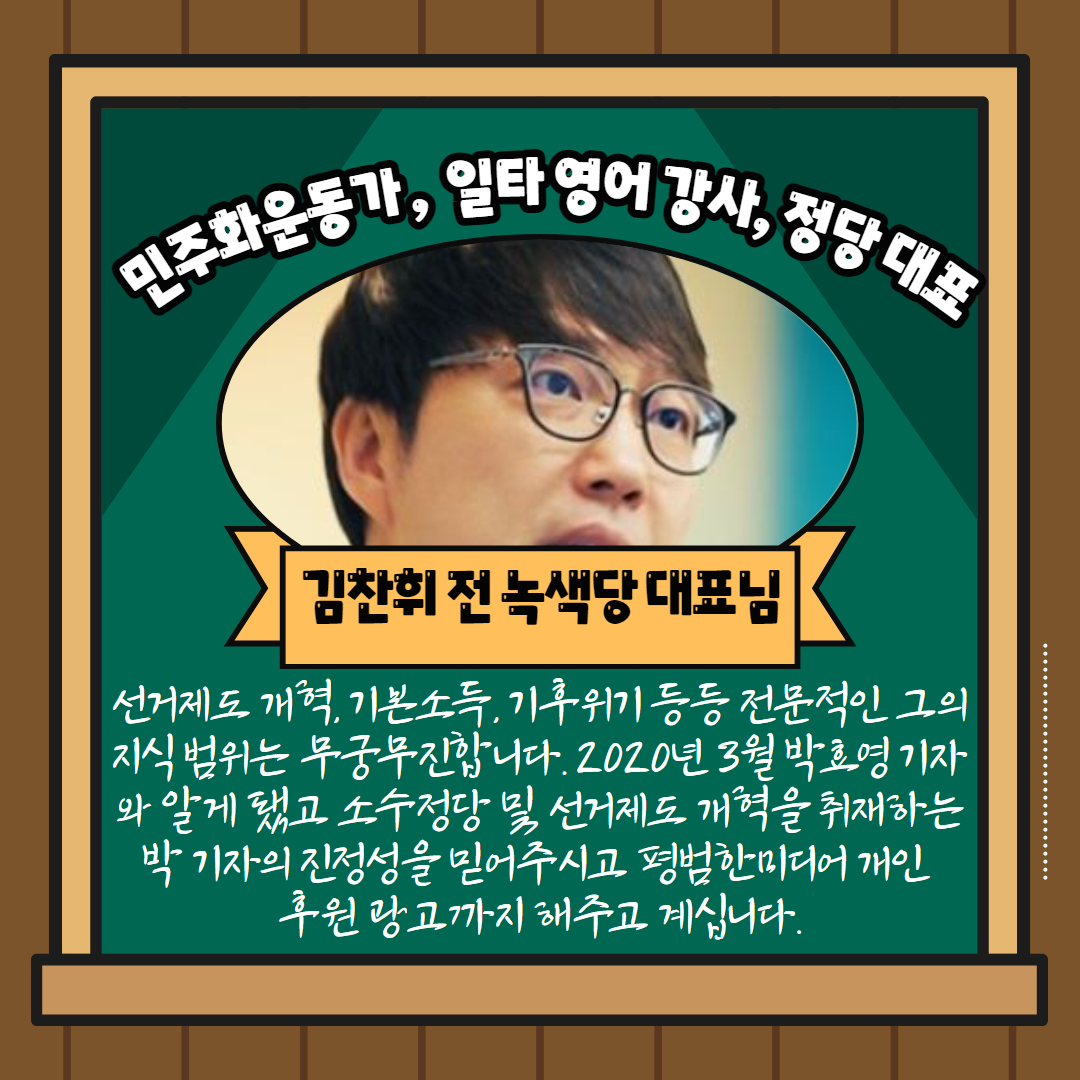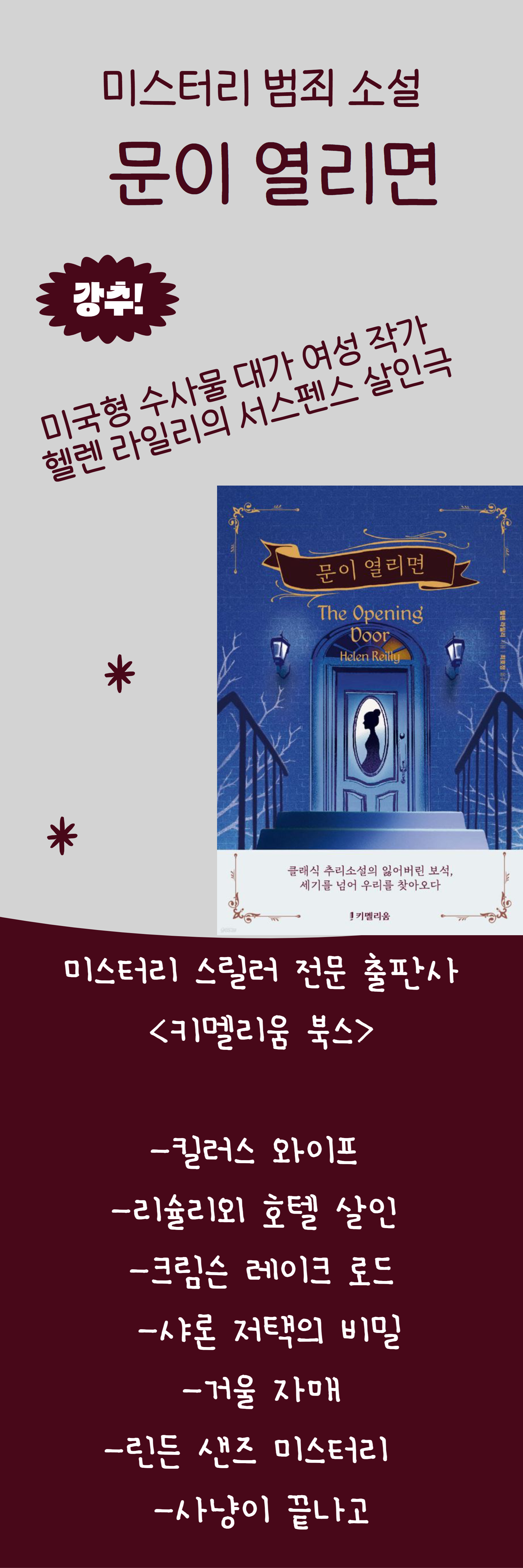#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16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파리 첫 날이었다. 아침 8시30분 보베 공항 활주로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머릿속 파리지앵의 이미지에 부응하려 새벽부터 공들인 메이크업과 고데기한 머리는 시작부터 망가졌다. 위축된 상태로 파리 시내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가방에서 캡모자를 꺼내 쓰며 망가진 머리도 애써 가려보았다. 하지만 2시간 후 파리 <샤를 드골 에투알역>에 내렸을 때 내가 본 진짜 파리지앵은, 후드를 뒤집어쓰고 백팩을 맨 채 우산도 없이 비 내리는 거리를 걸어 다녔다.
그렇게 나는 의도치않게 파리에 완벽히 스며들어 있었다. 평범한 뒷골목에 숨겨진 작은 비스트로에서 첫 끼니를 먹었다. 1년간의 오스트리아 생활로 돈이 얼마 남지 않은 내가 유명 맛집들을 제외하고 택한 곳이었다. 구글맵으로 파리 중심가와 떨어진 지역들을 줌인·줌아웃하며 레스토랑을 검색하다가, 파리 15구가 눈에 들어왔다. 백화점이나 박물관이 없는, 파리 생물의학 대학교와 로컬 베이커리, 레스토랑이 밀집해 있는 주거 지역. 나는 그곳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La Ravigote’라는 작은 비스트로를 찾아냈다. 음식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나는 진정 파리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관광객들의 영어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평생 몇 십 번은 이 식당에 왔을 단골 고객들과 웨이트리스가 나누는, 내겐 너무 이국적인 프랑스어만 가득했다. 이곳의 메뉴는 전식, 본식, 후식, 모두 4개 뿐이었다. 나는 웨이트리스에게 오늘이 파리에서 보내는 첫 번째 날이니 그냥 당신이 생각하는 제일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
음식을 기다리며 점심 식사를 즐기는 파리지앵들을 구경했다.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던 손님의 점심 식사는, 내가 나갈 때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아무도 그에게 식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재촉하지 않았으니까. 그로부터 10분쯤 뒤, 나는 지금껏 유럽에서 먹어본 음식 중 주저없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것은 ‘라비올리’라는 파스타였는데 처음 보는 것이었다. 마늘향이 가득한 크리미한 노란 소스에 한국의 만두보다 작은 파스타들이 놓여 있었다. 한입 떠 먹자마자 나는 이 파스타와 사랑에 빠져버렸다. 허브향이 은은하게 감도는 짭쪼름한 마늘맛 소스와 부드럽고, 폭신하고, 맛있고, 쫄깃한 파스타가 만난 천상의 음식이었다. 파스타 반죽을 다 먹고 남은 소스는 공짜로 나온 바게뜨빵에 싹싹 발라 깨끗하게 먹어 치웠다. 이 빵도 할 말이 많다. 겉은 단단하고 바삭한데, 베어 물어도 입 안을 상처내지 않았다. 손으로 빵을 뜯으면 마치 떡처럼 부드럽게 뜯어졌다.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빵이 존재하다니.
이 기적을 만든 비스트로의 대표이자 쉐프인 할아버지는, 바게뜨가 1개만 남았을 때 갑자기 말 없이 바구니를 가져갔다. 점심 장사를 해야 하는데 다 먹고 안 나가는 뻔뻔한 손님이 된 것 같아 나는 살짝 서운해하며 외투를 걸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따끈한 새 바게뜨를 가득 채워 테이블에 놓고 “Enjoy!”라고 외치며 부엌으로 쏙 들어갔다. 이 음식점에서 그는 가장 즐거운 사람이었다. 단골 고객들이 들어오면 아이처럼 손뼉을 치고 반가워했고 볼을 맞대며 비쥬를 나눴다. 그에게 이건 피하고 싶은 노동이 아니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내 것. 그래서 아무리 자신을 힘들게 해도 상관 없다는 자신감. 나도 내 공방을 그처럼 사랑하고 싶었다.
식당에서 나오니 비가 그쳐 있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뱅돔 광장이 있는 북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얼리 메종들 이를테면 반클리프, 아펠까르띠에, 부쉐론 등이 모여 있는 그곳. 구글맵 예측으로 도보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다. 돈이 부족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한 것도 맞다. 하지만 19살에 휴학을 하고 일본으로 여행을 간 이후로, 새로운 도시를 걷는 일은 충실히 사랑해온 그 도시를 흡수하는 나만의 방식이다. 크림색 외벽, 기다란 창문, 검정색 철제 테라스 그 위에 핀 붉은 꽃들이 놓인 파리 특유의 건물들을 지나치며 기분이 좋아졌다. 툭하면 걸음을 멈추고 주얼리나 책, 상점 인테리어를 눈에 담느라 목적지에 도착했을 땐 모든 주얼리 메종이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뭐 내일 다시 오면 되지.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지역을 등지고 목적지 없이 천천히 걸었다.
그러다 투박한 하얀색 성당이 보였다. “저녁 늦게까지 여는 성당이 있구나.” 나는 조용히 성당 문을 열고 들어갔다. 화려한 벽화나 스테인드글라스는 없었다. 커다란 나무 십자가와 1인용 나무 의자들만 빼곡하게 내부를 채우고 있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 했고, 다리도 아픈, 돈이 부족한 나와 같은 여행자가 쉬어가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곧 전혀 알아듣지 못 하는 프랑스어로 미사가 시작되었다.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으며 지친 몸이 지친 마음에게 말을 걸었다. “힘들지?” 대답은 없었다. “근데 최선을 다하는 게 자랑스럽다.” 성당엔 나를 포함 5명 정도?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나는 이 순간이 결코 잊혀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의 열정과 설렘 그리고 부족함과 어설픔 모두 이 시공간에 박제될 것이라는 것을. 나의 파리여행은 이렇게 어설프게 시작되었다. 그후 5일간 파리의 북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하루에 6시간 넘게 걷고 또 걸었다. 내가 자주 꾸는 꿈에 나오는 고래가 된 것 같았다. 수압, 물살, 부족한 숨을 견디고 독립적으로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고래처럼. 자신의 꼬리와 지느러미가 가진 힘만으로 태평양과 북극을 단숨에 횡단해버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동물처럼. 슬픔과 좌절을 벗어던지고. 이리 저리 도시를 걸어다니며 의미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