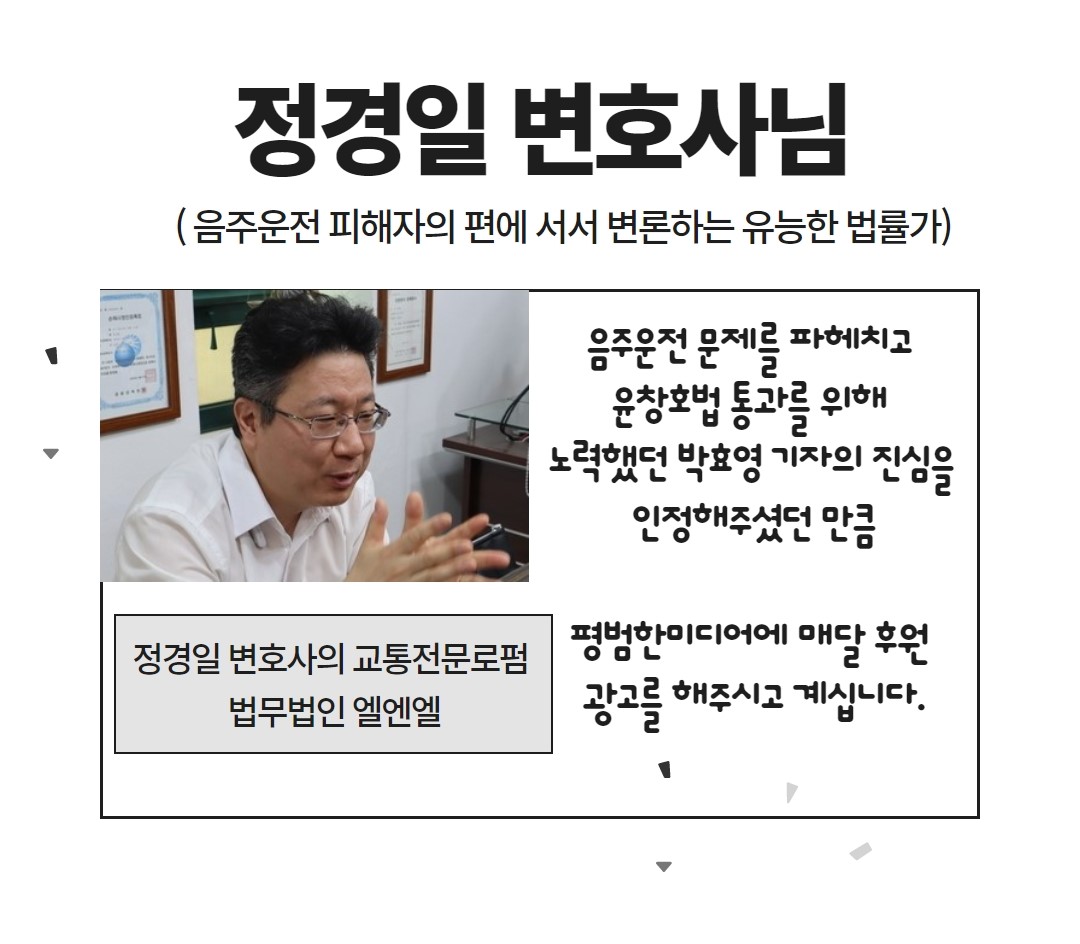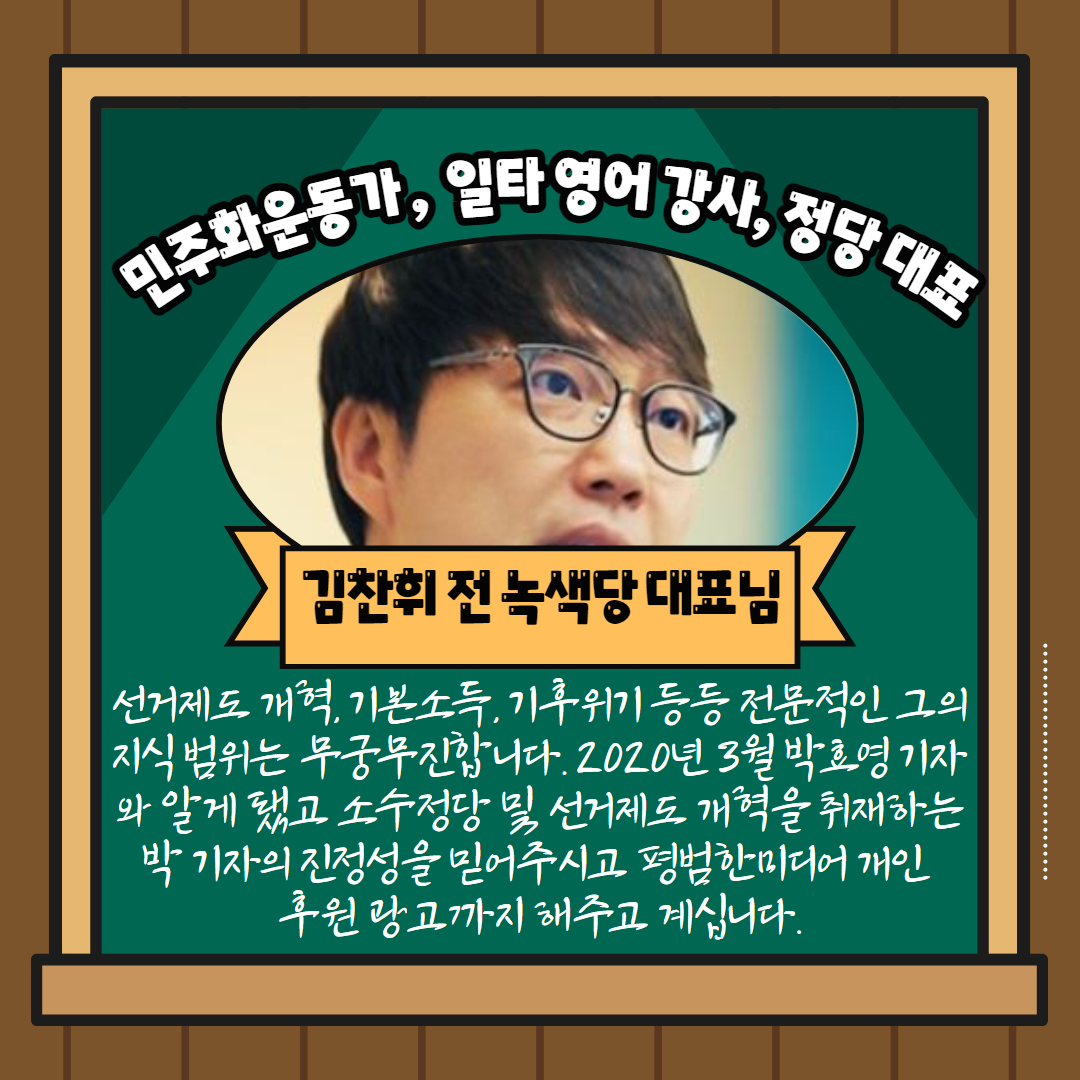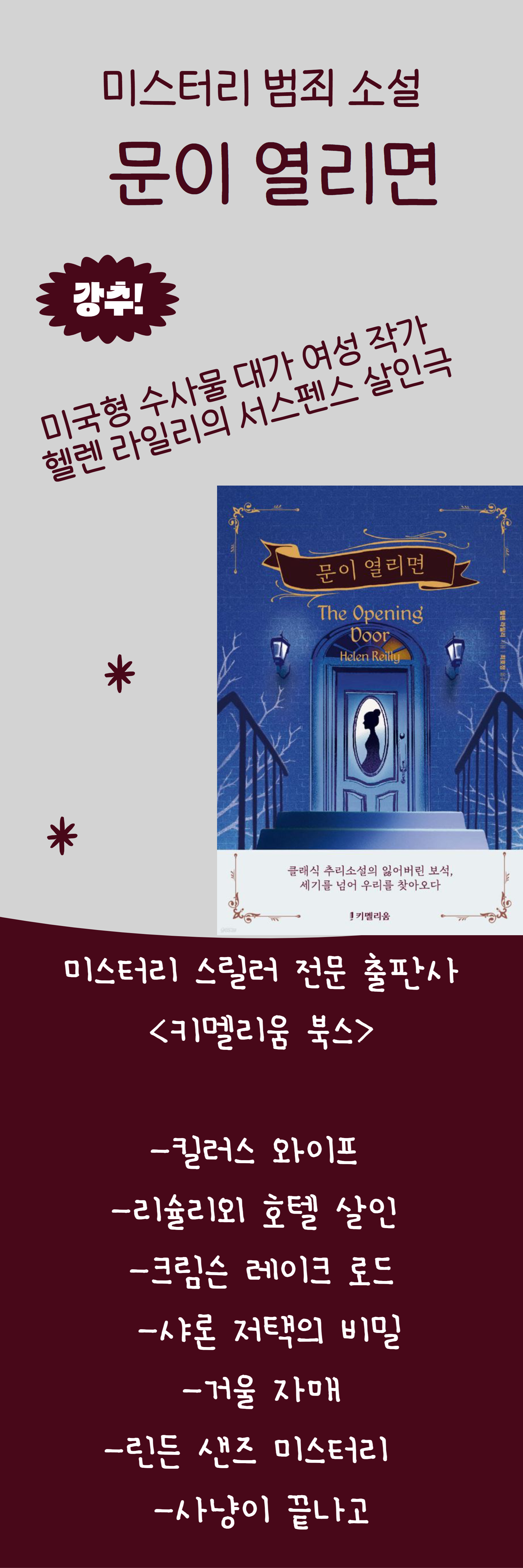[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너무 춥지만 어쩔 수 없어요."
대전에 위치한 한 농장. 농장 한 구석에 컨테이너 창고가 놓여져 있다. 창문이 깨진 곳엔 몇 겹의 얇은 이불이 붙어 있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A씨는 그곳을 '집'이라 부른다. 난방시설은 오직 두꺼운 이불과 오래된 전기장판 하나.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모 비닐하우스 가건물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났다. 이로 인해 이주 노동자 숙소에 관한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차디찬 겨울 한 가운데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곳에 내던져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부터 축산 및 어업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단,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주 노동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숙소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올 9월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기숙사를 신축하기로 했다면 2023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더 길게 부여하기로 했다.
A씨에게 컨테이너를 제공한 해당 농가 주인 B씨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원래는 된다고 해놓고 갑자기 법을 바꾸는 바람에 옥탑 하나 빌려서 숙소로 줬는데 본인들이 여기서 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차피 불법 체류자 신분인에 왜 내가 그런 것까지 챙겨줘야 하냐"면서 되려 따져물었다.
A씨에 따르면 B씨가 마련해준 옥탑에서 살기 위해서는 집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코로나 때문에 저임금으로 책정된 것도 100% 다 받지 못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B씨의 주장과는 달리 A씨는 외국인 노동자용 E-9 비자를 받고 들어온 합법 체류자였다.

이런 실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이동식 조립 주택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실적으로 지원받기가 너무 어렵다. 정부 방침대로 하려면 토지 용도가 '대지'여야만 이동식 조립 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데 상당수 농업인들은 농지만을 갖고 있다. 또 지원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1500만원에 불과해 건축까지는 꿈도 못 꾼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A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B씨는 근무하는 동안 비닐하우스 안에 전기장판을 깔아놓아 이불을 따듯하게 데워놓는다고 한다. 일이 끝나면 데워진 이불로 밤을 겨우 버텨내기 위해서다. 과거에는 석유 난로 위에다 이불을 올려놨는데 누가 봐도 화재 위험이 너무나 크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 그런 걸 신경쓸 여유가 없다.
현실적이지 못 한 정부의 대책에 농가의 어려움까지 더해져 이주 노동자들의 밤은 너무나도 길고 척박하다. 기본적인 의식주는 법적으로라도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관계자는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의 70%가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에서 지내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청년들과 신혼부부 등에 지원하듯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년엔 더 많은 이주 노동자를 허가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렵게 일해주는 사람들인데 기본 생활적인 인권은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비단 A씨와 B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는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가운 인심에 기댈 곳이란 서로의 체온과 낡은 이불 밖에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떨며 밤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