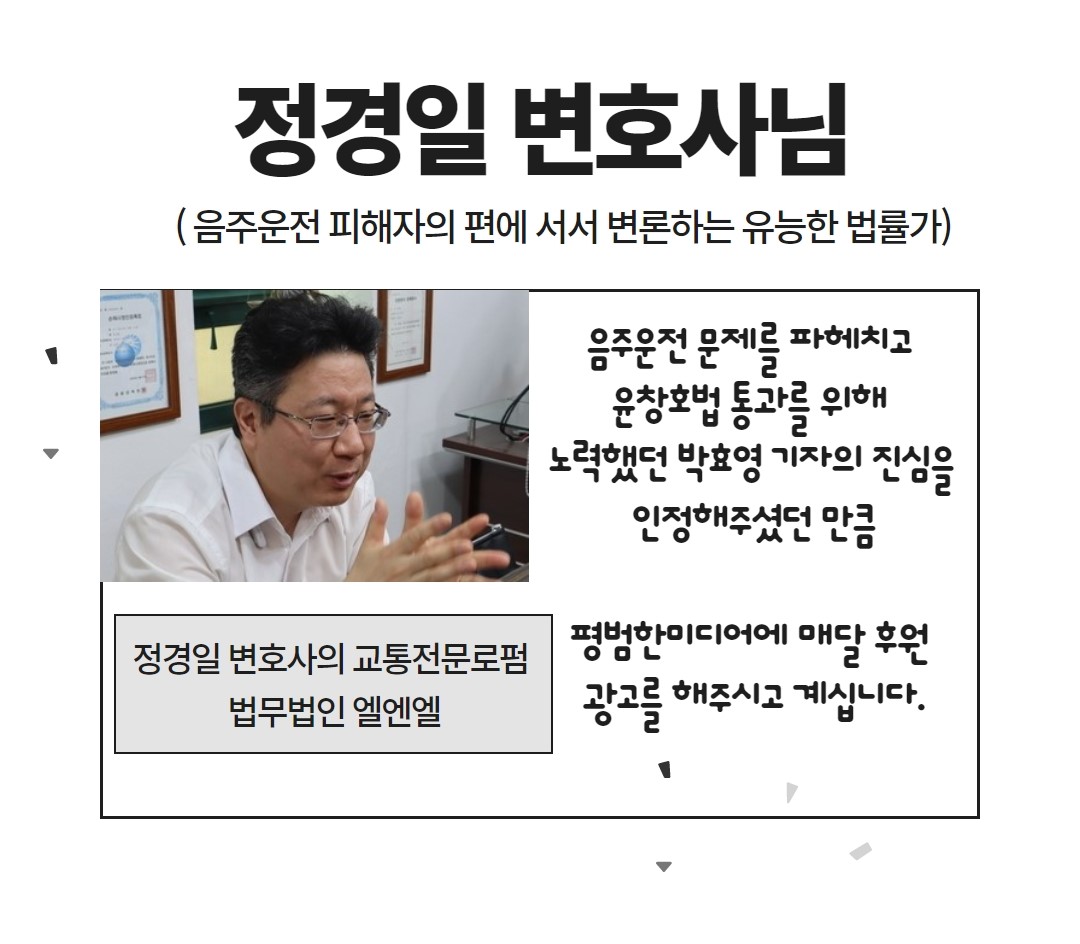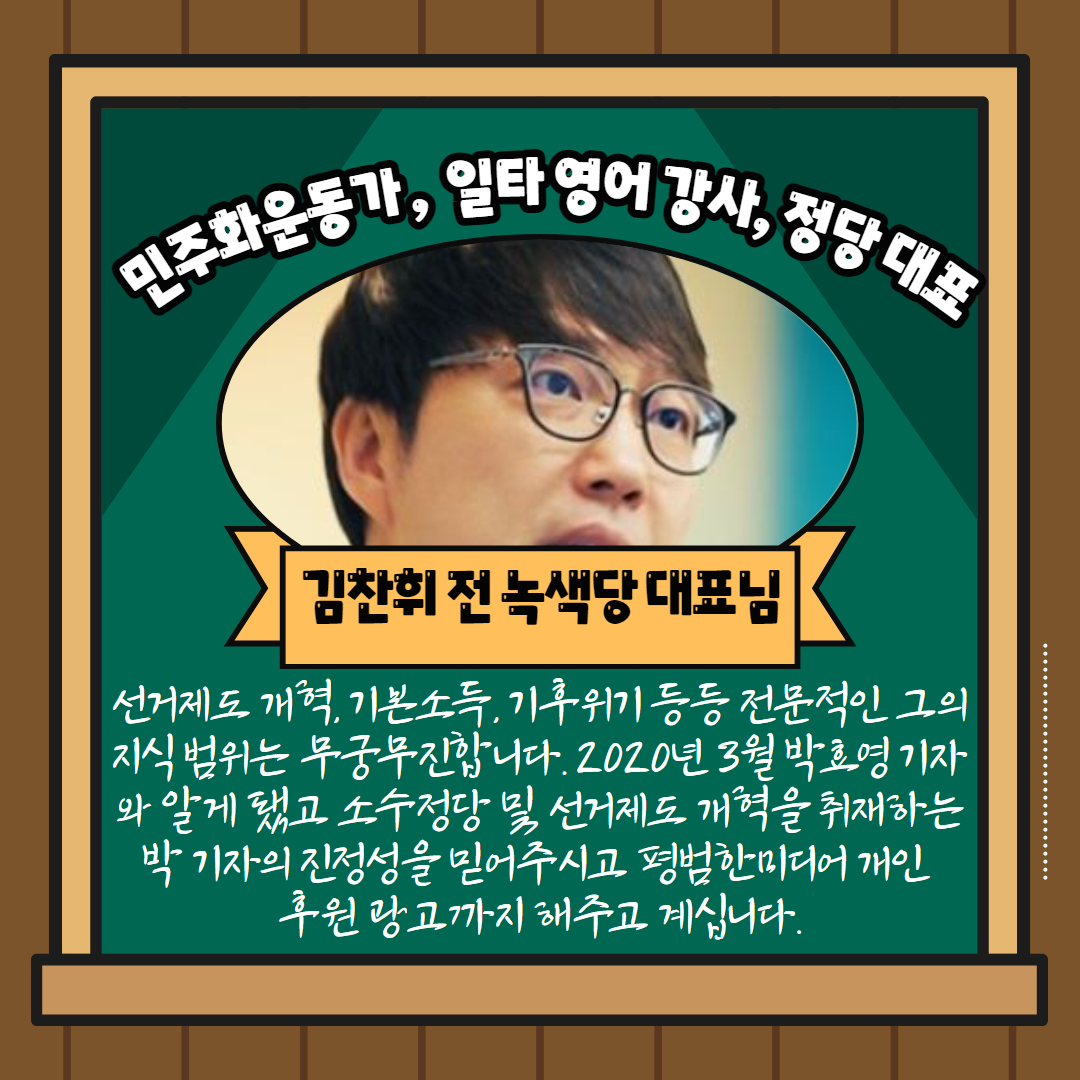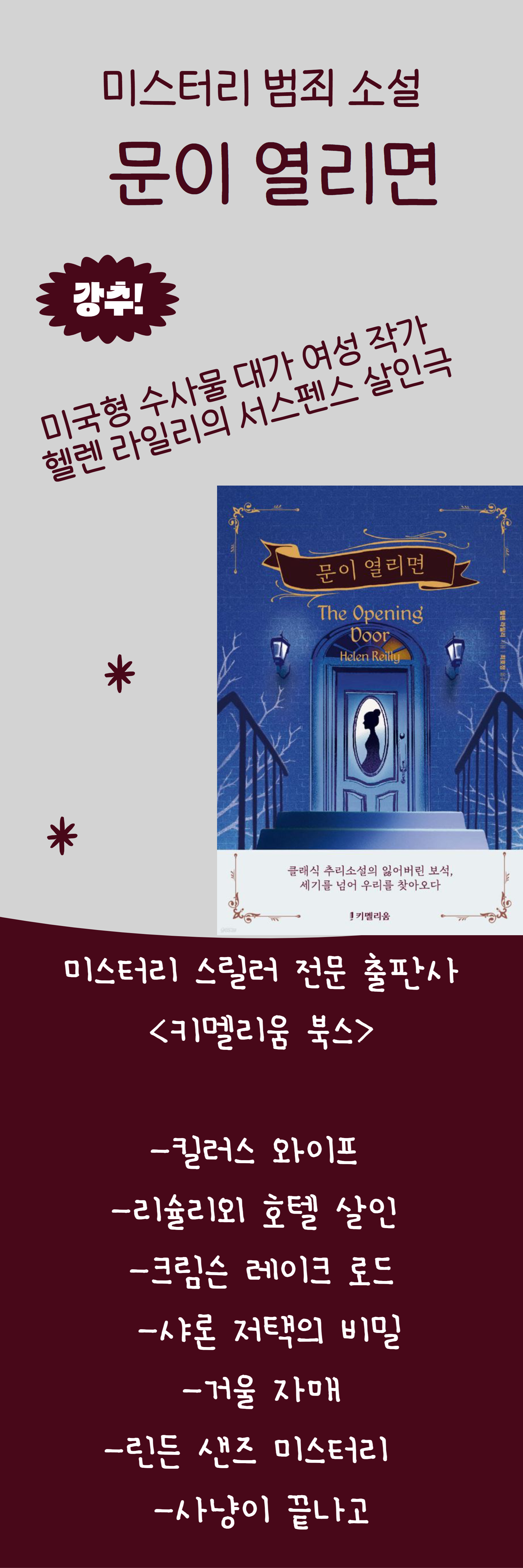※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25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개그맨 이경규의 인터뷰 한 대목으로 시작하고 싶다.
지금도 약 안 먹으면 3일 만에 공황이 와요. 연예인 중엔 내가 처음으로 공황장애를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정신과 의사가 고마워했어요. 우울증, 공황장애로 힘든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숨기다가 자살까지 가요. 무서운 거죠. 나도 사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웃기는 직업인데 웃기기 위해서 이렇게 긴장과 경쟁 속에 있다는 게 참...
한 고객님께서는 자신이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절대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하셨다. 왜라고 묻고 싶었지만 물을 수 없었다. 물을 필요가 없었으니까.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옛 시대를 산 사람들에겐 AI가 모든 답을 주고 토요일에 물건을 주문하면 일요일 아침에 배달이 되어도, 음식점 테이블 위 태블릿으로 주문부터 결제까지 이루어져도 ‘내 자녀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먹는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변화이자 사실인 것이다.
그토록 참는 이유가 뭔가요?
상담 선생님이 안경을 고쳐 쓰며 물었다.
실비보험 가입 문제도 있고,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18살 때 처음 내 발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간 날부터 지금까지의 내 마음은 늘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사이렌을 울려왔다. 뭔가 잘못되었어. 빨리 답을 찾으라고.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환한 입구를 찾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내 인생 최대의 의무였다. 내 가장 오랜 상담 선생님부터 오스트리아에서 만난 외국인 상담 선생님 그리고 지금 내 앞에서 자주 안경을 고쳐 쓰는 새 상담 선생님도 이 어두운 동굴과 사이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만큼 자주 말했고 그래서 이젠 뻔하고 지긋지긋하다. 이런 상담을 받으러 오는 누구나 털어 놓는 ‘사소한’ 소재가 아닐까?
“잠시만요.” 탁. 상담 선생님은 갑자기 상담실 조명이 꺼버리셨다. 암순응이 덜 된 내 눈엔 칠흑같은 어둠만 보였다. 아니 어둠이 보이지 않고 느껴졌다. 추웠고 배고팠고 너무 무서웠다. 어짜피 어둠 밖에 보이지 않는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렇게 펑펑 눈물을 쏟아냈다. 나는 그때 완전히 항복했다. 내가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처음으로 마주한 동굴의 어둠은 무시무시했다. 지루하고 뻔하다고? 사소하다고? 진짜? 진짜 마주한 어둠은 그 속에 혼자 있는 나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게 만들었다.
(이야 오랜만이네요. 언제 한국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또 왔어요.
그래서 다시 약을 먹기로 했다. 1년 10개월 병원에 오지 않은 시간 동안 병원은 아무 것도 바뀐 게 없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뭐가 변하겠냐며 약에 대한 내 인내력을 비웃는 것도 같았다. 정신건강의학과 대기석은 여전히 그 어느 진료과목 병원보다 조용했다. 선생님 앞에서 울었는데 마음이 전혀 아프지 않았다. 먹고 싶던 약을 드디어 먹게 되는데 무엇이 ‘비극’인가. 추석 연휴를 맞아 내려간 집. 내 방이 없는 내 집에서 백팩을 어디 둬야할지 몰라 소파에 두고 짐을 풀기 시작했다.
약을 먹어서 나온 자신감일까. 약봉투를 백팩 저 깊숙한 곳에 숨겨두지 않기로 했다. 엄마랑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냥 말했다.
나 약 먹어 다시. (그래...?)
엄마는 한 동안 말이 없었다.
(아휴 은비가 약을 안 먹어서 신령님, 부처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빌었는데 다시 빌어야 되나.) 그럴 필요 없어. (왜 다시 먹는 건데?) 응 그냥. 살려면 먹어야 해.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고향에 내려와서 약을 먹으면 남은 빈 봉지를 가방 깊숙한 곳에 모아 서울에서 버리던 내가 약을 먹는다고 공개 선언을 해버렸다. 빈 봉지도 더 이상 모으지 않고 곧장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렸다. 이 변화가 짜릿하면서도 아렸다. 나를 이 세상에 낳은 엄마에게, 세상의 고통을 맛보게 한 엄마에게, 되갚아주고 싶었던 걸까. 엄마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나는 부모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사실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았다는 고객님보다 미성숙한 것일까. 엄마는 내게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상담 선생님 말을 되뇌이며 약 먹는다는 사실을 사소하게 밝혀버린 내 변화를 즐겨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