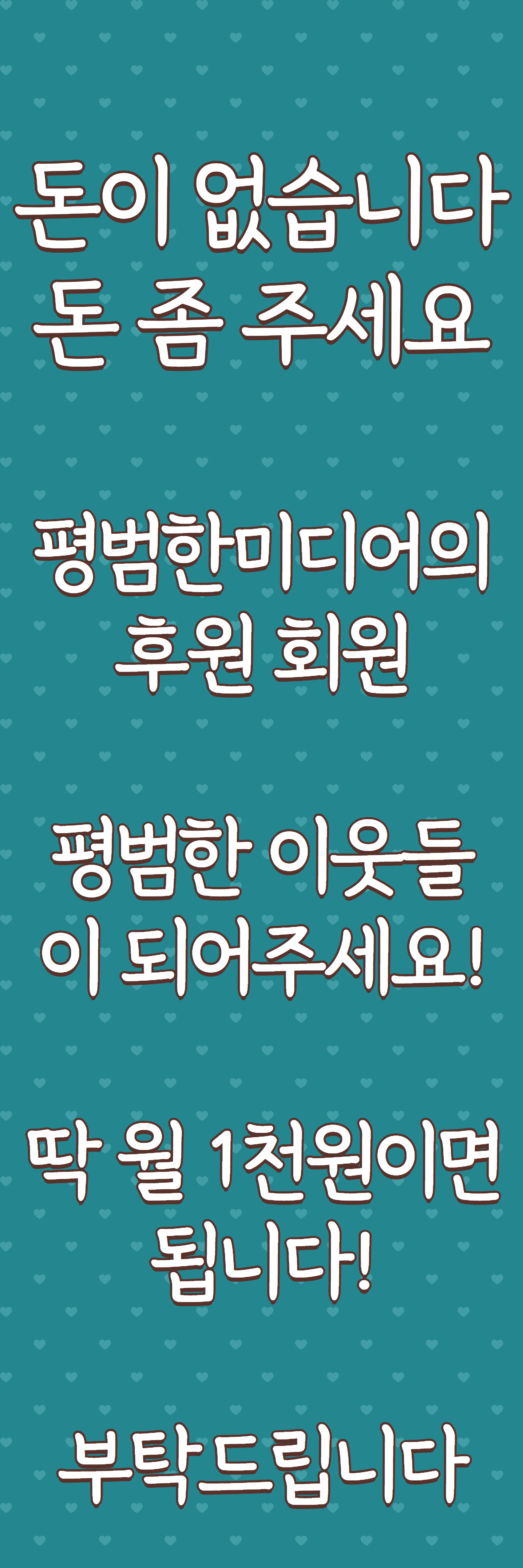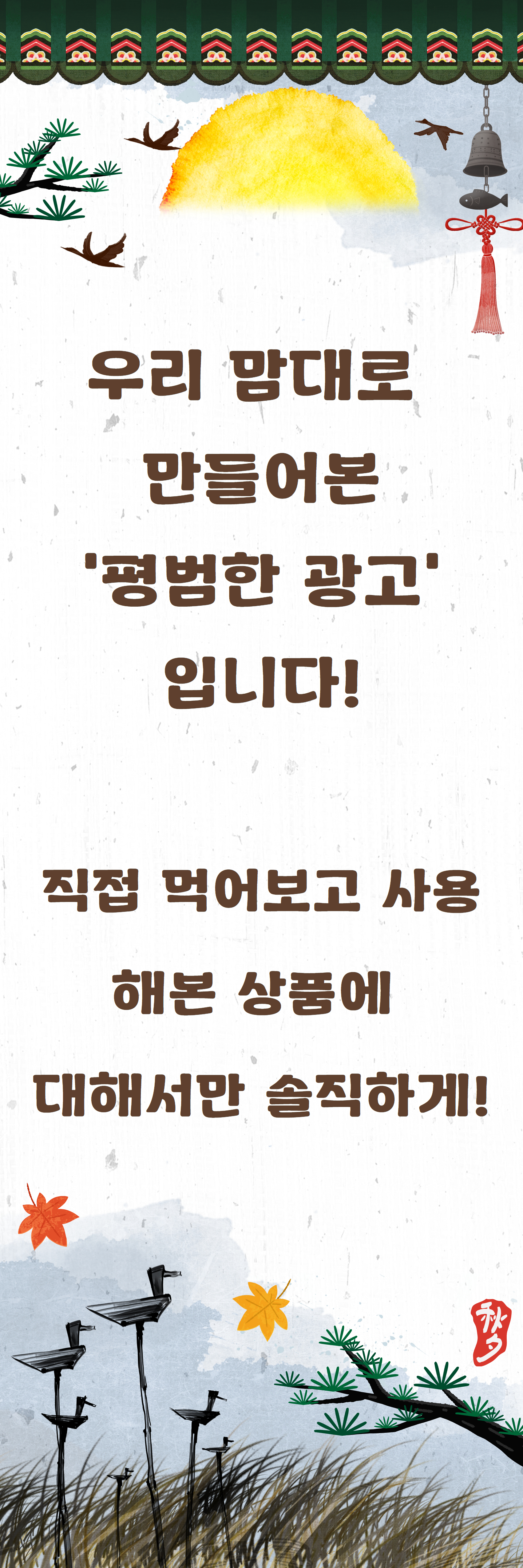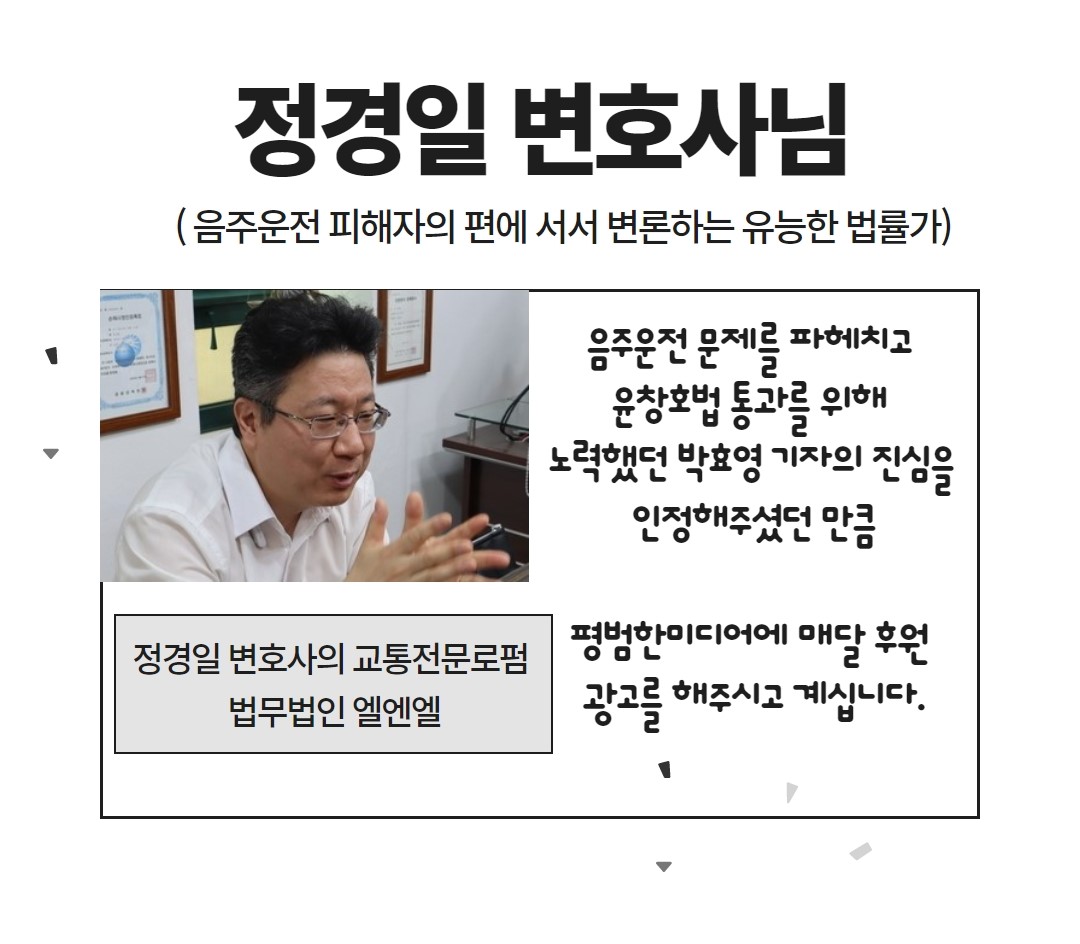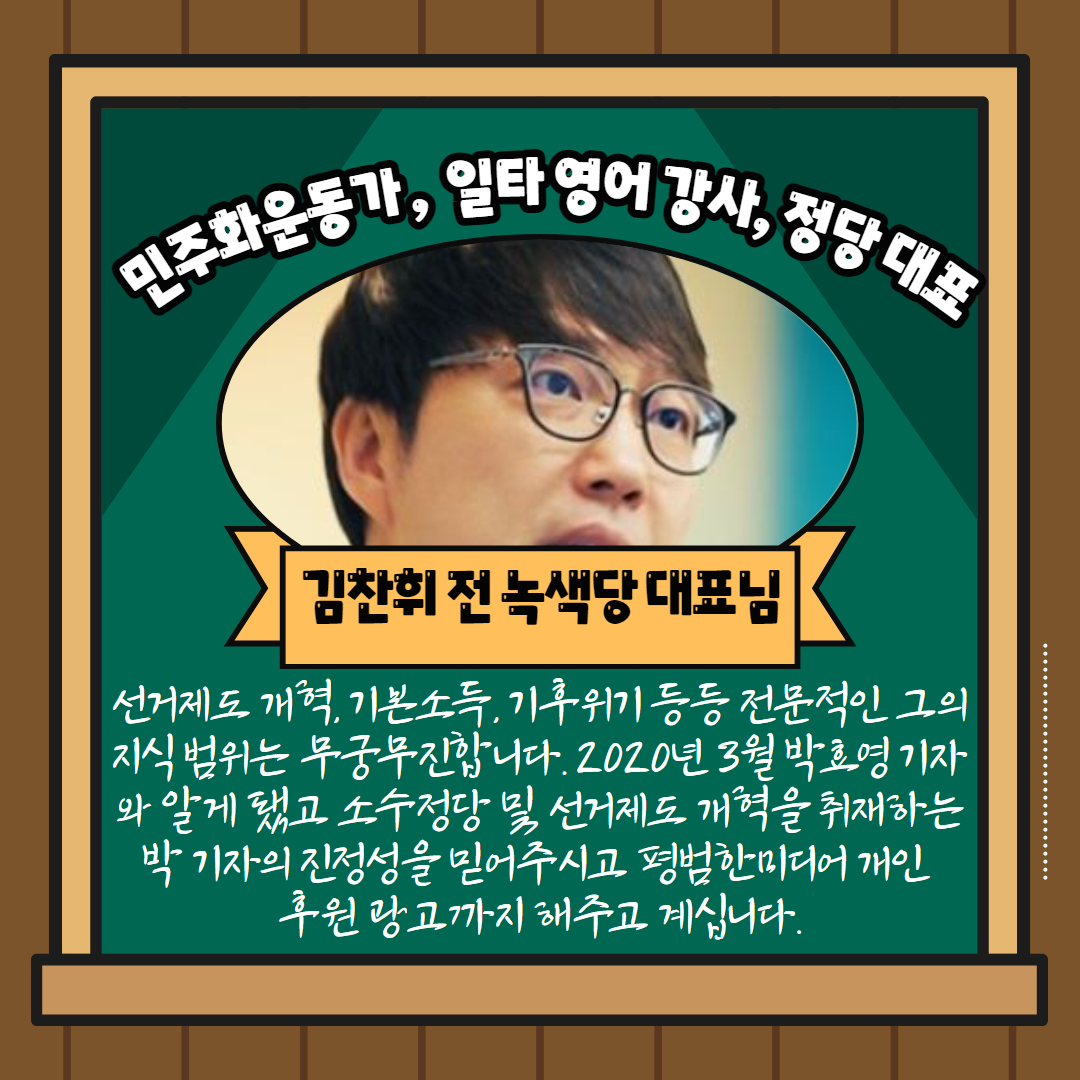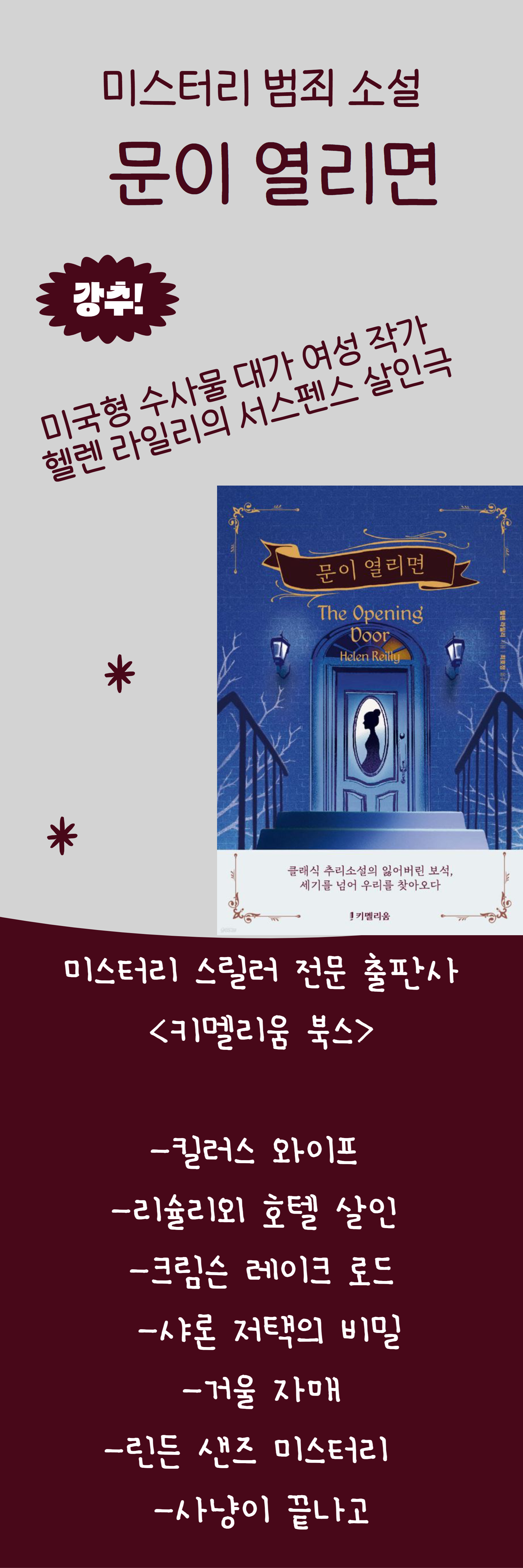[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날 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참사'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의 울분 섞인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 중대재해법의 골자는 노동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시행령 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주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나도 많다.
먼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급성 발생 질병이 24개로 한정된다. 납과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 중독,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무더운 공간에서 작업하게 되어 발생하는 열사병 정도만 포함된다. 무엇보다 장시간 과로로 인해 앓게 되는 각종 질환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증상이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이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 범위도 문제적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범위는 지하역사,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혹은 병상수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객석 수 1000석 이상의 실내 공연장 등이 속한다. 건설 현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중대재해법으로는 광주 붕괴 참사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음에도 그리고 그 죽음이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에 가장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안전보건 예산 편성 의무도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한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노동계가 주장해온 위험 작업시 2인 1조 및 신호수 배치 등도 시행령에선 찾아볼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애초 법률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자체가 유예된다.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가 다치고 죽고 있음에도 법이 이렇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중대재해임에도 '수많은 제약 조건으로 인해 중대재해로 인정받지 못 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노동자는 계속 다치고 죽는다.

노동법 전문 김석희 변호사는 평범한미디어에 "시행령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도 좁다. 이 때문에 다른 경우가 규율될 가능성이 완전 차단되고 있다"며 "사업주에게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의무를 전제시켜야 하는데 그조차 확실하지 않다. 근거조항을 추가해 수시로 상황이 반영되게끔 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이 '면피용'이라는 건 일각의 주장이 아니라 팩트다. 하루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로 다치거나 죽는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쪽짜리 법이 아니라 실제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울타리다. 한시 빨리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수정돼야 한다고 본다.